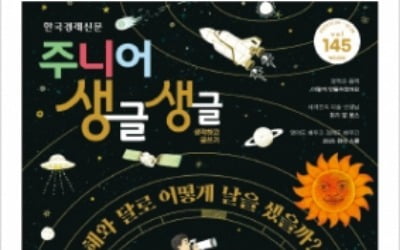르노의 'F1(포뮬러1) 경제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단 소리에 압도된다.
160dB(데시벨)을 넘나드는 굉음에 관중들은 혼을 빼앗긴다.
스피드는 어떠한가.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레이싱 카는 이제 막 눈 안에 들어오는가 싶더니 어느 새 시야에서 벗어난다.
F1(포뮬러 1)은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짜릿한 속도감과 터질 듯한 엔진 소리는 전율마저 느끼게 했다.
유럽 전역에서 몰려온 6만8000여명의 관객과 8억명에 달하는 전세계 'F1 마니아'를 위해 설치했다는 방송카메라들은 F1이 왜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불리는지 짐작케 했다.
기자가 F1 경기를 관람한 건 현지시간으로 지난 3일.프랑스 파리에서 300km 떨어진 소도시 마니쿠르에서 열린 2005년 10회 경기 결승전이었다.
F1은 전 세계를 돌며 19번의 경주를 벌인 뒤 종합 점수를 매겨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4km짜리 트랙을 70번이나 돌아야 하는 만큼 레이서의 운전실력과 함께 차량의 성능이 순위를 가르는 열쇠가 된다.
승부는 첫바퀴에서부터 결정났다.
멕라렌-메르세데스의 키미 라이쾨넨은 끝내 르노자동차의 페르디난도 알론소를 따라잡지 못했다.
전설의 레이서인 페라리의 미하엘 슈마허는 3위에 그쳤다.
이로써 올해 통산 69점을 확보한 알론소는 45점인 라이쾨넨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올해 종합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이날 경기 결과에 르노 임직원들이 흥분한 건 당연한 일.'르노는 세계 최강의 차를 만드는 회사'라는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직후 몰려든 방송 카메라를 앞에 두고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회장은 마음껏 르노의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경기장 밖에 마련된 기념품 판매점에선 르노의 미니카가 순식간에 동 나기도 했다.
"기념품점에서 페라리 미니카를 집어든 아버지에게 꼬마 아들이 '1등 한 르노 미니카로 바꾸자'고 조르더라"는 르노 관계자의 설명은 F1의 효과를 실감하게 해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파리 샹제리제 거리에 있는 르노 F1팀의 홍보관인 '르노 아틀리에'가 전세계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붐비는 것 역시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르노가 F1팀을 운영하면서 얻는 홍보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까.
F1엔진 공장이 위치한 프랑스 비리샹티옹의 홍보 책임자인 나탈리 피앙세트의 대답은 "정확한 금액은 밝힐 수 없다"였다.
그는 다만 "르노가 F1팀에 투입하는 비용은 전체 광고 예산보다 조금 작지만 홍보 효과는 오히려 광고보다 크다"며 "특히 F1에서 우승할 경우 '세계 최고의 자동차 메이커'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르노가 F1팀을 운영하면서 얻는 이점은 홍보 효과만이 아니다.
F1 레이싱카를 개발하면서 얻은 노하우의 일부를 양산차에도 적용하는 등 양산차의 기술력을 높이는 데도 활용하고 있다.
실제 르노는 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F1 개발팀과 양산차 연구개발팀의 인력을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하고 있다.
르노 관계자는 "1997년 F1을 탈퇴했던 르노가 2001년 복귀한 이유는 F1의 홍보 효과와 이를 운영하면서 얻는 기술력 향상 효과가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F1은 앞으로도 르노가 기존 고객의 로열티를 높이고 물론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니꾸르·비리샹티옹(프랑스)=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커버스토리] 트럼프의 '돈로주의'…국제분쟁 도화선 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22932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