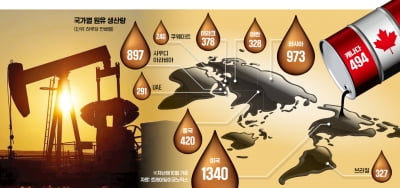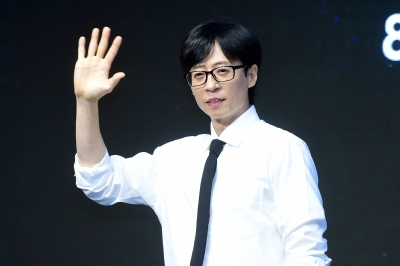"변호사라고 법정에만 서라는 법이 있습니까."
변호사 경력 11년째로 오세오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최용석 변호사(43·사시 27회).변호사인 데도 그는 5년 전부터 법원과 담을 쌓고 있다.
의뢰인의 억지 주장을 대변하고 판·검사를 상대로 아쉬운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체질에 안 맞아서다.
대신 하루 6시간 이상을 컴퓨터와 지낸다.
그렇다고 인터넷으로 법률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다.
법률 사이트 오세오닷컴(www.oseo.com)이 그의 놀이공간이자 일터다.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법조계의 복덕방' 같은 사이트다.
판·검사 이름만 입력하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절친했던 변호사 인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서식도 들어 있어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처럼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다.
"검색창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면'이라고 치면 이혼절차 등 필요한 모든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능 포털 사이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디지털 변호사'를 자처하는 그의 '끼'는 1980년대 후반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발동했다.
심심풀이로 드나들던 성인 전자오락실에서 판판이 빈털터리로 나오자 그는 오기가 생겼다.
친구들과 함께 세운상가에서 기계를 사서 밤새 연구한 끝에 이른바 '로직'을 찾아내 그 다음 날 큰 돈을 따기도 했다.
그가 특수부 검사 시절에 이름을 날린 것은 컴퓨터 덕이다.
대부분 검사들이 타자기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그는 문서보관 기능이 있는 워드프로세서를 구입했다.
"글씨체가 깔끔한 데다 영장을 작성하는 시간도 타자기에 비해 10분의 1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입시 부정 등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위에서는 저를 부르곤 했습니다."
끼를 주체하지 못한 그는 일단 검사직을 던져 버리고 검찰을 나왔다.
'걸어다니는 인명사전'으로 불릴 정도로 법조계 인맥을 달달 외우는 장기를 살려 5년 뒤 국내 최초의 법률 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오세오닷컴'을 설립했다.
하지만 수익구조가 문제였다.
사이트 접속은 많았지만 '돈'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사건 의뢰인들도 인터넷상의 법률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일단 만나서 얘기해 보자'며 오프라인 상담을 원했다.
그는 이를 '빌 게이츠와 공자의 만남'이라고 불렀다.
게다가 100여개의 유사 사이트가 생겨날 정도로 후발 업체들이 난립해 인터넷의 한계를 절감케 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걷겠다고 찾아나선 블루오션이 졸지에 레드오션으로 변해 버린 것.
그는 최근 또 다른 블루오션을 찾아 나섰다.
유비쿼터스 시대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는 휴대폰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후불제 소송,디지털 내용증명 등 야심찬 기획 상품을 내놓았다.
특히 후불제 소송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미리 지급하지 않고 재판에서 이긴 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친분 있는 100명의 변호사와 업무 제휴도 맺었다.
여기서도 그는 의뢰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데도 변호사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따져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사건을 관련 변호사에게 넘겨주기만 합니다."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인터넷과 휴대폰의 세계.최 변호사의 블루오션 찾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병일 kbi@hankyung.com
- 글자크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글자행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유하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