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회모델 '뜨거운 논란' .. 앵글로색슨, 시장 중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럽에선 젊고 활기찬 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모델 내지 경제시스템 논쟁이 한창이다.
크게 보면 영국 아일랜드 등의 앵글로색슨 모델과 독일 프랑스 등의 라인란트 모델로 나눌 수 있다.
유럽 내 사회모델 논쟁은 결국 라인란트 모델의 취약점을 앵글로색슨 모델 내지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모델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인란트 모델은 '개인'이나 '시장'보다 '사회'를 중시한다.
경제 시스템으로 본다면 '사회적 시장경제'라 부를 수 있다.
이는 유럽식 사회 복지와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나타난다.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며 정부도 분배를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한다.
독일 봉급생활자의 경우 소득의 40∼50%를 연금이나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떼인다.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는 그러나 개인에게 동기 부여를 하지 못하고 기업가 정신도 자극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노동 정책도 노동자 위주로 경직된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
앵글로색슨 모델은 역사적으로 유럽 내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꽃을 피워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모델'이라 불린다.
'승자가 모든 것을 얻는'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이다.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를 철학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경제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삼는다.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시한다.
노동 정책도 기업가 위주이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복지와 분배를 우선시하는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삶의 질 측면에서 미국보다 10년 정도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유럽보다는 미국 경제가 활기차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늙은 유럽을 젊고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해법은 자국 경제시스템에 맞춰 다른 모델의 장점을 보완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사회안전망의 폭을 줄이는 대신 경쟁 원리를 대거 도입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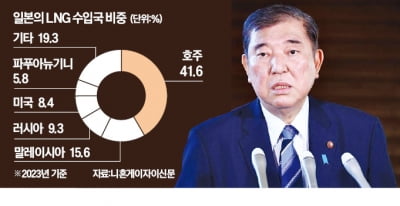
![[단독] 매그나칩반도체 4년 만에 매각 시동…LX·두산·DB 인수 후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A.393813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