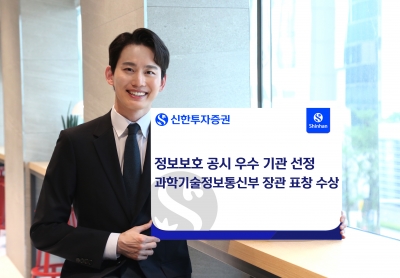[환율 세자리시대] (4) 산업공동화 막아라 <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원청업체의 우리 회사 담당자들이 해외에서 부품을 구매한다는 얘기를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배신감은 들지 않았어요. 그게 현실인데요."
연간 500억원 상당의 도장제품을 국내 모 완성차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A사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부터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낌새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최근 원청업체가 거래선을 해외로 돌렸다는 것이다.
달러당 원화값이 2년 전에 비해 200원씩이나 올라가자 원청업체가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에 나선 경우다.
A사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체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수출도 지금 환율 수준에선 포기 여부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A사뿐만 아니라 많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비슷한 처지에 내몰려 있다.
"달러당 950원 아래에선 수출을 포기하는 부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김산 자동차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팀장)
여성속옷 및 자수 전문업체로 일본에 연간 100억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부천의 이시원 사장은 "지난해 원화 값이 엔화에 비해 18%나 절상되면서 일본 수출은 아무런 이득도 남기지 못했다"며 "올 상반기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이 사장은 "차라리 정부가 달러당 1000원에 환율을 고정시켜 놓고 실제 등락에 따른 이득이나 손실도 정부가 모두 가져가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까지 말했다.
환율 하락이 중소 수출업체들에 가져다 주는 고통은 이처럼 깊고 넓다.
대기업들이 부품이나 원자재 구매선을 해외로 전환하는 글로벌 소싱이 확대되면서 기존 거래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힘겹기만 하다.
완성차업체뿐만 아니라 만도 한라공조 동양기전 등 대형 부품업체들도 원자재 및 기초부품에 대한 글로벌 소싱을 확대해나가는 추세다.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전자업계도 해외부품 사용 비중을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저환율기에 국내 부품만을 고집해서는 더 이상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매출이나 수익손실을 만회할 길이 없는 중소기업들로선 암담하기만 한 현실이다.
또 저환율시대의 개막은 가뜩이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산업공동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싸진 달러를 이용해 해외 생산기지나 판매법인 설립을 늘리고 있는 것.실제 삼성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등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올해 100억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의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전자업계가 해외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던 것도 환율 하락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나 기아자동차가 올해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자동차 공장을 짓겠다고 나선 것도 글로벌 경영확대라는 측면 외에 기축통화국이자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환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채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이승철 전경련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움직임에는 국내의 척박한 투자환경이나 규제도 분명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단기적인 환율대책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떤 경제구조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론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한된 내수시장,원청업체와의 협소한 네트워크에 안주하는 기업은 이미 열린 시장을 표방하고 있는 지구촌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

![기업 여론 듣는다면서…정부·野 "4대그룹만 나와라" 논란 [금융당국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K.38598733.3.jpg)
![로제 '아파트' 전세계서 열광하더니…덩달아 뜬 '이 회사' [최형창의 中企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35067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