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규모ㆍ횟수 늘어나는 황사..지구온난화로 3∼4월 집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히 중국 내륙에서 황사발생 횟수나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 봄 가뭄이 지속되면서 황사가 작년과 비슷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 대기ㆍ토양오염과 함께 호흡기 질환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 3∼4월에 집중 = 황사는 1980년대 초만 해도 봄철인 3∼5월 사이에 골고루 분포됐지만 2004년부터 3∼4월에 집중되고 5월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봄이 짧아지는 대신 여름이 길어진 탓이다.
5월의 경우 이미 여름철 기압배치 현상이 나타나면서 북서계절풍 현상이 두드러 지게 약화되면서 황사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
황사가 최근 늘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황사 발원지인 중국 내륙지역 삼림파괴와 사막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데다 이 지역의 고온건조한 상태가 몇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도시별 황사 관측일수 = 지난 33년간(1973∼2005년ㆍ28개 기상대 기준) 전국의 봄철 황사 관측 평년값은 약 3.6일이다.
1986ㆍ1987년 봄철에는 1일만 황사가 관측된 반면 1995년에는 21일, 2001년에는 무려 31일이나 관측돼 최다를 기록했으며, 2002년에는 18일, 2003년에는 3일, 2004년에는 8일, 작년에는 13일로 기록됐다.
도시별 평균 황사 관측일수는 광주가 4.8일로 가장 많고 서울 4.7일, 전주 4.3일, 대전 4.1일, 대구 3.8일, 제주 3.7일, 부산 3.2일, 강릉 2.8일이다.
월별로는 4월(2.0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5월(0.9일)과 3월(0.7일) 순이다.
특히 서울의 황사발생 횟수ㆍ일수는 2001년 7회(27일), 2002년 7회(16일), 2003년 2회(3일), 2004년 4회(6일), 지난해 7회(12일), 올해 현재 벌써 4회(6일)를 기록하고 있다.
◇ 중금속 함유 `비상' = 황사가 한번 발생하면 동아시아 상공에 떠도는 미세먼지의 규모는 약 100만t에 달하며, 이중 한반도에 쌓이는 먼지는 15t짜리 덤프트럭 4천∼5천대 분량인 4만6천∼8만6천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최근 황사는 중국의 산업화 진전에 따라 규소나 철 성분과 함께 알루미늄ㆍ납ㆍ카드뮴까지 들어있어 대기중 중금속 농도를 높이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황사 입자가 호흡기나 눈 등으로 들어갈 경우 목이나 눈이 따갑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 농작물이나 활엽수의 기공을 막아 생육에 지장을 주며 항공기 엔진이나 반도체 등 정밀기계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단 황사가 발생하면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고 귀가시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는 등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사 어떻게 발생하나 = 황사 발원지는 중국 고비ㆍ타클라마칸 사막, 네이멍구(內蒙古)의 사막지대, 황허(黃河) 중류의 황토고원, 만주 등이다.
황사는 이 발원지들에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황색먼지'(미세먼지ㆍPM-10)가 한랭전선 뒤쪽에서 부는 강한 바람이나 지형에 의해 만들어진다.
황색 먼지는 상층으로 빨려올라가 공중을 떠돌거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와 일 본을 거쳐 태평양까지 이동한다.
우리나라의 황사 관측조건은 황사 발원지의 기온이 높아 건조한 토양에서 먼지나 분진이 많이 생겨야 하고 강한 상승기류를 일으키는 저기압도 발생해야 한다.
대기 중에 떠도는 황사를 이동시키는 것은 지상 5.5㎞ 지점에서 부는 강한 편서풍 기류이며, 상공에 부유 중인 황사가 우리나라 지표면에 떨어지려면 고기압이 위치, 하강기류가 발생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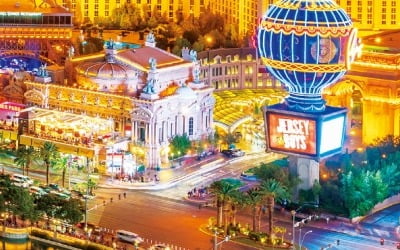

![그대 붉은 입술을 깨물었으니, 묻지 마라 [고두현의 아침 시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74726.3.jpg)


![강달러에 주춤한 금값…"기관이 사면 30% 오를 것" 전망도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168235.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