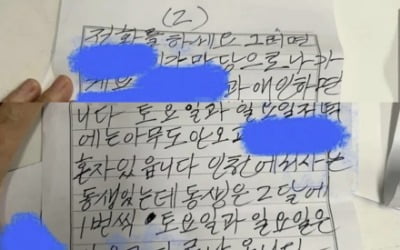[건강보험 대상 약품 대수술] 제약업 구조조정 '신호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강보험 대상 약품 대수술] 제약업 구조조정 '신호탄'
보건복지부가 3일 내놓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지출 부담을 낮춰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을 현재처럼 대부분의 의약품으로 방치한다면 약제비 지출이 가파르게 늘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언제 파탄날 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 개편에 제약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9월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격-효과 모두 충족해야
외국에 비해 한국은 약제비 비중이 유독 높은 편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4조8000억원.이중 29.2%인 7조2000억원이 약제비로 지출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기준 2003년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한국이 28.8%로 OECD 평균 17.8%를 훨씬 웃돌 뿐 아니라 미국의 12.9%보다는 2.2배나 높다.
2001년 이후 약제비 지출 증가율도 연평균 14%에 이르러 선진국의 6~7%보다 두 배나 높다.
복지부는 약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며 배경에는 대부분의 의약품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배경이다.
이 방식이 적용되는 신약은 효과가 뛰어나며 가격도 적절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대상 결정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나선다.
제약업체와 가격협상을 벌여 보험대상 등재 여부와 가격 상한선을 정한다.
○국내 제약업계 거센 반발
국내 제약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복지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제도의 도입을 일정 기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제약업계의 반발은 보험 대상이 되는 약품 수가 일단 줄어드는데다 보험 대상으로 포함되는 약품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온 신약이나 국내 일부 대형제약사의 자체 개발 신약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복지부는 당장 2만1740개 보험 대상 의약품 가운데 사실상 생산이 중단된 4705개 품목을 보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약품 수는 머지 않아 5000개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신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내 약품은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불가피
업계는 결국 자본력과 연구개발(R&D) 능력을 갖춘 회사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중소업체는 도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제약회사간 품질위주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제약업계에서 전문성과 규모가 갖춰지지 않은 군소업체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2004년 기준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는 725개로 업체당 평균 생산액은 364억원이며,이중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22개사에 불과하다.
국내 상위 10대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대부분 복제약 판매에 의존하고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제약업계가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준동·임도원 기자 jdpower@hankyung.com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을 현재처럼 대부분의 의약품으로 방치한다면 약제비 지출이 가파르게 늘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언제 파탄날 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 개편에 제약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9월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격-효과 모두 충족해야
외국에 비해 한국은 약제비 비중이 유독 높은 편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4조8000억원.이중 29.2%인 7조2000억원이 약제비로 지출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기준 2003년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한국이 28.8%로 OECD 평균 17.8%를 훨씬 웃돌 뿐 아니라 미국의 12.9%보다는 2.2배나 높다.
2001년 이후 약제비 지출 증가율도 연평균 14%에 이르러 선진국의 6~7%보다 두 배나 높다.
복지부는 약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며 배경에는 대부분의 의약품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배경이다.
이 방식이 적용되는 신약은 효과가 뛰어나며 가격도 적절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대상 결정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나선다.
제약업체와 가격협상을 벌여 보험대상 등재 여부와 가격 상한선을 정한다.
○국내 제약업계 거센 반발
국내 제약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복지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제도의 도입을 일정 기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제약업계의 반발은 보험 대상이 되는 약품 수가 일단 줄어드는데다 보험 대상으로 포함되는 약품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온 신약이나 국내 일부 대형제약사의 자체 개발 신약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복지부는 당장 2만1740개 보험 대상 의약품 가운데 사실상 생산이 중단된 4705개 품목을 보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약품 수는 머지 않아 5000개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신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내 약품은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불가피
업계는 결국 자본력과 연구개발(R&D) 능력을 갖춘 회사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중소업체는 도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제약회사간 품질위주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제약업계에서 전문성과 규모가 갖춰지지 않은 군소업체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2004년 기준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는 725개로 업체당 평균 생산액은 364억원이며,이중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22개사에 불과하다.
국내 상위 10대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대부분 복제약 판매에 의존하고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제약업계가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준동·임도원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