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자원확보가 경쟁력] 油레카! .. 고유가에 속타는 한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상최고가 돌파 행진은 멈췄다고는 하지만 WTI(미국 서부텍사스산중질유)의 경우 배럴당 70달러 근처,중동산 두바이유도 배럴당 65달러 안팎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수입되는 원유의 80%를 웃도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가격이 되는 두바이유의 경우 지난해 평균가격(배럴당 49.37달러)보다 15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있는 분야는 수출입.올 들어 5월까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 흑자는 52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97억7000만달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 원유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나 늘어난 것이 결정타였다.
물가도 부담이다.
시·도별로 버스 택시 등의 교통요금을 올렸거나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이 적지 않으며,전기료와 가스요금 등도 인상압박을 받고 있다.
기업들은 원재료 비용부담 급증에 따라 설비투자를 대폭 늘리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에서조차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진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5%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위기상황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외부 변수에 강한 체질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외환위기가 기업들로 하여금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만들었다면 고유가는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효율적 소비구조로 전환토록 압박할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공공부문에서 승용차 10부제를 요일제로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기업 입장에선 고유가가 새로운 수익원천을 제공할 수도 있다.
5년 전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20달러 초반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전 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이익 규모가 3배나 더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은 '검은 황금'을 찾기 위해 해외로 몰려나가고 있다.
올해 기업들의 해외 에너지 개발사업 총 투자액은 3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석유공사는 베트남 15-1광구와 북해 캡틴유전의 성공을 토대로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유전 개발무대를 넓히고 있다.
가스공사도 석유공사와 손잡고 캄차카 유전개발에 뛰어들었으며,우즈베키스탄에선 2개의 가스전 탐사에 나섰다.
대한광업진흥공사도 필리핀과 페루에서 구리 아연 동광 개발에 착수한 데 이어 올 들어선 중국 북한 몽골에도 진출했다.
한국전력은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나이지리아에 동반 진출함으로써 '한국형 유전 확보 모델'을 선보였다.
공기업들의 해외자원 개발은 민간기업에도 자극을 줘 SK㈜ GS칼텍스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상사 LG상사 등 해외 유전· 가스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와 석유공사는 최근 캐나다 국제석유산업전시회에 참가,노천유전이라 할 수 있는 오일샌드(Oil Sand)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집중 분석했다.
정부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망라한 에너지 기업들의 자원개발이 효과를 거둘경우 현재 4% 수준인 원유 및 가스의 자급률이 2013년엔 18%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7년 뒤엔 국내 원유 및 가스 도입량 중 18%를 우리 자본으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유전개발펀드를 출시하는 등 8년간 총 16조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불리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란 태양광 풍력 지열 조력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얻는 것을 말한다.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주축이 된 9개 공기업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모두 1조1000억원가량을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쏟아붓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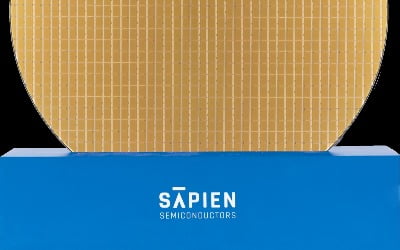
![[단독]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함께 품는다](https://timg.hankyung.com/t/560x0/data/service/edit_img/202406/4bd37d860d109c324069e5663a99d843.jpg)

![美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아마존 시총 2조달러 돌파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A.37133868.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단독] 1%만 쓰는 폰…'영상통화 시대' 이끈 3G 막 내린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74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