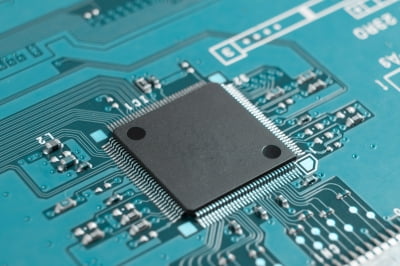[6억이하 주택 재산세 완화] 6억원 기준 '논란' 더 커질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재산세 부담 경감 조치를 발표하면서 6억원 초과 주택은 여전히 제외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먼저 무슨 근거로 재산세 부담 경감 기준을 6억원으로 정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별한 근거 없이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을 조금만 넘더라도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율이 10%에 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6억원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고가 주택' 개념을 적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산세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준은 1999년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정한 것이다.
당시 대상 주택 수도 1만3000가구에 불과했다.
이후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이제 14만 가구로 당시보다 10배 이상 늘어 고가 주택이라고 못박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6억원은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기도 하다.
재산세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한 납세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4억원짜리 주택이 올해 5억6000만원,5억원짜리가 7억원으로 각각 40% 인상된 경우를 살펴보자.
앞의 주택은 세금이 지난해 74만원이었으며 올해는 7만4000원(10%) 늘어난 81만4000원(부가세 제외)만 내면 된다.
그러나 7억원짜리 주택은 지난해 세금이 99만원이었지만 올해엔 재산세 149만원과 종부세 45만원을 더한 194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세부담 증가율이 100%에 육박한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부자가 아닌 중산층도 6억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집값 안정 추세가 확고해지면 사회 통념상 진정 고가 주택이라 할 수 있는 9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먼저 무슨 근거로 재산세 부담 경감 기준을 6억원으로 정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별한 근거 없이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을 조금만 넘더라도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6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율이 10%에 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6억원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고가 주택' 개념을 적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재산세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준은 1999년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정한 것이다.
당시 대상 주택 수도 1만3000가구에 불과했다.
이후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이제 14만 가구로 당시보다 10배 이상 늘어 고가 주택이라고 못박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6억원은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기도 하다.
재산세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한 납세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4억원짜리 주택이 올해 5억6000만원,5억원짜리가 7억원으로 각각 40% 인상된 경우를 살펴보자.
앞의 주택은 세금이 지난해 74만원이었으며 올해는 7만4000원(10%) 늘어난 81만4000원(부가세 제외)만 내면 된다.
그러나 7억원짜리 주택은 지난해 세금이 99만원이었지만 올해엔 재산세 149만원과 종부세 45만원을 더한 194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세부담 증가율이 100%에 육박한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부자가 아닌 중산층도 6억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집값 안정 추세가 확고해지면 사회 통념상 진정 고가 주택이라 할 수 있는 9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