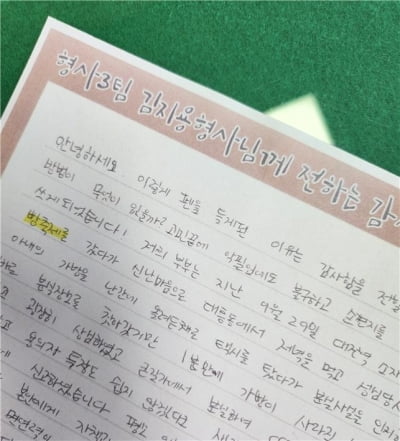발전 민영화 작업 사실상 중단 .. 발전노조 파업 15시간만에 막은 내렸지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회사 노조원들로 구성된 발전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참여정부가 사실상 중단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전의 발전 및 배전부문을 별도 회사로 떼내 민영화한다는 전략은 분할된 발전회사를 경쟁시켜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것.그러나 발전부문만 5개사로 분할된 채 민영화 작업이 중단돼 오히려 전력산업의 효율은 과거 한전 시절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정책실패는 노조에도 "이제는 과거 한전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명분을 제공,파업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도 발전 자회사 증시 상장 및 지분 매각 실패를 시장 상황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정책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멈춰선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7월.기획예산처가 한전을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산업자원부가 주체가 돼 1999년 1월엔 한전의 발전·배전 부문을 분리해 내고 각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한다는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구조개편의 시한은 2009년까지로 정해졌다.
이를 토대로 2001년 4월엔 남동 등 5개 화력 발전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회사가 한전의 자회사로 떼어졌다.
하지만 2002년 38일에 걸친 발전노조의 파업과 2003년 증권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남동발전의 상장 및 지분매각 작업이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1차 파업에 돌입한 발전노조의 주장은 민영화 중단이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4년 6월엔 배전부문의 분할을 중단하고 독립사업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권고까지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노사정위원회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노조의 목소리에 특히 귀를 기울였다"고 전했다.
한전은 이 같은 노사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배전부문을 독립사업부제로 이달 말께 전환키로 한 상태다.
현재 한전은 발전부문이 분리됐지만 6개 회사 모두 100% 한전 자회사로 남아 있고 배전부문은 분리조차 되지 않은 기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룡기업'을 슬림화해 전력생산 및 보급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당초 목표는 사라졌다는 평가다.
발전노조는 1차 파업 이후 자신들의 주장이 일부 수용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번에도 더욱 무리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파업에서 발전노조가 주장한 발전회사 통합은 1999년 구조개편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나 다를바 없다.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참여정부는 2002년 분리된 5개 발전 자회사의 상장 및 지분매각에도 소극적이다.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가장 먼저 민영화 대상으로 꼽힌 남동발전이 대표적인 예.지난 7월 기준으로 이 회사의 장부가는 주당 3만800원.증권회사를 통해 알아 본 공모(구주매각)예정가는 주당 1만3800원.산자부 관계자는 "매각단가가 장부가를 밑돈다면 헐값 매각 시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책임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은 투입자금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발전회사 인수에 적극적이지 않고 자칫 외국계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우려다.
더 큰 문제는 참여정부의 '상생 코드'라는 진단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참여정부가 이제껏 전력산업의 효율화보다는 노조와 노조원에 더 큰 관심을 쏟아왔다는 인상"이라며 "이 같은 분위기에서 일부 근로자의 고통을 요구할 수도 있는 구조개편을 강도 높게 진행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경우에 따라서 공기업 매각단가가 장부가를 밑돌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는 범 정부 차원에서 용인할 수 있다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기본적으로 한전의 발전 및 배전부문을 별도 회사로 떼내 민영화한다는 전략은 분할된 발전회사를 경쟁시켜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것.그러나 발전부문만 5개사로 분할된 채 민영화 작업이 중단돼 오히려 전력산업의 효율은 과거 한전 시절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정책실패는 노조에도 "이제는 과거 한전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명분을 제공,파업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도 발전 자회사 증시 상장 및 지분 매각 실패를 시장 상황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정책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멈춰선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7월.기획예산처가 한전을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산업자원부가 주체가 돼 1999년 1월엔 한전의 발전·배전 부문을 분리해 내고 각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한다는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구조개편의 시한은 2009년까지로 정해졌다.
이를 토대로 2001년 4월엔 남동 등 5개 화력 발전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회사가 한전의 자회사로 떼어졌다.
하지만 2002년 38일에 걸친 발전노조의 파업과 2003년 증권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남동발전의 상장 및 지분매각 작업이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1차 파업에 돌입한 발전노조의 주장은 민영화 중단이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4년 6월엔 배전부문의 분할을 중단하고 독립사업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권고까지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노사정위원회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노조의 목소리에 특히 귀를 기울였다"고 전했다.
한전은 이 같은 노사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배전부문을 독립사업부제로 이달 말께 전환키로 한 상태다.
현재 한전은 발전부문이 분리됐지만 6개 회사 모두 100% 한전 자회사로 남아 있고 배전부문은 분리조차 되지 않은 기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룡기업'을 슬림화해 전력생산 및 보급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당초 목표는 사라졌다는 평가다.
발전노조는 1차 파업 이후 자신들의 주장이 일부 수용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번에도 더욱 무리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파업에서 발전노조가 주장한 발전회사 통합은 1999년 구조개편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나 다를바 없다.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참여정부는 2002년 분리된 5개 발전 자회사의 상장 및 지분매각에도 소극적이다.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가장 먼저 민영화 대상으로 꼽힌 남동발전이 대표적인 예.지난 7월 기준으로 이 회사의 장부가는 주당 3만800원.증권회사를 통해 알아 본 공모(구주매각)예정가는 주당 1만3800원.산자부 관계자는 "매각단가가 장부가를 밑돈다면 헐값 매각 시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책임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은 투입자금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발전회사 인수에 적극적이지 않고 자칫 외국계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우려다.
더 큰 문제는 참여정부의 '상생 코드'라는 진단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참여정부가 이제껏 전력산업의 효율화보다는 노조와 노조원에 더 큰 관심을 쏟아왔다는 인상"이라며 "이 같은 분위기에서 일부 근로자의 고통을 요구할 수도 있는 구조개편을 강도 높게 진행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경우에 따라서 공기업 매각단가가 장부가를 밑돌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는 범 정부 차원에서 용인할 수 있다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