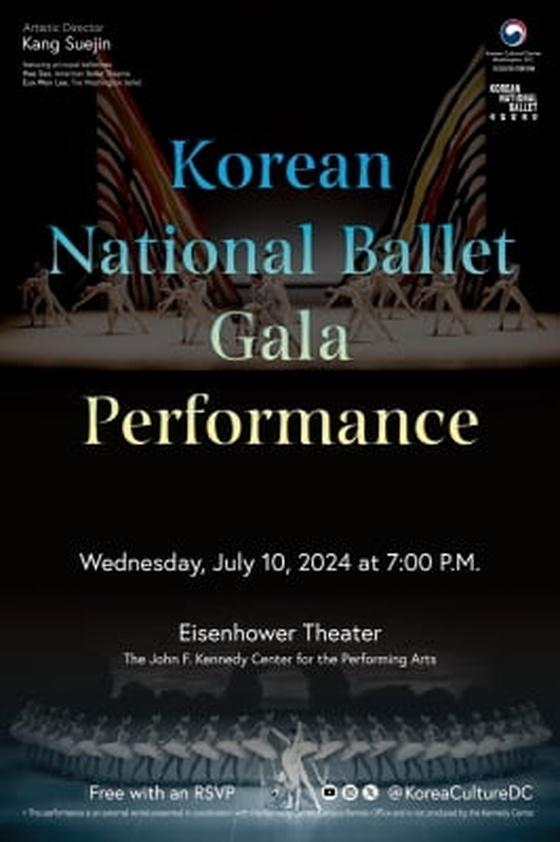[천자칼럼] 성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부하러 혹은 돈 벌러 도시로 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 마을은 온통 시끌벅적해졌다.
마을회관 노래자랑 무대에선 아버지와 아들,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데 어우러지고,그게 끝나면 여기저기서 새벽까지 멍석에 윷 던지며 노는 소리 요란했다.
떠난 자와 남은 자가 한 덩어리가 돼 헤어져 사는 아픔을 달래던 이런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흩어졌던 일가친척이 만나는 건 차례와 성묘(省墓)를 위해서다.
추석에 모인 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산소부터 돌본다.
미리 벌초했어도 그새 자란 잡풀을 뽑고 두더지 구멍은 없는지 살피고 다듬는다.
이런 정경도 점차 보기 힘들어질 모양이다.
1955년 5.8%에 불과하던 화장률(火葬率)이 지난해 50%를 넘어 매장률보다 높아진데다 2012년이면 70%에 이르리라는 것이다.
화장이 늘어나는 건 "매년 여의도만한 땅이 묘지로 변한다"며 화장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도 기인하지만 그보다 장례에 대한 인식 변화가 더 큰 요인으로 꼽힌다.
돌볼 사람 없는 산소를 써봐야 버려진 무덤이 되기 십상이라는 생각이 화장을 택하게 한다는 얘기다.
실제 공원묘원이나 산속마다 잡풀 우거져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무덤 투성이다.
전국 묘지의 40%가 무연고 묘지고 명절 성묘객도 갈수록 줄어든다고 한다.
교통지옥을 무릅쓰고 성묘길에 오르는 심정은 비슷할 것이다.
정신없고 삭막한 세상에서 부모나 조부모 묘를 찾아 어디에도 말 못하는 답답함을 털어놓고 지하에서나마 지켜주기를 빌어보려는.화장,특히 산골(散骨)을 꺼리는 건 죄송한 탓도 있지만 마음 붙일 곳 없어지는 게 두려운 걸 수도 있다.
일껏 화장해놓고도 자연장(自然葬·유골을 나무나 잔디에 뿌리는 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그래서일지 모른다.
그러나 납골당은 또 다른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덤을 잘 돌보거나 근사한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생전에 효도를 다하고 떠나신 뒤엔 자연으로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뉴욕증시, PCE 대기하며 강보합...네이버웹툰 10%↑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280622566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