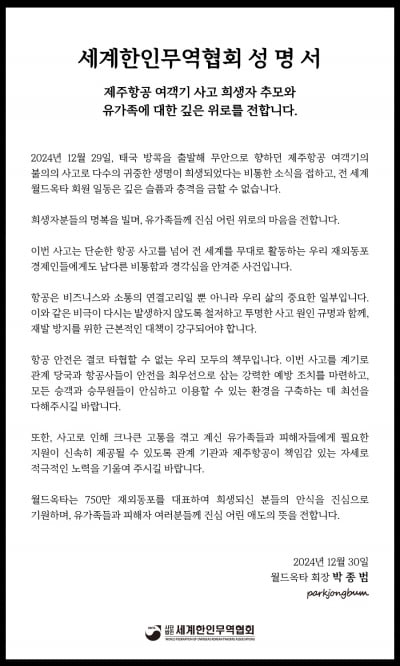[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대통령의 과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통령의 경제학'이라는 말이 있다. 이름에다 '노믹스(nomics)'를 붙이는 게 그런 경우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제학이 내세운 멋진 약속과 실현된 성과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경제학에 무슨 경천동지할 기막힌 해법이 있는 게 아닌 까닭이다. 그래선지 대통령의 경제학은 출세욕에 눈먼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의 합작품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경제학은 그렇다 치고 과학마저 '대통령의 과학'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인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이 과학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미국에서 과학은 사실상 '초당적인(bipartisan)' 영역에 해당된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과학 투자에 대한 효율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과학은 응당 돈이 들어가야 할 분야로 생각해준다. 무엇보다 과학이 국가의 위상, 안위, 존엄 등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뢰가 과학에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국민의 과학''국가의 과학'이다.
과학 투자를 꼭 경제성장 관점에서만 따질 일은 아니다. 과학은 장기적 성장의 토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위상, 안위, 존엄의 기반이라는 측면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어떤가.
국가 정보책임자는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없다고 국회에서 말했다. 정부연구소는 핵실험에 따른 지진파 강도, 장소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였다. 남들은 방사능 물질 탐지에 여념이 없을 때 우리는 방사능 피해가 없다는 얘기나 하고 있었다. 게다가 엊그제까지 그렇게 자랑하던 아리랑 2호는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모를 일이다. 보안, 비밀준수 등 무슨 말못할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 핵실험이 있기 전 과기부는 우리가 직접 우주로 올려 보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한국인 우주인을 선발한다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런 현실조차 서글프게 느껴진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정부는 국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과학의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게 북한 핵실험보다 더 무섭다. 정부는 걸핏하면 과학기술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한다.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일랑 기업과 대학에 맡기고, 정부는 정부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제대로만 해주어도 경제는 발전한다. 따지고 보면 미국은 국방 보건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를 하다 보니 그게 미국의 전략산업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는 세 명의 부총리를 두고 있다. 경제, 교육, 과학기술부총리가 그것이다. 이 세 분야가 중요하다고 해서 부총리를 두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경제는 죽을 쑤고 있고, 교육은 엉망이다. 남은 게 과학기술인데 이마저 실망스럽다. 국민들은 이제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 참여정부는 '대통령의 과학'으로 이른바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내세웠다. 이게 그런 사회인가. 국민들은 '국민의 과학''국가의 과학'을 원한다.
논설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경제학은 그렇다 치고 과학마저 '대통령의 과학'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인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이 과학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미국에서 과학은 사실상 '초당적인(bipartisan)' 영역에 해당된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과학 투자에 대한 효율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과학은 응당 돈이 들어가야 할 분야로 생각해준다. 무엇보다 과학이 국가의 위상, 안위, 존엄 등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뢰가 과학에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국민의 과학''국가의 과학'이다.
과학 투자를 꼭 경제성장 관점에서만 따질 일은 아니다. 과학은 장기적 성장의 토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위상, 안위, 존엄의 기반이라는 측면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어떤가.
국가 정보책임자는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없다고 국회에서 말했다. 정부연구소는 핵실험에 따른 지진파 강도, 장소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였다. 남들은 방사능 물질 탐지에 여념이 없을 때 우리는 방사능 피해가 없다는 얘기나 하고 있었다. 게다가 엊그제까지 그렇게 자랑하던 아리랑 2호는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모를 일이다. 보안, 비밀준수 등 무슨 말못할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 핵실험이 있기 전 과기부는 우리가 직접 우주로 올려 보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한국인 우주인을 선발한다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런 현실조차 서글프게 느껴진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정부는 국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과학의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게 북한 핵실험보다 더 무섭다. 정부는 걸핏하면 과학기술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한다.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일랑 기업과 대학에 맡기고, 정부는 정부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제대로만 해주어도 경제는 발전한다. 따지고 보면 미국은 국방 보건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를 하다 보니 그게 미국의 전략산업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는 세 명의 부총리를 두고 있다. 경제, 교육, 과학기술부총리가 그것이다. 이 세 분야가 중요하다고 해서 부총리를 두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경제는 죽을 쑤고 있고, 교육은 엉망이다. 남은 게 과학기술인데 이마저 실망스럽다. 국민들은 이제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 참여정부는 '대통령의 과학'으로 이른바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내세웠다. 이게 그런 사회인가. 국민들은 '국민의 과학''국가의 과학'을 원한다.
논설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