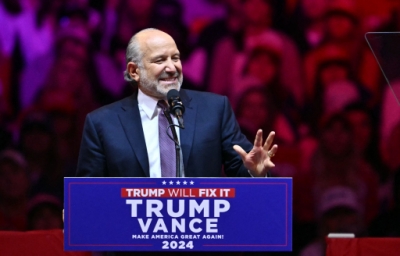정부, 상법 개정안 확정 … '이중대표 소송' 등 제소 요건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무부가 논란이 된 '이중대표소송제도'와 '회사기회 유용 금지' 조항의 제소 요건 등을 강화하는 선에서 상법 개정안을 확정키로 함에 따라 재계는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안타까워 했다.
상법쟁점조정위원회 최종 합의안이 각종 소송요건과 회사기회 유용의 개념을 엄격하게 보완하기는 했지만,본질적으로 무분별한 '남소'를 막는 데 부족할 뿐 아니라 다른 법과의 논리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 조항의 완전 삭제를 기대해온 재계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던 법무부 방침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며 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재계 추천 쟁점조정위 위원인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오전 최종회의에 경황이 없어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뒤늦게 검토해보니 이중대표소송 등에 여전히 문제가 많아 다시 조정안 합의 거부를 구두로 통보했다"고 입장을 번복,사태가 복잡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도입 자체가 문제
재계는 법무부가 이중대표소송 대상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 큰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이중대표소송은 법인격을 무시하는 등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 도입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요건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소송이 봇물을 이뤄 기업 경영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사의 책임 부담 증가로 소극적 경영이 초래되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외자 유치 등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걱정했다.
법무부도 "새 상법 개정안이 이중대표소송의 실질적 책임 요건을 강화한 만큼,설마 (시민단체들에 의해) 이기지 못할 소송이 늘어나겠느냐"는 입장이지만,이런 요건 강화가 소송 건수 자체를 줄일 것으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5일 상법쟁점조정위 비공개 최종 회의를 갖고 이중대표소송 대상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소유한 모자관계 기업이 제소 요건이 되며 모회사 발행 주식 총 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부여된다는 기존 조항 외에 "회사의 집행 임원 지위를 가진 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라는 구절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지분율이 50%가 초과되는 경우 과거처럼 이중대표소송의 제소 요건은 되지만 사법부가 실정법 위반으로 판단을 내리는 데는 '실질 지배 관계'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를 위해 '실질적 지배 관계'를 입증하는 각종 단서조항들을 덧붙여 △회사 소유 관계 △이사와 집행 임원의 겸임 여부 △출자자 중복 여부 등을 통해 사법부가 두 회사 간 실질 지배 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보다 제소 요건이 강화됐다"며 "또 소송 대상의 범위를 한정시켜 무분별한 남소 위험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기회 유용 금지 조항도 존치
법무부가 회사기회 유용 금지 조항과 관련,"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회사 관련 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먼저 얻도록"이라는 이사회 승인 조항을 신설키로 한 데 대해 재계는 "지금도 이사회 승인을 얻으면 회사기회 유용이 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의미가 없는 규정으로 평가절하 했다.
법무부는 회사기회 유용 개념을 상법의 자기거래 내 개념으로만 한정했다.
자기거래 이외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는 상법상 '충실의무' 규정으로 해석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자기거래승인조항' 속에 "이사가 제3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기회를 유용하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승인 요건을 명확히 했다.
또 법무부는 무엇이 '회사기회'인지에 대한 정의 관련 조항 등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회사 업무는 기업 경영 전문가 집단인 집행임원들이 맡고 집행임원들의 회사 운영에 대한 감사는 이사회가 맡도록 하는 집행임원제는 국내 일부 기업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인 관계로 지난해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법무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상 각계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당초 원안과 최종 개정안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욱·이태훈 기자 kimdw@hankyung.com
상법쟁점조정위원회 최종 합의안이 각종 소송요건과 회사기회 유용의 개념을 엄격하게 보완하기는 했지만,본질적으로 무분별한 '남소'를 막는 데 부족할 뿐 아니라 다른 법과의 논리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 조항의 완전 삭제를 기대해온 재계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던 법무부 방침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며 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재계 추천 쟁점조정위 위원인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오전 최종회의에 경황이 없어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뒤늦게 검토해보니 이중대표소송 등에 여전히 문제가 많아 다시 조정안 합의 거부를 구두로 통보했다"고 입장을 번복,사태가 복잡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도입 자체가 문제
재계는 법무부가 이중대표소송 대상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 큰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이중대표소송은 법인격을 무시하는 등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 도입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요건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소송이 봇물을 이뤄 기업 경영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사의 책임 부담 증가로 소극적 경영이 초래되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외자 유치 등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걱정했다.
법무부도 "새 상법 개정안이 이중대표소송의 실질적 책임 요건을 강화한 만큼,설마 (시민단체들에 의해) 이기지 못할 소송이 늘어나겠느냐"는 입장이지만,이런 요건 강화가 소송 건수 자체를 줄일 것으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5일 상법쟁점조정위 비공개 최종 회의를 갖고 이중대표소송 대상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소유한 모자관계 기업이 제소 요건이 되며 모회사 발행 주식 총 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부여된다는 기존 조항 외에 "회사의 집행 임원 지위를 가진 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라는 구절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지분율이 50%가 초과되는 경우 과거처럼 이중대표소송의 제소 요건은 되지만 사법부가 실정법 위반으로 판단을 내리는 데는 '실질 지배 관계'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를 위해 '실질적 지배 관계'를 입증하는 각종 단서조항들을 덧붙여 △회사 소유 관계 △이사와 집행 임원의 겸임 여부 △출자자 중복 여부 등을 통해 사법부가 두 회사 간 실질 지배 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보다 제소 요건이 강화됐다"며 "또 소송 대상의 범위를 한정시켜 무분별한 남소 위험에서 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기회 유용 금지 조항도 존치
법무부가 회사기회 유용 금지 조항과 관련,"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회사 관련 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먼저 얻도록"이라는 이사회 승인 조항을 신설키로 한 데 대해 재계는 "지금도 이사회 승인을 얻으면 회사기회 유용이 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의미가 없는 규정으로 평가절하 했다.
법무부는 회사기회 유용 개념을 상법의 자기거래 내 개념으로만 한정했다.
자기거래 이외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는 상법상 '충실의무' 규정으로 해석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자기거래승인조항' 속에 "이사가 제3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기회를 유용하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승인 요건을 명확히 했다.
또 법무부는 무엇이 '회사기회'인지에 대한 정의 관련 조항 등도 대폭 강화했다.
한편 회사 업무는 기업 경영 전문가 집단인 집행임원들이 맡고 집행임원들의 회사 운영에 대한 감사는 이사회가 맡도록 하는 집행임원제는 국내 일부 기업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인 관계로 지난해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법무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상 각계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당초 원안과 최종 개정안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욱·이태훈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