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창당에서 분당까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백년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돛을 올렸던 열린우리당이 창당한 지 고작 3년3개월여 만에 사실상 분당 사태라는 암초에 걸려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2007년 대선의 해가 밝았지만 당이 지리멸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거센 정계개편의 격랑에 휘말리면서 출항 초반에 침몰한 `타이타닉'호와 같은 처지가 된 것.
우리당은 2003년 11월11일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 40명과 한나라당 탈당파 의원 5명, 개혁국민정당 의원 2명 등 47명이 중심이 돼 `왜소'하게 출범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퇴임으로 3김시대가 막을 내림과 동시에 영호남 지역기반을 양분하고 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틈바구니에서 지역구도 타파와 전국정당 건설, 금권정치 타파 등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한국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구축에 나섰다.
첫 항해에서는 대통령 탄핵 등 소수여당의 비애를 겪는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회 과반 획득이라는 만선의 기쁨을 맛봤다.
우리당은 2004년 1월11일 첫 전당대회에서 정동영(鄭東泳) 의장이 선출된 후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했고,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감행에 따른 거센 역풍 속에 4.15 총선에서 일약 152석을 차지하며 기염을 토했다.
우리당은 이른바 `의회권력' 교체라는 기록도 세웠다.
우리당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개혁세력이 의회를 장악했다"며 기세등등한 개선장군이 돼 17대 국회의 문을 열었지만, 압승 뒤에는 아득한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개혁 대 실용'이라는 모호한 정체성 논쟁으로 서로를 깎아내렸고, `백팔번뇌'라는 별칭처럼 108명의 여당 초선의원들은 일체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한 튀는 언행으로 혼선을 가중시켰다.
여기에 당과 원내 지도부를 분리한 `투톱시스템'은 출발부터 삐걱거렸고,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는 현역의원들이 배제된 채 정치적 경험이 일천한 개혁당파 출신 인사 등에 장악돼 지도부를 끊임없이 흔들어댔다.
내부적 혼란이 가중된 상태에서 맞은 2004년 첫 정기국회는 우리당 추락의 신호탄이나 다름없었다.
민생과는 동떨어진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입법을 전면에 내걸었다가 한나라당의 육탄저지에 막혀 사실상 좌절되면서 우리당의 개혁동력은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당청갈등도 여권의 동반추락을 가속화시킨 요인이었다.
노 대통령과 여당은 인사와 주요 정책에서 사사건건 충돌했고,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싼 당청 갈등은 총선 직후 한나라당 출신 김혁규(金爀珪) 의원을 총리로 내정하는 과정에서 시작돼 최근 김병준(金秉準) 전 교육부총리 사퇴 파문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여권을 흔들어댔다.
그 사이 현 김근태(金槿泰) 의장까지 2년10개월 동안 9차례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정상 지도부 보다는 `비상체제'가 상시화되는 기형적 모습을 보였다.
17대 총선 직후 한때 50% 가까이 치솟았던 지지율은 2년여만에 10% 전후로 급전직하했고, 2005년 이후 치러진 각종 재.보선에서는 `40대 0'의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정치권의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 버렸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치러진 작년 10.26 재.보선마저 참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우리당 내에서는 정계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만류로 정계개편 논의가 정기국회 이후로 늦춰지긴 했지만 한 번 터진 물꼬는 우리당을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끌고 갔다.
당해체 후 제세력 통합을 주장하는 중도.실용 성향의 통합신당파와 `질서있는 정계개편론'을 내세운 친노(親盧) 성향의 당사수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당헌 개정, 전당대회 개최, 노 대통령 탈당문제 등 사사건건 대립하는 형국을 보였다.
마침내 통합신당파 내에서는 더이상 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비등, 탈당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당 사수파는 뒤늦게 자신의 주장을 대폭 후퇴시키면서 당의 분열사태를 막으려 나섰지만, 3년 가까이 방치했던 갈등이 곪을 대로 곪은 상태에서 탈당의 흐름을 되돌리긴 역부족이었다.
지난달 22일 임종인(林鍾仁) 의원이 탈당의 첫 테이프를 끊은 이후 이계안(李啓安) 최재천(崔載千) 천정배(千正培) 염동연(廉東淵) 정성호(鄭成湖) 의원이 개별 탈당했고, 6일 김한길 전 원내대표와 강봉균(康奉均) 전 정책위의장이 주도하는 집단탈당 사태로 이어졌다.
당 지도부와 사수파는 집단탈당의 아픔 속에서도 14일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합신당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상황은 쉽사리 안정될 것 같지 않다.
전대의 성사 여부 마저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당 지도부로서는 집단탈당 이후 형성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으면서도 대통합신당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후속 탈당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전히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통합신당파 의원들은 탈당을 거둬들인 게 아니라 전대 후 지도부의 통합작업을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당이 정당사의 한 페이지에서 나름대로 정치개혁에 기여한 성공한 정치세력으로 규정될지, 실패한 정치실험 집단으로 전락할지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놓여있는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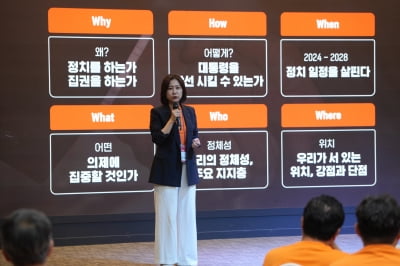



![강달러에 주춤한 금값…"기관이 사면 30% 오를 것" 전망도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168235.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