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이 저수지로 물이유입만 되고 유출은 없다고 하자.당연히 저수지에 물이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수위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제 시간이 지나 물이 조금씩 유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크면 저수지 수면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입량이 서서히 줄고 유출량이 많아지다가 어느 날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아지면 저수지 수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드디어 유출량이 유입량보다 많아지면 저수지 수면이 내려가면서 결국 어느 날 바닥이 드러날 것이다.
저수지 물이 고갈되는 것이다.
저수지 물은 고갈돼도 여전히 졸졸 흘러들어오는 물은 있다.
문제는 내보내야 할 물의 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수지에 물이 저장될 틈이 없다는 것이다.
물은 흘러들어오는 즉시 다 나가버린다.
이제 정체를 밝힐 때가 됐다.
이 저수지의 이름은 국민연금기금이다.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로 저수지로 인식하면 된다)
물은 돈이다.
유입되는 물은 납부되는 연금 보험료이며 유출되는 물은 퇴직자가 받는 연금수령액이다.
또한 현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고 퇴역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중간에 쌓인 돈을 잘 운용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 국민연금기금관리공단이다.
저수지의 관리자인 셈이다.
연금제도가 시작되면 처음에는 들어오는 물만 있다.
납부되는 보험료만 있는 것이다.
일정 기간 열심히 연금보험료를 낸 사람에 한해 연금수령권이 주어지므로 처음에는 나가는 물이 없다.
저수지 수면이 올라가듯 기금은 급속히 불어난다.
세월이 흘러 드디어 최초 가입자 중 퇴직을 해 연금수령권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면서(이 사람들을 퇴역자라고 하자)
이제 물이 조금씩 흘러나가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렇게 흘러나가는 액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급설계를 하면서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도록 설계를 했다는 것이다.
낼 때는 본인 4.5%,회사 4.5%를 합쳐 소득의 9%를 내도록 해놓고 20년 납부를 기준으로 받아갈 때는 소득평균의 60% 정도를 받도록 설계한 것이다.
9%와 60%라는 숫자는 그냥 단순비교만 해도 큰 차이가 난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자녀를 충분히 많이 낳고 이 자녀들이 성장해 보험료를 잘 내는 가입자가 된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떤가.
주지하다시피 저출산 현상이 일반화됐다.
한 해 신생아 숫자는 50만명이 안 된다.
연금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정도 인원으로는 제도를 유지하기 힘들다.
조금 내고 많이 받도록 돼 있는 연금수급 공식에다가 저출산 노령화 추세가 급격해지면서 저수지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현재는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출량이 더 빨리 증가한다.
이대로 라면 2030년쯤 유출량과 유입량이 동일해 지고 그 이후에는 유출량이 유입량보다 많아지면서 저수지 수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추산대로 라면 2047년 저수지가 텅 비게 된다.
바로 기금의 고갈 현상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제도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2047년에도 연금보험료를 내는 현역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출생한 신생아들은 그 시점에 만 40세로 연금보험료를 열심히 내고 있을 것이다)
그 때에도 저수지로 물이 졸졸 흘러들어오듯 돈이 들어올 것이지만 퇴역과 현역의 비율은 이미 깨진 지 오래다.
2047년의 현역이 내는 보험료로는 퇴역이 받을 60%의 연금수령액을 절대로 커버할 수 없다.
그냥 단순계산으로도 퇴역 한 명당 현역 7명은 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2명 남짓이다.
기금운용은커녕 연금보험료 수입 전액으로도 지급될 연금을 감당할 수가 없고 돈은 들어오는 즉시 다 나가버린다.
쌓일 틈이 없다.
이런 식으로 현역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다 모아서 즉시 퇴역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면서 기금이 쌓일 틈 없이 운용되는 연금보험 시스템을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이라고 한다.
기금이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하겠지만 약속은 여전히 지킬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서서히 가시화되면 연금제도는 재앙이 되기 시작한다.
본인이 약속받은 액수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 일이 터지기 전에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뾰족한 수는 없다.
적게 걷고 많이 받는 '신나는 구조'에서,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실망스러운 구조'로 가는 수밖에 없다.
혹자는 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수익이 낮다고 하는데 공단의 기금운용수익률은 오히려 높은 편이다.
역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금운용이 아니라 현역과 퇴역의 비율 그리고 수급공식이다.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져 버린 구조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인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개혁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기금고갈 시점을 2047년에서 2070년께로 20여년 뒤로 미루는 방안에 불과하다
기금관리공단의 한 고위 간부가 한번은 농담을 던졌다.
얘기인즉슨 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임기구회사에 로비를 해 불량률을 높여야겠다는 것이다.
불량률이 높아져야 원치 않거나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 많이 이뤄지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출산이 증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농담을 했겠느냐마는 농담 뒤에 숨어있는 위기감이 절실하게 와 닿았던 기억이 난다.
/서울시립대 교수 chyun@uc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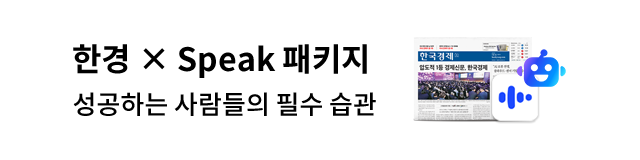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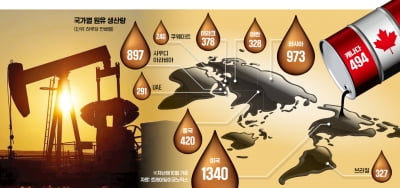


![[속보]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사망 원인 조사 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3.1802382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