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을 찍어내는 기계, 앤디 워홀 즐기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왜냐하면 살아서 팝아트 작가였던 앤디 워홀은 죽어서는 미술사의 고전이 된 동시에 현대 미술계에서 아직도 힘을 발휘하는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나는 기계가 되고 싶다(I want to be a machine)"고 말한 워홀은 자신의 작업실을 스튜디오가 아닌 '팩토리(Factory)'라고 불렀다.
워홀은 예술가의 작업실을 대량 소비사회에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울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간주했고, 자신을 무감각하게 작품을 찍어내는 공장의 생산기계로 여겼다.
삼성미술관 리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미술계에 불고 있는 앤디 워홀 붐을 총결산하는 대규모 전시 '앤디 워홀 팩토리'전을 통해 워홀 공장의 내부를 엿볼 수 있다.
리움 지하 2층 전시실에서 워홀 공장의 생산 라인이 시작된다.
워홀의 황소머리 실크스크린을 벽지처럼 바른 전시장 입구를 통과하면 오른쪽 벽면에는 캠벨 수프 통조림을 실크스크린으로 떠낸 연작들이, 정면에는 마릴린 먼로의 얼굴을 여러가지 색으로 변주해 찍어낸 연작들이 시선을 붙잡는다.
뒤돌아서면 1962년 당시에 제조된 코카콜라 병과 하인즈 케첩 박스, 브릴로 박스 등 공산품들이 1960년대 미국 사회를 연상시킨다.
이어서 재클린 케네디, 실베스타 스텔론 등 유명인의 얼굴, 대형 비행기 사고 소식에 충격받아 시작된 재난 연작, 꽃 연작 등과 1970년대 중국과 러시아를 장악했던 마오쩌둥과 소련 깃발, 총과 칼의 이미지 등 워홀의 시기별 대표작들이 지하 2층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한 층 위 블랙박스 전시장은 예술가면서 동시에 스타가 되고자했던 앤디 워홀이라는 인간에 초점을 맞췄다.
가난한 폴란드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스타를 동경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버리지 않았던 워홀, 자신을 드러내려했지만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로 세부 모습은 생략하고 결점을 숨겼던 워홀의 모습이 담긴 자화상들을 볼 수 있다.
또 워홀이 제화점 직원으로 일할 때 그린 구두 일러스트나 전위 예술가 요세프 보이스나 트루먼 카포티, 장 미셸 바스키아, 키스 헤링 등의 초상화, 자신의 얼굴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어 확대해 인화한 후 그 위에 덧칠을 한 작품,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가발을 쓰면서 즐거워했던 워홀의 사진 등이 벽면을 가득 채웠다.
6월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를 위해 앤디 워홀의 고향 피츠버그에 있는 앤디 워홀 미술관에서 실크스크린, 조각, 사진, 영화, 드로잉 등 200여점이 들어왔다.
워홀이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해낸 제품들은 무엇이었을까? 앤디 워홀 미술관의 토머스 소콜로프스키 관장은 "워홀은 자신이 사는 시대를 반영하는 것,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수집가를 소비자로 간주하고 그들의 주문에 따라 작품의 색상과 크기를 정해 생산해냈다"고 말했다.
어린이를 위한 워홀 따라하기 전시와 별도 방에 마련된 워홀의 1966년 설치작품 '실버 클라우드' 등 전시를 마무리하는 코너도 재미있다.
☎02-2014-6555.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
!["공연할 곳 없다" 아우성인데…희망고문으로 끝난 CJ라이브시티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5719264.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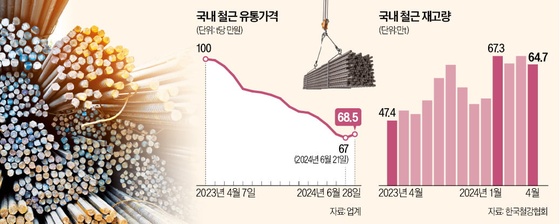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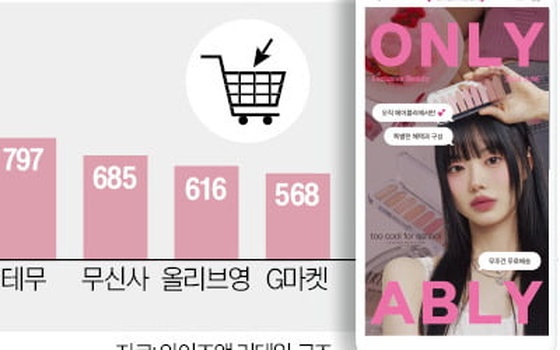
!["공연할 곳 없다" 아우성인데…희망고문으로 끝난 CJ라이브시티 [이슈+]](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7/01.3571926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