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타결] 제약‥고혈압환자 약값부담 한해 4만6720원 늘어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 의약품 소비자들은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오리지널 신약에 비해 값이 싼 복제약을 쓸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늘어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는 미국계로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의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의 사례를 따져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노바스크는 1999년 국내 시장에 출시된 이후 매년 1000억원 내외의 매출을 올린 초대형 의약품으로 꼽혔다. 그러나 노바스크는 국내 한미약품이 2004년 9월 성분과 약효는 유사하지만 염을 일부 변경한 개량신약 '아모디핀'을 개발해 내놓으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아모디핀은 지난해 무려 48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만큼 노바스크의 매출은 줄어든 것이다.
아모디핀 1정의 가격은 396원으로 노바스크(524원)보다 128원(약 24%) 낮다.
따라서 하루 1정씩 1년간 아모디핀을 복용한 고혈압 환자들은 노바스크를 복용했을 때보다 연 4만6720원(128원x365일)의 약값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FTA 협상에서 오리지널 신약 허가 후 5년간 자료독점권을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허 만료 이전에 국내 제약사가 개량신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졌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약값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정은 제네릭 의약품(복제약)도 마찬가지다.
제네릭의약품 허가·특허 연계,허가절차 지연 시 오리지널 약 특허 기간 연장 등이 시행되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 출시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가격이 최소 20%가량 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네릭 의약품 출시 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약가 부담 가중은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 압박으로 이어진다.
환자들이 내야 하는 약값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약가 부담 상승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오리지널 신약에 비해 값이 싼 복제약을 쓸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늘어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는 미국계로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의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의 사례를 따져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노바스크는 1999년 국내 시장에 출시된 이후 매년 1000억원 내외의 매출을 올린 초대형 의약품으로 꼽혔다. 그러나 노바스크는 국내 한미약품이 2004년 9월 성분과 약효는 유사하지만 염을 일부 변경한 개량신약 '아모디핀'을 개발해 내놓으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아모디핀은 지난해 무려 48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만큼 노바스크의 매출은 줄어든 것이다.
아모디핀 1정의 가격은 396원으로 노바스크(524원)보다 128원(약 24%) 낮다.
따라서 하루 1정씩 1년간 아모디핀을 복용한 고혈압 환자들은 노바스크를 복용했을 때보다 연 4만6720원(128원x365일)의 약값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FTA 협상에서 오리지널 신약 허가 후 5년간 자료독점권을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허 만료 이전에 국내 제약사가 개량신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졌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약값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정은 제네릭 의약품(복제약)도 마찬가지다.
제네릭의약품 허가·특허 연계,허가절차 지연 시 오리지널 약 특허 기간 연장 등이 시행되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의약품 출시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가격이 최소 20%가량 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네릭 의약품 출시 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약가 부담 가중은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 압박으로 이어진다.
환자들이 내야 하는 약값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약가 부담 상승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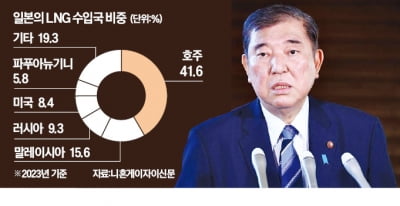
![[단독] 매그나칩반도체 4년 만에 매각 시동…LX·두산·DB 인수 후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A.393813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