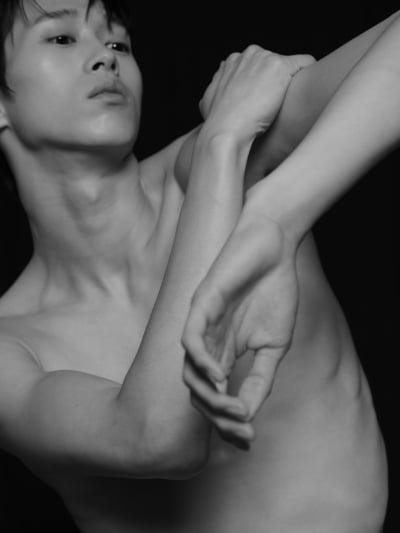[토요스페셜] 미술시장, 인기작가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외 미술 시장이 함께 달아오르고 있다.
국내 미술시장은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2005년 말부터 되살아나고 있고 국제 미술시장은 1997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열린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1959년생인 피터 도이그의 작품이 573만2000파운드에 낙찰돼 생존작가로서는 처음으로 1000억원대의 낙찰가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 3월 국내 경매에서는 박수근의 작품이 두 번이나 20억원대에 낙찰됐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미술시장도 국제 미술시장과 흐름을 같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술품 가격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는 중요한 일이 국내외에서 연달아 생겼던 것이다.
이처럼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미술 시장에서는 과열에 따른 가격 거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우리 미술시장이 1990년대 중반처럼 다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든다고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
미술시장의 시스템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미술시장의 지표를 제시하고 자정기능을 해줄 경매라는 제도가 없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 국내 미술시장의 호황과 지금의 호황은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
당시 국내 미술시장은 살롱식 판매 방식에 따라 일부 작가에만 매기가 집중됐던 반면 지금은 넓은 계층이 미술시장으로 유입되어 젊은 작가로부터 원로작가까지 인기작가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그 동안 미술시장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로 여겨졌던 호당 가격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작품의 크기가 아닌 질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시기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점은 미술시장에 일부 눈먼 부동자금이 유입돼 일시적으로 미술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아줄 보루가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술시장은 시장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미술계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미술품 감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보가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십억원대에 거래되는 박수근,이중섭,김환기 작품만 보더라도 전작 도록이 발간되어 있지 않다.
전작 도록은 작가의 예술적 창작물을 집대성한 것으로 기준작을 제시할 문화적 공감대의 산물이다.
모처럼 찾아온 미술시장의 호기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현장 종사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학준 서울옥션 전무
국내 미술시장은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2005년 말부터 되살아나고 있고 국제 미술시장은 1997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열린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1959년생인 피터 도이그의 작품이 573만2000파운드에 낙찰돼 생존작가로서는 처음으로 1000억원대의 낙찰가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 3월 국내 경매에서는 박수근의 작품이 두 번이나 20억원대에 낙찰됐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미술시장도 국제 미술시장과 흐름을 같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술품 가격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는 중요한 일이 국내외에서 연달아 생겼던 것이다.
이처럼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미술 시장에서는 과열에 따른 가격 거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우리 미술시장이 1990년대 중반처럼 다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든다고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
미술시장의 시스템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미술시장의 지표를 제시하고 자정기능을 해줄 경매라는 제도가 없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 국내 미술시장의 호황과 지금의 호황은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
당시 국내 미술시장은 살롱식 판매 방식에 따라 일부 작가에만 매기가 집중됐던 반면 지금은 넓은 계층이 미술시장으로 유입되어 젊은 작가로부터 원로작가까지 인기작가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그 동안 미술시장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로 여겨졌던 호당 가격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작품의 크기가 아닌 질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시기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점은 미술시장에 일부 눈먼 부동자금이 유입돼 일시적으로 미술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아줄 보루가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술시장은 시장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미술계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미술품 감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보가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십억원대에 거래되는 박수근,이중섭,김환기 작품만 보더라도 전작 도록이 발간되어 있지 않다.
전작 도록은 작가의 예술적 창작물을 집대성한 것으로 기준작을 제시할 문화적 공감대의 산물이다.
모처럼 찾아온 미술시장의 호기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현장 종사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학준 서울옥션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