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바그다드에서 안정화작전 이후 사망자 증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문에 따르면 바그다드 안정화작전이 시작된 2월14일 이후 지난 2일까지 7주간 이라크 전체에서 전투나 폭력사태 등으로 인한 미군 사망자 수는 116명으로, 작전이 시작되기 전의 7주간의 사망자 113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 기간 바그다드에서의 미군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이전 7주간의 29명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또한 수니파와 시아파 무장세력 간의 대립이 심각한 바그다드 인근 북동부의 디얄라 지역의 미군 사망자도 이전 7주간의 10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특히 바그다드의 디얄라에서 미군의 사망은 대부분 도로 매설 폭탄에 의해 발생, 바그다드의 경우 사망자의 83%가, 디얄라에서는 15명 중 14명이 매설폭탄에 의해 사망했다.
반면 바그다드에 전력이 집중되면서 변방지역 등에서는 미군 사망자가 줄고 있다.
수니파 반군의 중심지인 안바르 지역의 경우 최근 7주간 미군 사망자는 31명으로 이전 7주간의 46명보다 감소했다.
신문은 증원된 미군을 폭력사태가 심각한 바그다드 주변에 배치해 순찰과 이라크인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분파간 전쟁터의 한 가운데로 미군을 몰아넣는 셈이라며 사망자 증가의 원인을 지적했다.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니파와 시아파, 쿠르드족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안정된 지역을 만든다는 바그다드 안정화 작전의 주요 목적이 달성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골칫거리 환율마저 안정세…쾌속 질주하는 '코끼리'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70172.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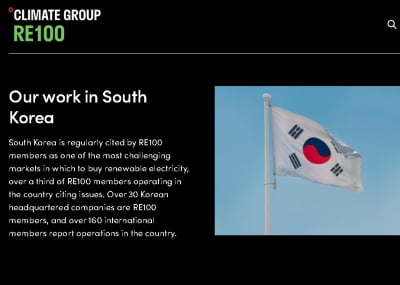
![[단독]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함께 품는다](https://timg.hankyung.com/t/560x0/data/service/edit_img/202406/4bd37d860d109c324069e5663a99d843.jpg)

![강달러에 주춤한 금값…"기관이 사면 30% 오를 것" 전망도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168235.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단독] 1%만 쓰는 폰…'영상통화 시대' 이끈 3G 막 내린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74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