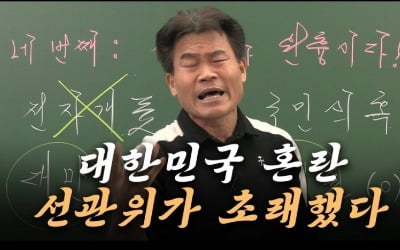제60회 칸 국제영화제는 익히 알려진 거장들과 신예들의 대결이었다.
28일 새벽(현지시간 27일)에 나온 향연의 결과는 대체로 신예들의 손을 높이 든 쪽에 가깝다.
여기서 거장과 신예의 구별은 상대적이다.
이창동 감독을 신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통을 지닌 칸 영화제의 구도에서는 신예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루마니아 영화 '4개월,3주 그리고 2일'(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의 황금종려상 수상 소식은 충분히 예상할 만한 결과였고 여배우로서는 드물게 영화제 내내 언론과 평단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전도연의 여우주연상 수상 결과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2000년대 이후 새로운 감독들과 영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려는 현상은 세계 국제영화제의 공통된 현상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환대받은 것이 한국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화는 1950년대부터 꾸준히 소개되었고 중국 영화는 1980년대부터 베를린 영화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소개된 것에 반해 한국 영화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 영화는 임권택,홍상수,김기덕,박찬욱 감독의 역량을 앞세워 각종 국제영화제를 통해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 사이 국내에서는 관객 1000만명 시대를 돌파하면서 영화 산업의 파워를 높여 갔다.
한국 영화의 국제화는 국내 영화 산업의 성장이라는 기치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웠다.
그 사이 한류 열풍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했고,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은 이제 영화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영향력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산업적인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 몇 년간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류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시아(특히 일본)를 중심으로 펼쳐진 구도는 지속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한국 영화는 큰 기대 속에 일본 시장에 소개되었다.
(이것은 한국 영화 전체 해외 수출액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다) 그러나 몇몇 스타에 의존한 한류 열풍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 시작했다.
올해 칸 영화제의 여우주연상 수상 결과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 한류 열풍 운운하는 것 역시 '스타 마케팅'의 시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호명하는 것은 배우의 역량에 대한 인정도 크지만,무엇보다 작품의 완성도가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여우주연상은 배우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전체에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이를 통해 과거와 같은 한류 열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기대는 시기상조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지속적인 분위기를 국내외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은 유럽의 지성적인 감독들이 물고 늘어져 온 '인간과 신,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집요하게 탐구하는 영화이다.
이러한 영화를 만들어 온 감독들의 앞자리에는 로베르 브레송,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그리고 현재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다르덴 형제를 들 수 있다.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주제를 현대적으로 실천해 온 이들의 탐구는 영화 미학을 인간 본질의 탐구에 올려놓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영화는 일반 대중에게 크게 환영받지는 못한다.
한국 영화계의 스크린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다양한 영화를 향유하도록 만들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창동 감독은 과감했다.
존재의 탐구는 산업의 영향 아래 있는 한 감독이 쉽게 선택하기 힘든 도전이다.
그것은 예술의 모험이다.
칸 영화제의 수상 결과는 예술의 모험이 환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도록 해 준다.
칸에서 날아온 낭보가 기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경에세이] '녹색갈증'과 농촌의 희망](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39108475.3.jpg)
![[기고] 방치할 수 없는 '그냥 쉰' 청년 45만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386834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