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이 달라지고 있다] (5) 獨, 기업별 교섭 확산ㆍ佛, 4~5년마다 단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선진국 노사 교섭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산별'에서 '개별 기업별'로 전환되는 추세다.
기업 간 무한 경쟁으로 매출 경영정책 임금 등 기업 상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면서 공동교섭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결정적인 이유다.
독일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같은 노사교섭체계의 분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멘스 노사는 2004년 2월 주당 35시간인 근로시간을 임금 인상 없이 40시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뤄진 타결이었다.
임금 지불 능력이 산별단체협약 수준에 못 미치는 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개방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아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채용에 나서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단체협약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재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독일에서는 상급 노조에 모든 권한이 쏠려 있고 사업장 내에서는 노조활동이 금지돼 있다.
물론 집단행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독일 금속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려면 조합원 75%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프랑스는 1개 기업에 여러 노조가 난립해 있어 독일보다는 좀 복잡하다.
하지만 단협은 대부분 4년 또는 5년마다 체결하고 불법정치파업도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은 기업별 교섭이 90%를 넘었다.
일부 산별교섭도 이뤄지고 있으나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산별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미국은 노사 교섭 구조가 기업이나 공장 수준으로 분권화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전통산업인 섬유 건설 인쇄 등의 산업은 산별 또는 지역별 교섭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기업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기업 간 무한 경쟁으로 매출 경영정책 임금 등 기업 상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면서 공동교섭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결정적인 이유다.
독일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 같은 노사교섭체계의 분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멘스 노사는 2004년 2월 주당 35시간인 근로시간을 임금 인상 없이 40시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뤄진 타결이었다.
임금 지불 능력이 산별단체협약 수준에 못 미치는 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개방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아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채용에 나서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단체협약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재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독일에서는 상급 노조에 모든 권한이 쏠려 있고 사업장 내에서는 노조활동이 금지돼 있다.
물론 집단행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독일 금속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려면 조합원 75%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프랑스는 1개 기업에 여러 노조가 난립해 있어 독일보다는 좀 복잡하다.
하지만 단협은 대부분 4년 또는 5년마다 체결하고 불법정치파업도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은 기업별 교섭이 90%를 넘었다.
일부 산별교섭도 이뤄지고 있으나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산별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미국은 노사 교섭 구조가 기업이나 공장 수준으로 분권화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전통산업인 섬유 건설 인쇄 등의 산업은 산별 또는 지역별 교섭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기업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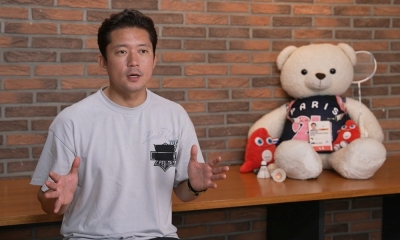
![최장 9일 설 연휴 끝…다시 일상으로 [중림동 사진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66051.3.jpg)
![[속보] 제주 해상서 어선 2척 좌초 "인명피해 확인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2.2257924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