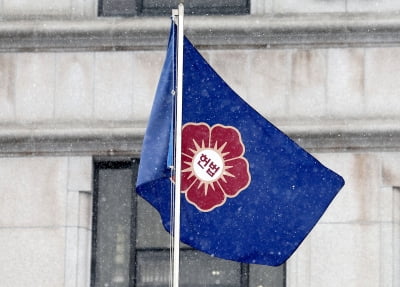[국민연금법 국회 통과] 88년 가입 月300만원 직장인 116만원->108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연금 지급액을 줄이고,저소득 노인 300만명에게 월 8만원 정도의 생계지원비를 주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용돈연금'(국민연금법 개정안)이란 비난과 '대책 없는 선심성 정책'(기초노령연금법)이란 비판도 있지만,대체적으로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연금재정 안정화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발걸음'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된데다 개혁의 실마리를 풀었다는 의미에서다.
이제 연금 가입자들의 관심은 법 개정으로 연금수령액이 얼마나 깎이고,기초노령연금은 얼마나 받게 될지에 쏠리고 있다.
◆초기 가입자 7만~8만원 깎여
연금액 변동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계층은 1988년 연금 초기 가입자로 앞으로 10년 정도 더 보험료를 부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노령연금 수령 시기인 60세까지 40년 만기 가입이 힘들어 대부분 가입 기간이 30년쯤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연금지급률 조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지급률을 내리더라도 그동안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급률을 2028년까지 20년간에 걸쳐 6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만큼 깎이는 금액이 적다.
월평균 과세소득이 360만원인 직장인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30년간 월평균 16만2000원(나머지 16만2000원은 회사 부담)의 보험료를 냈다면 연금수령액은 131만원에서 126만원으로 5만원(3.8%) 깎이게 된다.
300만원 소득자의 경우는 116만원에서 108만원으로 8만원(6.9%) 준다.
월소득 50만원으로 2만2500원씩 냈던 사람은 52만원에서 49만원으로 떨어져 여전히 월소득에 가까운 연금을 평생 동안 타게 된다.
문제는 앞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다.
월 300만원 소득자가 2008년 가입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107만원 받지만 앞으로는 78만원으로 29만원(27.1%) 감액된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취직하는 직장인이 40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금수령액은 지금보다 30% 이상 깎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 하위 20%는 기초노령연금까지
연금 지급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월 8만3000원 수준)에서 2028년엔 10%(월 27만원 수준)로 올라가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은 내년에 전체 노인의 60%(301만명)로 시작해 2009년 70%(363만명)로 정점을 찍은 후 연금 지급 확대와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점차 떨어지게 된다.
2028년이면 국민연금 수령자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58.3%(기타 특수직연금 수령자 3.1%는 별도)에 달하면서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을 좀 낮춰도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와 국회의 생각이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여러 상황을 감안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비중을 56.2%(1118만8000명 중 629만명)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득영 복지부 기초노령연금총괄팀장은 "국민연금 수급자 중 하위 20% 정도는 연금을 받으면서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받아 노후소득 수준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직연금 개혁도 서둘러야
국회와 정부는 국회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언제 얼마씩 올릴 것인지와 궁극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이번 개혁이 완결편은 아닌 만큼 내년 연금재정 재계산에 맞춰 보험료율 조정 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초노령연금의 과다한 재원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기초노령연금을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비례해서 올려주지 않고 물가상승률만큼 조정해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금재정 전문가들은 또 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에 관한 법 제·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논의의 무게중심은 △기초노령연금 재원 마련 방안 △연금기금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투명성을 위한 기금 지배구조 개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기타 특수직연금의 개혁 등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용돈연금'(국민연금법 개정안)이란 비난과 '대책 없는 선심성 정책'(기초노령연금법)이란 비판도 있지만,대체적으로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연금재정 안정화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발걸음'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된데다 개혁의 실마리를 풀었다는 의미에서다.
이제 연금 가입자들의 관심은 법 개정으로 연금수령액이 얼마나 깎이고,기초노령연금은 얼마나 받게 될지에 쏠리고 있다.
◆초기 가입자 7만~8만원 깎여
연금액 변동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계층은 1988년 연금 초기 가입자로 앞으로 10년 정도 더 보험료를 부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노령연금 수령 시기인 60세까지 40년 만기 가입이 힘들어 대부분 가입 기간이 30년쯤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연금지급률 조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지급률을 내리더라도 그동안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급률을 2028년까지 20년간에 걸쳐 6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만큼 깎이는 금액이 적다.
월평균 과세소득이 360만원인 직장인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30년간 월평균 16만2000원(나머지 16만2000원은 회사 부담)의 보험료를 냈다면 연금수령액은 131만원에서 126만원으로 5만원(3.8%) 깎이게 된다.
300만원 소득자의 경우는 116만원에서 108만원으로 8만원(6.9%) 준다.
월소득 50만원으로 2만2500원씩 냈던 사람은 52만원에서 49만원으로 떨어져 여전히 월소득에 가까운 연금을 평생 동안 타게 된다.
문제는 앞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다.
월 300만원 소득자가 2008년 가입할 경우 현행대로라면 107만원 받지만 앞으로는 78만원으로 29만원(27.1%) 감액된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취직하는 직장인이 40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금수령액은 지금보다 30% 이상 깎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 하위 20%는 기초노령연금까지
연금 지급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월 8만3000원 수준)에서 2028년엔 10%(월 27만원 수준)로 올라가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은 내년에 전체 노인의 60%(301만명)로 시작해 2009년 70%(363만명)로 정점을 찍은 후 연금 지급 확대와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점차 떨어지게 된다.
2028년이면 국민연금 수령자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58.3%(기타 특수직연금 수령자 3.1%는 별도)에 달하면서 노인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을 좀 낮춰도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와 국회의 생각이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여러 상황을 감안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비중을 56.2%(1118만8000명 중 629만명)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득영 복지부 기초노령연금총괄팀장은 "국민연금 수급자 중 하위 20% 정도는 연금을 받으면서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받아 노후소득 수준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직연금 개혁도 서둘러야
국회와 정부는 국회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언제 얼마씩 올릴 것인지와 궁극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이번 개혁이 완결편은 아닌 만큼 내년 연금재정 재계산에 맞춰 보험료율 조정 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초노령연금의 과다한 재원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기초노령연금을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비례해서 올려주지 않고 물가상승률만큼 조정해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금재정 전문가들은 또 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에 관한 법 제·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논의의 무게중심은 △기초노령연금 재원 마련 방안 △연금기금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투명성을 위한 기금 지배구조 개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기타 특수직연금의 개혁 등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