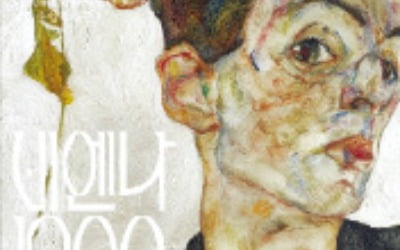"삶의 끝도 품위있게‥잘 죽는 것이 웰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어느 날 갑자기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박모씨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죽음은 곧 절망을 뜻하지 않는가'라며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었다.
두려움에 떨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절망적인 상태에서 숨을 거뒀다.
반면 차분하고 지적인 50대 여성 김모씨는 속이 더부룩해 병원에 갔다가 회복불능의 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충격에 휩싸인 남편과 아이들을 설득해 마음 속 이야기를 다 나눈 후 편안한 마음으로 먼 여행을 떠났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반응과 죽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다.
박씨처럼 고통과 분노 속에 끝까지 죽음을 부정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 여유있고 품위있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있다.
한림대 생사학(生死學)연구소장 오진탁 교수는 '웰다잉'을 위한 지혜를 담은 책 '마지막 선물'(세종서적)에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이런 차이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 책에서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절망과 두려움,부정,분노,슬픔,삶의 마무리,수용,희망,마음의 여유와 웃음,밝은 죽음 등 9가지로 구분한다.
두려움,절망,분노 등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것.그러나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특별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그는 설명한다.
문제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과 방식이다.
누구나 맞게 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금기해서는 행복한 죽음을 맞을 수가 없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서 바람직한 죽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과정이며 삶을 비쳐주는 거울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죽음은 끝'이라는 무지한 생각이 자살을 부른다고 그는 경고하면서 호스피스 봉사자와 임사(臨死) 체험자의 증언,종교의 가르침,빙의현상 등을 근거로 죽음은 끝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오 교수는 "우리 삶은 죽음에 의해 마감되므로 잘 죽지 못한 삶은 결코 웰빙일 수 없다"면서 죽음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것,치료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자신의 죽음 방식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의료진에 미리 표명할 것,장례방식과 장기기증 여부 결정,유서 쓰기 등 웰다잉을 위한 7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한다.
아울러 새로운 죽음 문화를 위해 웰다잉 교육,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언,호스피스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죽음은 곧 절망을 뜻하지 않는가'라며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쉬었다.
두려움에 떨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절망적인 상태에서 숨을 거뒀다.
반면 차분하고 지적인 50대 여성 김모씨는 속이 더부룩해 병원에 갔다가 회복불능의 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충격에 휩싸인 남편과 아이들을 설득해 마음 속 이야기를 다 나눈 후 편안한 마음으로 먼 여행을 떠났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반응과 죽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다.
박씨처럼 고통과 분노 속에 끝까지 죽음을 부정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반면 여유있고 품위있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는 사람들도 있다.
한림대 생사학(生死學)연구소장 오진탁 교수는 '웰다잉'을 위한 지혜를 담은 책 '마지막 선물'(세종서적)에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이런 차이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 책에서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절망과 두려움,부정,분노,슬픔,삶의 마무리,수용,희망,마음의 여유와 웃음,밝은 죽음 등 9가지로 구분한다.
두려움,절망,분노 등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것.그러나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특별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그는 설명한다.
문제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과 방식이다.
누구나 맞게 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금기해서는 행복한 죽음을 맞을 수가 없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서 바람직한 죽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과정이며 삶을 비쳐주는 거울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죽음은 끝'이라는 무지한 생각이 자살을 부른다고 그는 경고하면서 호스피스 봉사자와 임사(臨死) 체험자의 증언,종교의 가르침,빙의현상 등을 근거로 죽음은 끝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오 교수는 "우리 삶은 죽음에 의해 마감되므로 잘 죽지 못한 삶은 결코 웰빙일 수 없다"면서 죽음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것,치료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자신의 죽음 방식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의료진에 미리 표명할 것,장례방식과 장기기증 여부 결정,유서 쓰기 등 웰다잉을 위한 7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한다.
아울러 새로운 죽음 문화를 위해 웰다잉 교육,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언,호스피스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이 아침의 화가] 작품 가장 비싼 생존작가…에드 루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107774.3.jpg)
![[날씨] 월요일 출근길 눈·비…7일부터 '강추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ZN.3910663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