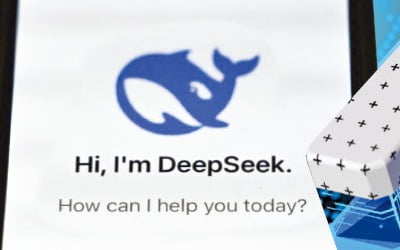[우리는 글로벌 기업] 두산그룹 ‥ 외국기업 사냥 노하우로 현지 인재들 한 식구처럼 품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를 '글로벌 두산' 원년으로 정한 두산그룹이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린 시점은 2005년이다.
당시 미국의 수(水)처리 전문기업인 AES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M&A'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듬해인 2006년에는 루마니아의 크베너,영국의 미스이밥콕을 잇따라 '접수'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연대유화기계에 이어 국내 '글로벌 M&A' 사상 규모가 가장 큰 미국 '밥캣'을 인수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났다.
밥캣 인수 비용은 해외 지주회사 설립 자본금을 포함해 무려 51억달러(4조8000억원)에 달한다.
결국 '글로벌 두산'의 향해는 공격적인 글로벌 M&A로 한솥밥을 먹게 된 해외 기업들을 어떻게 잘 이끌고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밥캣' 인수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브랜드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밥켓 경영진의 물음에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큰 돈을 들여 가치를 사는 것인데 브랜드를 왜 바꾸냐"며 반문했다.
수차례에 걸친 해외 M&A를 통해 피(彼)인수기업의 개성을 살리는 데서 성공이 시작된다고 판단한 두산의 숨은 '노하우'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밥캣 최고경영자(CEO)에 기존 경영진을 유임시킨 것도 똑같은 맥락이다.
두산은 데이비드 롤스 밥캣 사장에게 지주회사격인 두산인프라코어인터내셔널을,스콧 넬슨 해외사업총괄 임원에게는 밥캣을 맡겼다.
두산은 해외계열사에 대한 간섭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다.
두산은 미국에 지주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인터내셔널(DII)'을 별도로 설립해 밥캣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미국 지주회사 이사회에는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의 최소 인력만 파견한다는 방침도 굳혔다.
"해외 파견 인력을 최소화하고 현지 임직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조직 융합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온 박용성 회장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다.
두산은 새 식구가 된 해외 기업에는 최대의 자율을 보장하는 가운데 국내 직원들에게는 이들과의 '시너지' 강화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두산은 올해 해외 계열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를 경영 과제로 내세웠다.
인사체계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두산은 GE(제너럴 일렉트릭)의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조언을 구하면서까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해외시장 개척에도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밥캣을 인수하면서 단숨에 전세계 건설기계 부문 7위에 오른 두산인프라코어는 2012년까지 매출액 120억달러를 달성해 전세계 3위권 안에 들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은 올해 말 완공되는 베트남 생산기지를 통해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고 지난해 수주한 인도 문드로 화력발전소와 아랍에미리트 제벨알리 복합발전소 사업에도 가속도를 낸다.
두산은 올해 매출 목표인 23조원 가운데 60% 이상을 해외에서 달성하고 2015년에는 해외매출 비중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