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으로부터 최근 한국인 이민자 관련 연구비 20만달러를 받은 한국인이 있다. 이 연구원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주인공은 캘리포니아 주립대(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심리학과의 전지아 교수다.
전 교수는 "미국에서 한국 이민자들의 우울증 비율이 다른 어떤 아시아계 이민자들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한국인이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전 교수는 재미교포 1.5세다. 무역진흥공사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따라 중학교때 미국에 건너간 이후 고등학교와 대학을 모두 미국에서 마쳤다. 전 교수는 누구보다 한국 이민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미국 이민을 권하지 못한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한국인 고교생이 이민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자살한 사건을 보고 같은 한국인으로서 충격을 받았다"며 "원래 유전공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민 온 한국인들의 힘든 점을 이해하고 이를 공부해 보고자 임상심리학을 전공하게 됐다"고 했다.
전 교수는 "미국의 수많은 이민자들 가운데 한국인들이 유독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툰 한국인들의 특성상 스트레스를 직접 풀기보다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한국 이민자들의 우울증 비율도 비교적 높다는 설명이다. 심할 경우 가정폭력과 마약, 도박, 알콜중독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분출해 문제가 커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단적인 예가 지난해 미국 전역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조승희 총기 난사 사건'이다.
전 교수는 "조씨의 경우 사건 이전부터 여러 '징후(Warning sign)'를 보였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쉽다"면서 "내성적 성격의 조씨도 스트레스를 제대로 표현할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풀이했다.
조씨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 교수가 꼽은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오랜 치료다.
그는 "특히 이민자 자녀의 경우 부모는 생업에 바쁜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스스로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아무리 바쁘더라도 부모가 아이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족들이 꾸준한 치료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전 교수는 "조씨도 사건 이전에 심리 치료를 받았으나 본인의 거부로 치료가 이어지지 않았다. 가족들이 조씨의 치료에 함께 나섰어야 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러기 아빠'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전 교수는 "기러기 아빠에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심리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아버지와 떨어져 유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 과정에 결코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어머니마저 같이 살지 않는 '낙하산 아이들(Parachute Kids)'은 마약과 도박에 빠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서 성적이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어 미국으로 오는 아이들의 경우 미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무작정 떠나고 보자는 식의 이민이나 유학은 대부분 실패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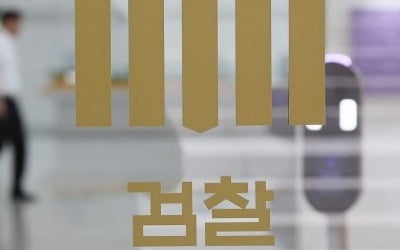
!["불매운동 오래가지 않을 것"…유니클로 말이 맞았다 '바글바글'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1665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