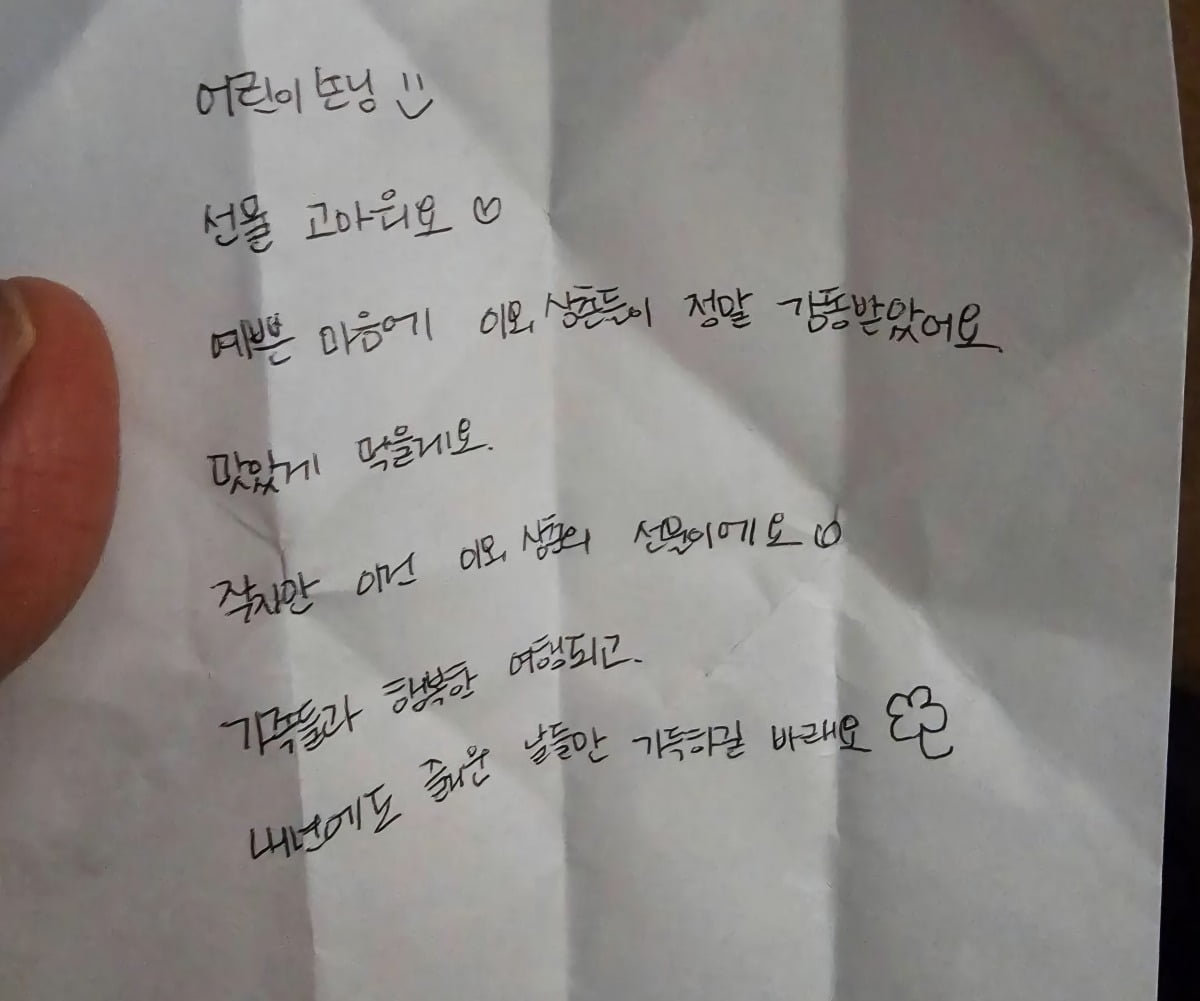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몸살 앓는 소비자들에겐 희소식이다.
정부가 52개 생필품을 집중 관리하는 데 맞춰 대형마트들이 발빠르게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상도 풍긴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
대형마트의 기획 행사 때만 되면 제조업체들은 끙끙 앓기 일쑤다.
제조업체들은 "행사기간 중 우리 제품이 안 팔리기만 바랄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제조업체가 판매 부진을 원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사연인 즉 이렇다.
대형마트들은 창사 기념 이벤트 같은 대형 행사 때 제품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예사다.
가격을 대폭 낮추고도 유통마진은 유지하는 마술을 부린다.
이는 제조업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납품하기에 가능하다.
10년 전 가격만큼의 손실은 모조리 제조업체 몫이란 얘기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행사 기간 중 제품이 잘 팔리면 추가로 공급 요구가 온다.
납품하는 만큼 손해가 커지지만 대형마트의 요구에 제조업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
칫솔 세제 같은 생필품은 한 번 사면 몇 달을 쓰니 기획 행사 때 많이 팔리는 제품은 그 이후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제조업체로선 원가 이하 납품에다 판매 공백까지 견뎌내야 한다.
반면 대형마트는 행사 제품이든 일반 제품이든 잘만 팔리면 매출과 순이익이 그만큼 늘어난다.
경기가 나빠도 대형마트들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내는 기술이다.
고유가ㆍ고원자재 속에 제조업체가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는데 대형마트의 행사 강요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으로 다가온다.
제조업체가 대형마트에 밉보이면 결과는 뻔하다.
제품 진열에서 차별받고 납품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매장 철수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한 제조업체 영업 담당자는 "대형마트의 기획 행사에서 제외되는 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귀띔했다.
소비자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제조업체의 팔목을 비트는 대형마트의 두 얼굴이 클로즈업된다.
대형마트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중소 제조업체와의 '상생 경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진수 생활경제부 기자 true@hankyung.com


![[토요칼럼] 동네 체육센터의 1초컷 신청 마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36897407.3.jpg)

![[취재수첩] 재난 앞에 '오락가락' 국토부, 철저한 조사로 불안 없애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3284402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