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화보]③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건설은 해외진출 10여년 만인 1976년에 ‘20세기 최대 역사(役事)’라 불린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따냈다. 수주 이면은 행운과 반전의 연속이었다.
현대건설은 뒤늦게 입찰에 참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입찰 예정 10개 업체 중 9개사를 선정해 놓은 상태였는데 뒤늦게 뛰어든 현대건설에게도 한 장의 티켓을 줬다. 행운의 서막이었다.
주베일 산업항 공사의 입찰 예정가는 10억 달러. 입찰 보증금으로 공사액의 2%인 2000만 달러를 내는 조건이었다. 현대건설은 입찰 보증금을 낼 여력이 없없다. 아랍 수리조선소 공사 관계로 거래를 하고 있던 바레인 국립은행에 도움을 요청했다.
두 번째 행운이 날아왔다. 바레인 국립은행은 입찰 마감 나흘 전에 입찰 보증을 섰다. 입찰 자격은 얻었다. 이제는 입찰가격으로 고민하게 됐다.
현대건설은 처음에 15억 달러를 써낼 계획이었다. 다시 12억 달러로 하향조정했다가 막판에 8억7천 만 달러로 결정했다. 정주영 회장이 최종 사인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당시 전갑원 상무는 입찰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 정주영 회장의 지시를 어기고 9억3,114만 달러를 적어냈다. 입찰 후 현대건설 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있어 그 회사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전갑원 상무의 얼굴은 사색이 됐다.
문제는 그 업체의 공사범위가 현대건설보다 적었다. 현대건설이 사실상 최저 입찰인 셈이었다. 게다가 현대건설은 44개월의 공사 기간을 조건 없이 8개월 단축하겠다는 제의를 했다. 최종 수주업체는 현대건설로 돌아갔다. 세 번째 행운이었다.
현대건설의 수주 금액 9억3,114만 달러는 당시 한국 총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현대건설은 선수금으로 2억 달러를 받았다. 당시 외환은행장은 정주영 회장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선수금 입금으로) 오늘 건국 이후 최고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했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축하했다는 일화가 있다.
남은 과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약소한 대로 공기를 단축해서 준공하는 일만 남았다. 이익이 나는 공사를 하는 것도 당연했다. 정주영 회장은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다. “모든 자재를 국내에서 송출하라”고 지시한다.
울산조선소에서 자재를 제작해서 바지선(무동력선)으로 끌고 가라는 명령이었다. 울산에서 주베일까지 거리는 1만2,000여km. 경부고속도로를 열다섯 번 왕복하는 거리다.
그렇다고 자재가 작은 부피도 아니다. 자재 그 자체로 하나의 건축물만 했다. 해상에 설치할 구조물인 자켓(jacket)은 가로 18m,세로 20m, 높이 36m에 무게는 550톤에 달했다. 10층 빌딩 규모다.
주베일 산업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켓 89개가 필요했고 19번에 걸쳐 날라야 했다. 1만 마력짜리 터그보트 3척, 20만톤급 대형 바지선 3척, 5만 톤급 바지선 3척으로 기자재 수송작전을 펼쳤다.
페르시아만 해상의 수심 30m나 되는 곳에서 파도에 흔들리면서 중량 5백50톤짜리 자켓을 한계 오차 5c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주베일 산업항 공사의 핵심이었다. 그렇게 현대건설은 20세기 최대 역사를 끝내고 세계 건설시장에 명함을 내밀게 된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
현대건설은 뒤늦게 입찰에 참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입찰 예정 10개 업체 중 9개사를 선정해 놓은 상태였는데 뒤늦게 뛰어든 현대건설에게도 한 장의 티켓을 줬다. 행운의 서막이었다.
주베일 산업항 공사의 입찰 예정가는 10억 달러. 입찰 보증금으로 공사액의 2%인 2000만 달러를 내는 조건이었다. 현대건설은 입찰 보증금을 낼 여력이 없없다. 아랍 수리조선소 공사 관계로 거래를 하고 있던 바레인 국립은행에 도움을 요청했다.
두 번째 행운이 날아왔다. 바레인 국립은행은 입찰 마감 나흘 전에 입찰 보증을 섰다. 입찰 자격은 얻었다. 이제는 입찰가격으로 고민하게 됐다.
현대건설은 처음에 15억 달러를 써낼 계획이었다. 다시 12억 달러로 하향조정했다가 막판에 8억7천 만 달러로 결정했다. 정주영 회장이 최종 사인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당시 전갑원 상무는 입찰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 정주영 회장의 지시를 어기고 9억3,114만 달러를 적어냈다. 입찰 후 현대건설 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있어 그 회사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전갑원 상무의 얼굴은 사색이 됐다.
문제는 그 업체의 공사범위가 현대건설보다 적었다. 현대건설이 사실상 최저 입찰인 셈이었다. 게다가 현대건설은 44개월의 공사 기간을 조건 없이 8개월 단축하겠다는 제의를 했다. 최종 수주업체는 현대건설로 돌아갔다. 세 번째 행운이었다.
현대건설의 수주 금액 9억3,114만 달러는 당시 한국 총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현대건설은 선수금으로 2억 달러를 받았다. 당시 외환은행장은 정주영 회장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선수금 입금으로) 오늘 건국 이후 최고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했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축하했다는 일화가 있다.
남은 과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약소한 대로 공기를 단축해서 준공하는 일만 남았다. 이익이 나는 공사를 하는 것도 당연했다. 정주영 회장은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다. “모든 자재를 국내에서 송출하라”고 지시한다.
울산조선소에서 자재를 제작해서 바지선(무동력선)으로 끌고 가라는 명령이었다. 울산에서 주베일까지 거리는 1만2,000여km. 경부고속도로를 열다섯 번 왕복하는 거리다.
그렇다고 자재가 작은 부피도 아니다. 자재 그 자체로 하나의 건축물만 했다. 해상에 설치할 구조물인 자켓(jacket)은 가로 18m,세로 20m, 높이 36m에 무게는 550톤에 달했다. 10층 빌딩 규모다.
주베일 산업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켓 89개가 필요했고 19번에 걸쳐 날라야 했다. 1만 마력짜리 터그보트 3척, 20만톤급 대형 바지선 3척, 5만 톤급 바지선 3척으로 기자재 수송작전을 펼쳤다.
페르시아만 해상의 수심 30m나 되는 곳에서 파도에 흔들리면서 중량 5백50톤짜리 자켓을 한계 오차 5c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주베일 산업항 공사의 핵심이었다. 그렇게 현대건설은 20세기 최대 역사를 끝내고 세계 건설시장에 명함을 내밀게 된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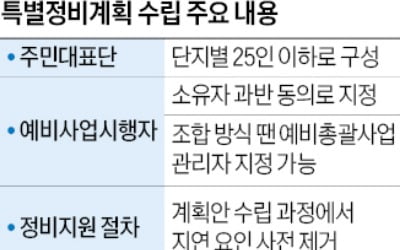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