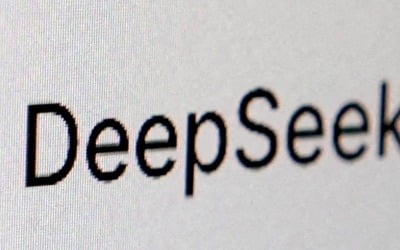MB맨은 없다지만…과거권력투쟁과 '닮은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 "MB맨은 없다"며 특정 인물이 권력의 실세로 등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계파가 나뉘어 권력투쟁으로 비화하는 움직임을 막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면 정권 내 권력투쟁은 계파가 아니라 정권의 위기 속에 터져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청와대 공격'과 가장 비슷한 과거 사례로 2000년 정동영 당시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내 동교동계를 상대로 진행했던 '정풍(整風)운동'을 들 수 있다.
당시 정 전 최고위원이 당내에 이렇다 할 조직적 기반이 없었다는 점과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부통령으로 불리던 권노갑 최고위원 등 측근들을 공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의 측근이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나누어주던 '제왕적 대통령제'에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지던 시기라는 점도 비슷하다.
면전에서 '2선 퇴진'을 요구받은 권 전 최고위원은 이후 당의 인기가 떨어질 때마다 인적 쇄신 대상으로 공격받아 결국 정계를 떠나게 됐으며 정 전 최고위원은 이를 계기로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반면 정두언 의원의 공격 대상으로 거명되는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과거 인물로는 안희정씨와 이광재 의원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386핵심이었던 이들은'좌희정,우광재'로 불리며 여권의 핵심 실세로 떠올랐다.
하지만 실세로서 국정 전반에 행사하는 영향력에 비해 정치적 우군(友軍)이 적었고,이는 여당 내에서도 공격을 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두 사람은 결국 대선자금 수수와 '유전게이트' 등의 권력형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정권 전반기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계파가 나뉘어 권력투쟁으로 비화하는 움직임을 막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면 정권 내 권력투쟁은 계파가 아니라 정권의 위기 속에 터져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청와대 공격'과 가장 비슷한 과거 사례로 2000년 정동영 당시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내 동교동계를 상대로 진행했던 '정풍(整風)운동'을 들 수 있다.
당시 정 전 최고위원이 당내에 이렇다 할 조직적 기반이 없었다는 점과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부통령으로 불리던 권노갑 최고위원 등 측근들을 공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의 측근이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나누어주던 '제왕적 대통령제'에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지던 시기라는 점도 비슷하다.
면전에서 '2선 퇴진'을 요구받은 권 전 최고위원은 이후 당의 인기가 떨어질 때마다 인적 쇄신 대상으로 공격받아 결국 정계를 떠나게 됐으며 정 전 최고위원은 이를 계기로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반면 정두언 의원의 공격 대상으로 거명되는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과거 인물로는 안희정씨와 이광재 의원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386핵심이었던 이들은'좌희정,우광재'로 불리며 여권의 핵심 실세로 떠올랐다.
하지만 실세로서 국정 전반에 행사하는 영향력에 비해 정치적 우군(友軍)이 적었고,이는 여당 내에서도 공격을 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두 사람은 결국 대선자금 수수와 '유전게이트' 등의 권력형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정권 전반기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