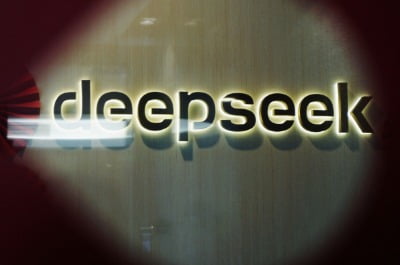"산별교섭 한국현실과 안맞아" … 상의, 산별교섭 토론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별교섭 체제는 기업별 교섭이 강화되는 글로벌 흐름과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노사문화를 고려할 때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교 인하대 교수(법학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산별교섭,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현대.기아차동차 등에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면 파업을 벌이겠다며 위협하는 가운데 나온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유럽 국가들의 산별교섭 체제는 18세기 산업화 초기부터 노조가 직업별.업종별.산업별로 조직되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것으로 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교섭의 전통을 이어온 한국 여건에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산별교섭 강요는 시대착오
이 교수는 "최근의 국제 경제 흐름에서 볼 때 경영환경 변화에 신축 대응할 수 있는 기업별 교섭이 확산되는 추세"라며 "노동계의 산별교섭 주장은 불법 정치파업을 일삼은 민주노총의 행태를 감안할 때 파업 만능주의와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동계에서 산별교섭의 장점으로 꼽는 임금격차 축소와 관련해서도 "산별교섭 전환을 통해 동일업종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기업별 노사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하지만 대기업 노조원들이 임금 저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업종 근로자 간 근로조건 평준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덕제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과)는 "노조가 산업별 노조,산업별 교섭을 지향하는 것은 기업 차원을 벗어난 것으로 정치적인 세력 강화가 일차적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산별노조 파업권 제한해야
정주연 고려대 교수(경제학과)도 '산별교섭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기업별 교섭체제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돼 온 것으로 산별교섭 체제로 단시일 내에 전환하기 어렵다"며 "일부 노조 간부들이 세를 몰아가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유연성 확보 관점에서 볼 때 기업별 교섭이 더 큰 강점이 있고 기업들로서는 이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영범 한성대 교수(경제학과)는 "지금은 산업노조와 개별 사업장에서 중복 파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래선 안된다"며 "해외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산별교섭을 이루려면 사용자 측에도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노조 측 이해만 강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과)는 "국내 산별노조는 사회보장제도나 고용보험 등 사회적 임금보다는 개별임금을 높이려는 쪽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수언/김미희 기자 sookim@hankyung.com
이재교 인하대 교수(법학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산별교섭,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현대.기아차동차 등에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면 파업을 벌이겠다며 위협하는 가운데 나온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유럽 국가들의 산별교섭 체제는 18세기 산업화 초기부터 노조가 직업별.업종별.산업별로 조직되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것으로 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교섭의 전통을 이어온 한국 여건에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산별교섭 강요는 시대착오
이 교수는 "최근의 국제 경제 흐름에서 볼 때 경영환경 변화에 신축 대응할 수 있는 기업별 교섭이 확산되는 추세"라며 "노동계의 산별교섭 주장은 불법 정치파업을 일삼은 민주노총의 행태를 감안할 때 파업 만능주의와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동계에서 산별교섭의 장점으로 꼽는 임금격차 축소와 관련해서도 "산별교섭 전환을 통해 동일업종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기업별 노사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하지만 대기업 노조원들이 임금 저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업종 근로자 간 근로조건 평준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덕제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과)는 "노조가 산업별 노조,산업별 교섭을 지향하는 것은 기업 차원을 벗어난 것으로 정치적인 세력 강화가 일차적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산별노조 파업권 제한해야
정주연 고려대 교수(경제학과)도 '산별교섭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기업별 교섭체제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돼 온 것으로 산별교섭 체제로 단시일 내에 전환하기 어렵다"며 "일부 노조 간부들이 세를 몰아가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유연성 확보 관점에서 볼 때 기업별 교섭이 더 큰 강점이 있고 기업들로서는 이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영범 한성대 교수(경제학과)는 "지금은 산업노조와 개별 사업장에서 중복 파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래선 안된다"며 "해외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산별교섭을 이루려면 사용자 측에도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노조 측 이해만 강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과)는 "국내 산별노조는 사회보장제도나 고용보험 등 사회적 임금보다는 개별임금을 높이려는 쪽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수언/김미희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