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로펌行제한] 선진국에선…美,로비스트법 제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국에서는 로비스트 제도를 통해 고위 공무원 출신들의 로비 활동을 양지로 끌어내거나 취업제한 기간을 길게 해 고위 공무원 출신의 로펌행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로비스트를 합법화해 로비 활동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낸 대표적인 케이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미국은 고위 공직자 출신의 로펌행을 법을 통해 막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출신이 로비스트로 활동할 경우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반드시 신고토록 해 현직과 전직의 불법적인 연결 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로비스트법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차단되면 불법 로비와 같은 부작용이 양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로비스트법을 제정해 활로를 터주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실제 17대 국회에서는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등 3명이 로비스트 관련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연ㆍ지연을 악용한 폐단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 통과되지는 못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취업제한 기간을 길게 해 고위 공직자들의 로펌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들 나라는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퇴직 후 5년 동안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전 3년 퇴직 후 2년'인 우리보다 전후 기간이 약간씩 긴 것이 차이점이다.
우리와 선진국의 차이를 이런 제도적 측면보다는 학맥ㆍ인맥이 먹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전ㆍ현직 고위 공무원의 윤리의식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선진국도 법의 허점이 있고,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로비하는 일도 있지만 한국처럼 마구잡이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며 "인맥과 학맥에 크게 좌우되는 사회 분위기와 서로를 밀고 당겨주는 전ㆍ현직 공무원의 도덕 불감증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 로펌의 경우 경제ㆍ금융전문가를 비롯한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변호사와 함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로펌의 경우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신 관료들이 인기다. 로펌에 있다가 다시 SEC 등 관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회전문 현상도 일반화돼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미국은 로비스트를 합법화해 로비 활동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낸 대표적인 케이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미국은 고위 공직자 출신의 로펌행을 법을 통해 막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출신이 로비스트로 활동할 경우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반드시 신고토록 해 현직과 전직의 불법적인 연결 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로비스트법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차단되면 불법 로비와 같은 부작용이 양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로비스트법을 제정해 활로를 터주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실제 17대 국회에서는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등 3명이 로비스트 관련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연ㆍ지연을 악용한 폐단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 통과되지는 못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취업제한 기간을 길게 해 고위 공직자들의 로펌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들 나라는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퇴직 후 5년 동안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 전 3년 퇴직 후 2년'인 우리보다 전후 기간이 약간씩 긴 것이 차이점이다.
우리와 선진국의 차이를 이런 제도적 측면보다는 학맥ㆍ인맥이 먹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전ㆍ현직 고위 공무원의 윤리의식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선진국도 법의 허점이 있고,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로비하는 일도 있지만 한국처럼 마구잡이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며 "인맥과 학맥에 크게 좌우되는 사회 분위기와 서로를 밀고 당겨주는 전ㆍ현직 공무원의 도덕 불감증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 로펌의 경우 경제ㆍ금융전문가를 비롯한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변호사와 함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로펌의 경우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 출신 관료들이 인기다. 로펌에 있다가 다시 SEC 등 관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회전문 현상도 일반화돼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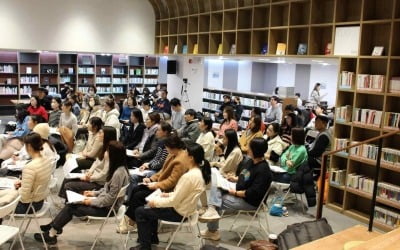
![[포토] '설 연휴 끝' 눈 내리는 출근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6496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