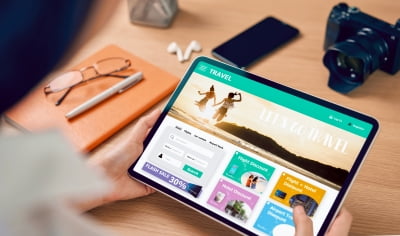식품첨가물만 603종 … 필수인가, 선택인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은 화학조미료 MSG를 많이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비만 가능성이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지난해 말 서울시의 조사 결과 시내 음식점 중 93.7%가 음식 맛을 내기 위해 과다 사용시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화학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과 식품업계는 엄격한 검사를 거쳐 허용하므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 첨가물을 넣은 가공 식품을 기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무첨가ㆍ유기농식품 시장은 갈수록 커지는 게 현실이다. 식품첨가물 유해 논란을 해부해 본다.
◆적정량 넘으면 부작용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2조2항에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할 때 식품에 첨가ㆍ혼입ㆍ침윤 및 기타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규정돼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선 '식품의 외관,향미,조직 또는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적은 양이 식품에 첨가되는 비영양 물질'로 정의한다.
식품첨가물은 식중독을 예방하고 영양과 품질을 유지하며 식품의 대량 생산과 장기 보존을 가능케 하는 순기능이 있다. 식품첨가물로 허용되려면 △인체 무해 △체내 비축적 △미량으로 효과 발생 △화학적 변화에 대한 안전성 △저렴한 가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소량 섭취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은 의약품과 달리 일생 동안 섭취하므로 만성 독성 시험,발암성 시험 등을 거쳐 일일 섭취허용량(ADI)을 정한다. 식품첨가물이 기준치를 넘으면 인체에 부작용을 낳고 화학적 합성품과 결합해 새로운 독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허가된 첨가물 총 603종
현재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품목은 천연 첨가물 201종,화학적 합성품 402종 등 총 603종에 달한다. 대표적인 것이 흔히 방부제로 불리는 '보존료'로 식품의 선도와 품질보존 역할을 한다. 단맛을 가진 화학적 첨가물을 총칭해 '합성 감미료'라고 부른다. 특히 물에 잘 녹는 사카린은 단맛이 같은 양의 설탕보다 250~500배나 강하다. 감칠맛을 내는 화학조미료 'MSG'는 다시마 추출물에서 발견된 물질을 미생물에 의해 발효ㆍ정제한 것이다.
맛ㆍ향처럼 색도 소비자 취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식품에 인공적으로 색깔을 넣는 '착색제'도 있다. 현재 허용된 15종의 타르 색소는 석탄에서 얻은 콜타르로 만들어진다. 소시지 등에는 식품의 색소와 어울려 색을 안정시키거나 발색을 촉진하는 '발색제'도 사용된다. 빵이나 비스킷을 구울 때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베이킹파우더 같은 '팽창제',지방의 산화와 변색을 막는 '산화방지제'도 주요 첨가물 중 하나다.
◆"안전성 문제 없다" vs "무첨가 식품도 만들어라"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흔히 쓰이는 식품첨가물은 안전성 검사를 거쳐 식품공전에 등록된 것이어서 허용 기준 이내에선 인체에 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찬 동원식품과학연구원 부장은 "식품첨가물을 쓰지 않으면 가공 식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어려워 그만큼 식중독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무첨가) 식품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은숙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은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햄 소시지 치즈 같은 식품에 너무 많은 첨가물이 사용되는 게 문제"라며 "무첨가 간장이 나온 것처럼 식품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적게 들어간 것 등을 소비자가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업계에서는 합성 착색료,MSG,보존료 등의 사용을 줄이는 추세다. 지난해 농심 오뚜기 대상 등이 MSG 사용을 중단했다. 인공 첨가물을 찜찜해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가격을 높이더라도 감미료ㆍ색소ㆍ보존료 등을 천연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2.지난해 말 서울시의 조사 결과 시내 음식점 중 93.7%가 음식 맛을 내기 위해 과다 사용시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화학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과 식품업계는 엄격한 검사를 거쳐 허용하므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 첨가물을 넣은 가공 식품을 기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무첨가ㆍ유기농식품 시장은 갈수록 커지는 게 현실이다. 식품첨가물 유해 논란을 해부해 본다.
◆적정량 넘으면 부작용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2조2항에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할 때 식품에 첨가ㆍ혼입ㆍ침윤 및 기타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규정돼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선 '식품의 외관,향미,조직 또는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통 적은 양이 식품에 첨가되는 비영양 물질'로 정의한다.
식품첨가물은 식중독을 예방하고 영양과 품질을 유지하며 식품의 대량 생산과 장기 보존을 가능케 하는 순기능이 있다. 식품첨가물로 허용되려면 △인체 무해 △체내 비축적 △미량으로 효과 발생 △화학적 변화에 대한 안전성 △저렴한 가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소량 섭취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은 의약품과 달리 일생 동안 섭취하므로 만성 독성 시험,발암성 시험 등을 거쳐 일일 섭취허용량(ADI)을 정한다. 식품첨가물이 기준치를 넘으면 인체에 부작용을 낳고 화학적 합성품과 결합해 새로운 독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허가된 첨가물 총 603종
현재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품목은 천연 첨가물 201종,화학적 합성품 402종 등 총 603종에 달한다. 대표적인 것이 흔히 방부제로 불리는 '보존료'로 식품의 선도와 품질보존 역할을 한다. 단맛을 가진 화학적 첨가물을 총칭해 '합성 감미료'라고 부른다. 특히 물에 잘 녹는 사카린은 단맛이 같은 양의 설탕보다 250~500배나 강하다. 감칠맛을 내는 화학조미료 'MSG'는 다시마 추출물에서 발견된 물질을 미생물에 의해 발효ㆍ정제한 것이다.
맛ㆍ향처럼 색도 소비자 취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식품에 인공적으로 색깔을 넣는 '착색제'도 있다. 현재 허용된 15종의 타르 색소는 석탄에서 얻은 콜타르로 만들어진다. 소시지 등에는 식품의 색소와 어울려 색을 안정시키거나 발색을 촉진하는 '발색제'도 사용된다. 빵이나 비스킷을 구울 때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베이킹파우더 같은 '팽창제',지방의 산화와 변색을 막는 '산화방지제'도 주요 첨가물 중 하나다.
◆"안전성 문제 없다" vs "무첨가 식품도 만들어라"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흔히 쓰이는 식품첨가물은 안전성 검사를 거쳐 식품공전에 등록된 것이어서 허용 기준 이내에선 인체에 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찬 동원식품과학연구원 부장은 "식품첨가물을 쓰지 않으면 가공 식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어려워 그만큼 식중독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무첨가) 식품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은숙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은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햄 소시지 치즈 같은 식품에 너무 많은 첨가물이 사용되는 게 문제"라며 "무첨가 간장이 나온 것처럼 식품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적게 들어간 것 등을 소비자가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업계에서는 합성 착색료,MSG,보존료 등의 사용을 줄이는 추세다. 지난해 농심 오뚜기 대상 등이 MSG 사용을 중단했다. 인공 첨가물을 찜찜해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가격을 높이더라도 감미료ㆍ색소ㆍ보존료 등을 천연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