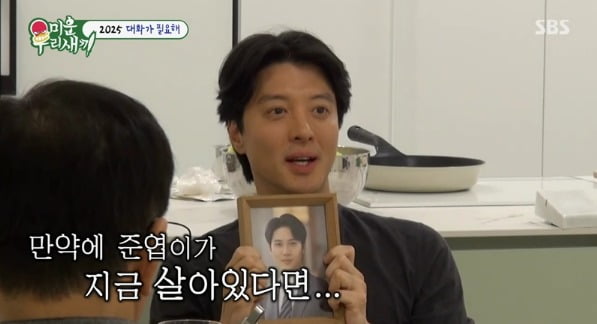[생생! 문화街] 살아서 꿈틀대는 공연의 맛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봄,두 달여를 지속했던 한 뮤지컬의 폐막 공연에서의 일화다.
주연을 맡은 남자 배우가 평소와 같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어진 돌발 상황에 영문도 모르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다른 배우들이 대본에 없는 소품을 불쑥 등장시키는가 하면 평소와는 다른 애드리브를 시도해 적잖이 당황했던 것.이는 시원섭섭한 폐막을 기념하는 앙상블 배우들의 암묵적인 이벤트였고 대부분 관객들은 예상하지 못한 볼거리에 환호했다.
같은 연출가에 같은 배우가 출연해도 공연은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같은 공연이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꾸준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작품이 새로 만들어져 초연을 갖는 경우 시기별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게 한다.
본 공연을 갖기 전 프리뷰(Preview)나 트라이아웃(Try-Out)과 같은 시험 무대에서는 창작의 고민이 끝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한 회 공연이 끝날 때마다 바로 대본이나 연출 부분에서 대폭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대사가 첨삭되면서 배우들 사이에는 대사량과 배역의 비중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어렵사리 초연을 치러내도 초반에는 아직 목이 덜 풀린 배우도 있고 배역에 몰입하지 못해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하지만,관객 입장에서는 본 공연에 비해 30% 이상 저렴한 관람료와 얼리어답터가 된다는 것이 매력이다. 초반에 덜컹거리던 공연이 어느덧 자리를 잡고 일정한 수준을 보여주는 시기를 지나고 폐막일이 가까워오면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
모든 공연이 다 그렇다 볼 수는 없지만 장기 공연에 지루함을 느낀 일부 배우들은 연출가가 극장에 자주 나타나지 않게 되는 시기에 애드리브를 남발하다 경고를 받기도 한다.
반대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공연 도중이라도 더 좋은 연기 아이디어를 찾아내 연출가의 허락 아래 작품에 반영하는 기회를 얻는 사례도 있다. 폐막 공연은 그 작품을 여러 번 관람한 마니아들이 객석을 채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서비스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초연 후 최소 2주 정도가 지난 다음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작품의 본질에 가장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프리뷰나 폐막 공연의 경우 작품이 진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를 준다고 하겠다.
/조용신·공연칼럼니스트
주연을 맡은 남자 배우가 평소와 같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어진 돌발 상황에 영문도 모르고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다른 배우들이 대본에 없는 소품을 불쑥 등장시키는가 하면 평소와는 다른 애드리브를 시도해 적잖이 당황했던 것.이는 시원섭섭한 폐막을 기념하는 앙상블 배우들의 암묵적인 이벤트였고 대부분 관객들은 예상하지 못한 볼거리에 환호했다.
같은 연출가에 같은 배우가 출연해도 공연은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같은 공연이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꾸준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작품이 새로 만들어져 초연을 갖는 경우 시기별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게 한다.
본 공연을 갖기 전 프리뷰(Preview)나 트라이아웃(Try-Out)과 같은 시험 무대에서는 창작의 고민이 끝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한 회 공연이 끝날 때마다 바로 대본이나 연출 부분에서 대폭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대사가 첨삭되면서 배우들 사이에는 대사량과 배역의 비중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어렵사리 초연을 치러내도 초반에는 아직 목이 덜 풀린 배우도 있고 배역에 몰입하지 못해 어색함이 느껴지기도 하지만,관객 입장에서는 본 공연에 비해 30% 이상 저렴한 관람료와 얼리어답터가 된다는 것이 매력이다. 초반에 덜컹거리던 공연이 어느덧 자리를 잡고 일정한 수준을 보여주는 시기를 지나고 폐막일이 가까워오면 내부적으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
모든 공연이 다 그렇다 볼 수는 없지만 장기 공연에 지루함을 느낀 일부 배우들은 연출가가 극장에 자주 나타나지 않게 되는 시기에 애드리브를 남발하다 경고를 받기도 한다.
반대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공연 도중이라도 더 좋은 연기 아이디어를 찾아내 연출가의 허락 아래 작품에 반영하는 기회를 얻는 사례도 있다. 폐막 공연은 그 작품을 여러 번 관람한 마니아들이 객석을 채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서비스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초연 후 최소 2주 정도가 지난 다음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작품의 본질에 가장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프리뷰나 폐막 공연의 경우 작품이 진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를 준다고 하겠다.
/조용신·공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