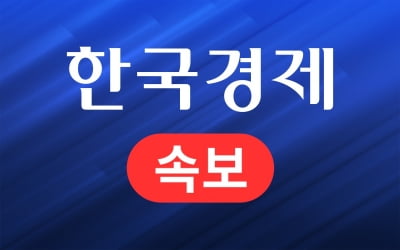[생생! 문화街] 소통 단절되면 하루하루가 고통인 세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톱스타 여배우의 자살로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살다보면 조금씩은 우울증을 겪는다. 때문에 자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노라면 늘 슬프고 언짢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통상 유서를 통해 그 이유를 밝히게 마련이지만 순간적인 충동에 휩싸여 죽음을 맞으면 그 이유가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자살을 결심한 사람을 앞에 두고 있다면 당신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마침내 그를 다시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현재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한 연극은 예술의 형태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살을 결심한 한 사람의 최후변론을 보여주고 있다. 마샤 노먼의 1983년작 '잘자요 엄마(Night,Mother)'다. 등장인물은 단 두 명,어머니와 딸이다.
낙천적인 성격의 어머니는 사별한 남편과 출가한 아들이 없는 집에서 오로지 외동딸에게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 인생의 낙이란 TV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웃고,좋아하는 빵을 먹고,딸에게 매니큐어 칠을 부탁하며 소소한 일상에 만족한다. 하지만 딸은 간질병이 있으며 결혼생활은 파탄났고 가출한 아들은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좀도둑이다.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고 느끼며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던 어느날 딸은 어머니에게 오늘밤 자살하겠다고 예고한다.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어머니는 점차 딸의 진심을 알고 말리다 나중에는 읍소까지 하지만 죽음에 대한 딸의 강한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 딸은 인생이란 푹푹 찌는 여름에 만원버스 안에서 힘겹게 버텨 50블록을 더 가서 내리는 것이니 지금 당장 내리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서 자살을 합리화한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모녀간의 소통되지 않는 감정 대립으로 인해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한다.
자살을 비겁한 현실도피로 보는가,아니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는 주체적인 행위로 보는가에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인류 역사에도 자살이 죄악시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자살은 남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을 남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한발짝 떨어진 무대에서 그 자살을 앞둔 사람의 심경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지? 눈물,콧물이 뒤범벅된 채 무대 인사를 하러 나오는 배우들을 보면서 실제로 죽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말이다.
/조용신 공연칼럼니스트
현재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한 연극은 예술의 형태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살을 결심한 한 사람의 최후변론을 보여주고 있다. 마샤 노먼의 1983년작 '잘자요 엄마(Night,Mother)'다. 등장인물은 단 두 명,어머니와 딸이다.
낙천적인 성격의 어머니는 사별한 남편과 출가한 아들이 없는 집에서 오로지 외동딸에게 의지하면서 살고 있다. 인생의 낙이란 TV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웃고,좋아하는 빵을 먹고,딸에게 매니큐어 칠을 부탁하며 소소한 일상에 만족한다. 하지만 딸은 간질병이 있으며 결혼생활은 파탄났고 가출한 아들은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좀도둑이다.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고 느끼며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던 어느날 딸은 어머니에게 오늘밤 자살하겠다고 예고한다.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어머니는 점차 딸의 진심을 알고 말리다 나중에는 읍소까지 하지만 죽음에 대한 딸의 강한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 딸은 인생이란 푹푹 찌는 여름에 만원버스 안에서 힘겹게 버텨 50블록을 더 가서 내리는 것이니 지금 당장 내리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서 자살을 합리화한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모녀간의 소통되지 않는 감정 대립으로 인해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한다.
자살을 비겁한 현실도피로 보는가,아니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는 주체적인 행위로 보는가에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인류 역사에도 자살이 죄악시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자살은 남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을 남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한발짝 떨어진 무대에서 그 자살을 앞둔 사람의 심경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지? 눈물,콧물이 뒤범벅된 채 무대 인사를 하러 나오는 배우들을 보면서 실제로 죽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말이다.
/조용신 공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