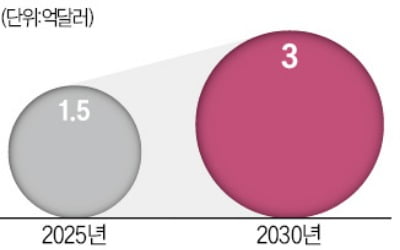[창간 44주년 뜨는조직 지는조직] 당신의 조직은 안녕하십니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1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와 함께 내한 공연을 가진 미국의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가 없다. 팀원들이 스스로 악보를 해석하며 악장과 수석도 직접 선정한다.
하지만 이 오케스트라는 2001년 그래미상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연주력을 발휘했다. 경영학계의 전설적 이야기꾼인 피터 드러커는 "미래 기업은 바로 이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악보를 읽고 해석하는 상상력과 음감의 조화를 이루는 상호 협력이야말로 기업 조직의 혁신적인 모델이라는 것.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A씨,그는 얼마 전에 경영 관련 조찬 모임을 마치고 나오면서 "성공 비결이라는 게 다 말장난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귀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 나왔지만 뭔가 허망하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귀를 크게 세워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비즈니스의 세계다.
기업 경쟁력은 조직의 힘에서 나온다. 개인은 조직의 편제(編制)를 통해 생각과 일을 나누고 결합한다. 물론 항구적으로 우수한 편제라는 것은 없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과거 대우와 요즘 리먼브러더스의 몰락을 설명할 길이 없다. 조직 간,기업 간 힘의 역전 현상을 풀이해낼 길이 없다. 삼성 LG 포스코 같은 글로벌 경쟁의 첨병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거의 매년 조직 개편을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어떤 조직이 지고 어떤 조직이 뜨는가. 이 흥망의 비밀코드가 해제되는 순간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경쟁력이 솟아난다. 우리는 컬러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 개발사례를 통해 개인의 소박한 아이디어가 조직의 지원과 협력을 기반으로 어떻게 성공을 거두는지를 포착할 수 있다.
일본 후지쓰의 연구원 시노다쓰타에씨가 컬러 PDP를 개발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은 1979년."TV를 벽에 걸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연구활동에 너무 몸을 혹사시킨 나머지 병원에 입원하는 불상사가 발생했고 연구 프로젝트는 중지됐다. 2년 뒤 다시 출근했지만 보직은 연구부서에서 생산지원부서로 바뀌었다. 그래도 시노다씨는 포기할 수 없었다. 회사 인근 술집에 수시로 사내 엔지니어들을 불러모았다. "벽걸이 TV를 만들어 세계를 놀라게 하자"고 호소했다. 그런 식으로 외주 업체에도 부탁했다. 회사 중역들 몰래 시제품이 만들어졌다. 각각 해직과 거래 중단을 각오한 행동이었다. 그 결실이 1992년 세계 최초로 개발된 PDP였다. 이듬해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 PDP를 객장에 내다걸었다. 시노다씨는 2006년 "기술 혁신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공로로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로부터 명예회원 자격을 받았다. 올해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이 누렸던 바로 그 명예다.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후지쓰의 개발 성공 스토리를 떠받치는 두 가지 축은 창의성과 실행 능력이다. 창의성은 천재의 고독한 영감이 아니다. 지식의 크기와 상상력의 넓이가 그 원천이다. 기업은 이 모든 능력을 편제에 담는다. 편제는 기업의 전략과 재능을 조직하는 틀이다. 실행 능력은 팀워크와 네트워크,관계에 달려 있다. 관계가 루틴(routine)에 빠진 족쇄여서는 안 된다. 오케스트라의 팀원들처럼,시노다씨를 도왔던 사람들처럼 움직여야 한다. 월가 파탄이라는 무시무시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지금,일하는 조직의 재건을 다시 제안해본다. 업무 성격과 프로세스의 변화,외부 환경이 빛의 속도로 휘몰아치고 있는 와중에 과연 당신의 조직은 어디에 서 있는가.
조일훈 기자(특별취재팀장) jih@hankyung.com
하지만 이 오케스트라는 2001년 그래미상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연주력을 발휘했다. 경영학계의 전설적 이야기꾼인 피터 드러커는 "미래 기업은 바로 이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악보를 읽고 해석하는 상상력과 음감의 조화를 이루는 상호 협력이야말로 기업 조직의 혁신적인 모델이라는 것.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A씨,그는 얼마 전에 경영 관련 조찬 모임을 마치고 나오면서 "성공 비결이라는 게 다 말장난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귀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 나왔지만 뭔가 허망하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귀를 크게 세워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비즈니스의 세계다.
기업 경쟁력은 조직의 힘에서 나온다. 개인은 조직의 편제(編制)를 통해 생각과 일을 나누고 결합한다. 물론 항구적으로 우수한 편제라는 것은 없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과거 대우와 요즘 리먼브러더스의 몰락을 설명할 길이 없다. 조직 간,기업 간 힘의 역전 현상을 풀이해낼 길이 없다. 삼성 LG 포스코 같은 글로벌 경쟁의 첨병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거의 매년 조직 개편을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어떤 조직이 지고 어떤 조직이 뜨는가. 이 흥망의 비밀코드가 해제되는 순간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경쟁력이 솟아난다. 우리는 컬러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 개발사례를 통해 개인의 소박한 아이디어가 조직의 지원과 협력을 기반으로 어떻게 성공을 거두는지를 포착할 수 있다.
일본 후지쓰의 연구원 시노다쓰타에씨가 컬러 PDP를 개발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은 1979년."TV를 벽에 걸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연구활동에 너무 몸을 혹사시킨 나머지 병원에 입원하는 불상사가 발생했고 연구 프로젝트는 중지됐다. 2년 뒤 다시 출근했지만 보직은 연구부서에서 생산지원부서로 바뀌었다. 그래도 시노다씨는 포기할 수 없었다. 회사 인근 술집에 수시로 사내 엔지니어들을 불러모았다. "벽걸이 TV를 만들어 세계를 놀라게 하자"고 호소했다. 그런 식으로 외주 업체에도 부탁했다. 회사 중역들 몰래 시제품이 만들어졌다. 각각 해직과 거래 중단을 각오한 행동이었다. 그 결실이 1992년 세계 최초로 개발된 PDP였다. 이듬해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 PDP를 객장에 내다걸었다. 시노다씨는 2006년 "기술 혁신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공로로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로부터 명예회원 자격을 받았다. 올해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이 누렸던 바로 그 명예다.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후지쓰의 개발 성공 스토리를 떠받치는 두 가지 축은 창의성과 실행 능력이다. 창의성은 천재의 고독한 영감이 아니다. 지식의 크기와 상상력의 넓이가 그 원천이다. 기업은 이 모든 능력을 편제에 담는다. 편제는 기업의 전략과 재능을 조직하는 틀이다. 실행 능력은 팀워크와 네트워크,관계에 달려 있다. 관계가 루틴(routine)에 빠진 족쇄여서는 안 된다. 오케스트라의 팀원들처럼,시노다씨를 도왔던 사람들처럼 움직여야 한다. 월가 파탄이라는 무시무시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지금,일하는 조직의 재건을 다시 제안해본다. 업무 성격과 프로세스의 변화,외부 환경이 빛의 속도로 휘몰아치고 있는 와중에 과연 당신의 조직은 어디에 서 있는가.
조일훈 기자(특별취재팀장)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