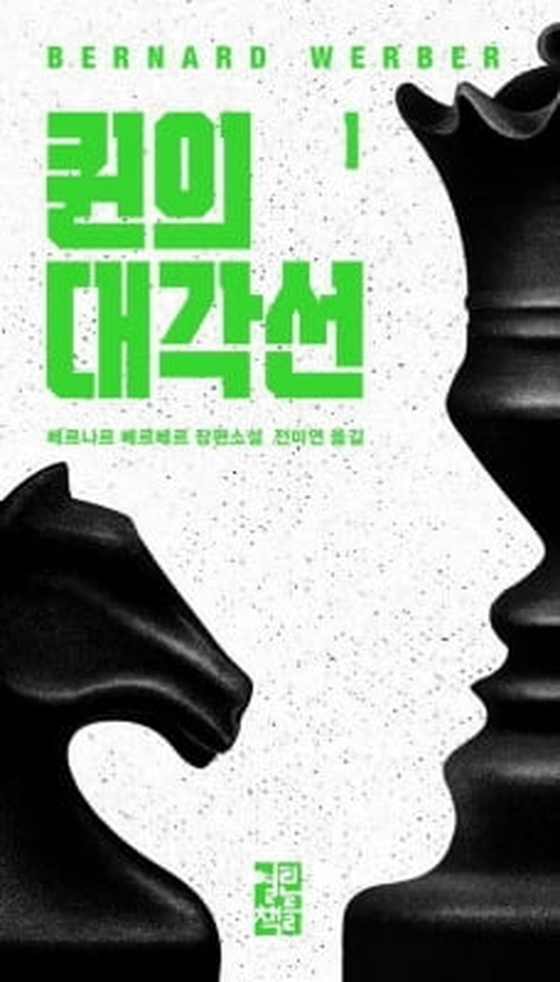총수 입김 강화… 재벌 지배구조 후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계열사의 높은 내부 지분율을 지렛대 삼아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지표상으로는 오히려 후퇴했다.
금융 계열사가 지배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회사 설립이나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영토를 넓히고 있다.
◇ 총수 입김 더 세졌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28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분 가운데 총수 일가가 직접 보유한 의결권 있는 지분은 지난 4월 1일 기준 8.04%로 1년 전보다 0.0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계열사와 임원 등의 내부 지분을 이용해 총수가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40.51%로 0.78%포인트 늘어났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가 보유 지분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의결권 승수는 7.05배에서 7.39배로 높아졌다.
보유 지분에 비해 그룹 경영에 대한 입김은 더 세진 것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 4월 퇴진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은 3.57%로 낮았지만 의결권 승수는 8.09배로 전체 그룹의 평균치를 웃돌았다.
다른 그룹의 총수 일가 지분은 최태원 SK 회장 2.19%, 현정은 현대 회장 4.75%,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6.65%, 김승연 한화 회장 5.11%였다.
이중 SK와 한화의 의결권 승수는 각각 17.05배, 12.26배로 높았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와 자사주 등을 포함한 전체 지분에서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삼성이 0.84%로 가장 낮았고 SK 1.17%, 현대 2.04%, 금호아시아나 2.21%, 한화 2.29%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 그룹 가운데 총수 일가의 지분이 없는 계열사는 537개로 전체의 66.1%나 차지했으며 계열사 지분율은 44.44%였다.
상위 10대 그룹의 총수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1989년 13.1%에서 올해 3.6%로 감소했지만 계열사 지분율은 32.6%에서 43.9%로 증가해 전체 내부 지분율은 45.7%에서 47.5%로 불어났다.
또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등 14개 그룹 계열사의 지분 구조는 A→B→C→A와 같은 환상형 순환출자로 이뤄져 있었다.
이를 통해 총수 일가가 쥐꼬리만 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다.
◇ 금융사 지배권유지 고리
금융회사는 재벌 지배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17개 그룹이 56개의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삼성(10개), 한화, 동부, 동양(이상 각 7개)이 많았다.
이중 12개 그룹의 24개 금융회사가 68개 계열사(금융 30개, 비금융 38개)에 액면가 기준으로 총 1조5천148억 원을 출자했으며 이들 계열사에 대한 금융사의 평균 지분율은 9.74%였다.
삼성의 경우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데서 보듯이 금융회사가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1년 동안 현대커머셜(현대차), 롯데손해보험(롯데), 스타리스(효성) 등 3개 금융회사가 증가했고 금호종합금융(금호), 엔세이퍼(두산) 등 2개가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후 HMC투자증권(현대차), GS자산운용(GS), 제일화재와 새누리저축은행(한화), 네오플럭스PEF(두산) 등 5개가 늘어나는 등 재벌들의 금융업 진출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재벌들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낮은 계열사의 기업공개는 꺼리고 있다.
28개 그룹의 계열사 812개 가운데 상장사는 158개로 19.5%에 그쳤다.
비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은 2.39%로 상장사 5.78%의 절반 수준이다.
경희대 권영준 교수는 "총수들이 소수 지분으로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는 현행 지배구조는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에 따른 것으로, 외부 충격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건실한 중견 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지배권이 지표상으로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열사에 대한 경영 위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의 지배권을 행사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kms1234@yna.co.krhojun@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중소기업계 "매년 20~30개 업체 폐업…최저임금 동결해야" [이미경의 인사이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71355.3.jpg)
![[포토] 중소기업계 "지급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 달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71535.3.jpg)

![[단독]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함께 품는다](https://timg.hankyung.com/t/560x0/data/service/edit_img/202406/4bd37d860d109c324069e5663a99d843.jpg)

![강달러에 주춤한 금값…"기관이 사면 30% 오를 것" 전망도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168235.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단독] 1%만 쓰는 폰…'영상통화 시대' 이끈 3G 막 내린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74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