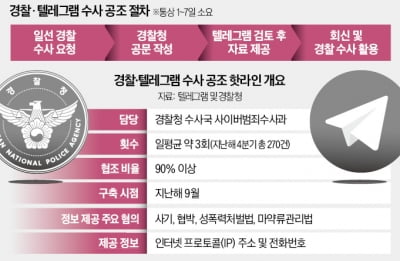[뉴스 인사이드] 주택보유세의 비밀 ‥ 한국 '가격' 기준부과…외국은 '면적' 기준도 병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2005년부터 가격(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주택을 '토지'와 '건물'로 나눈 뒤 토지는 공시지가로,건물은 건축비 개념을 적용한 원가로 각각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 건물이 낡을수록 재산세가 적었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적은 세금을 냈고,지방의 신축 중대형아파트는 가격이 낮아도 많은 재산세를 내야 했다.
외국의 경우 같은 지역이라도 주거 환경의 격차가 큰 곳은 가격을 기준으로,균일한 곳은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재산세 누진세율은 0.15%,0.3%,0.5% 등 3단계로 돼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1%,1.5%,2%,3%로 돼 있다. 누진율이 급격한 주택 보유세를 도입하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재산세 개편과 종부세 신설이 이뤄진 2005년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는 이어졌고 주택 가격은 2년 가까이 올랐다.
외국의 경우 같은 지역이라도 주거 환경의 격차가 큰 곳은 가격을 기준으로,균일한 곳은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재산세 누진세율은 0.15%,0.3%,0.5% 등 3단계로 돼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1%,1.5%,2%,3%로 돼 있다. 누진율이 급격한 주택 보유세를 도입하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재산세 개편과 종부세 신설이 이뤄진 2005년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는 이어졌고 주택 가격은 2년 가까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