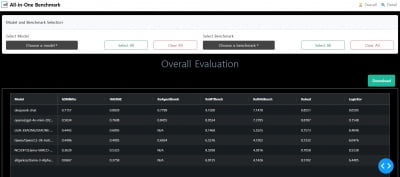[신년기획-외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2) 임재홍 원스인어블루문 사장‥이판에 재즈클럽?…"당신 미쳤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단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은 먼 나라 이야기다. 하지만 서울 청담동의 재즈클럽 '원스인어블루문(Once in a Blue Moon)'의 임재홍 사장(52)은 10년 전 이 상투적인 수사를 현실로 만든 사람이다.
임 사장은 대우건설에서 19년을 근무하며 청춘을 바쳤다.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이 흔들리면서 명예퇴직을 했다.
그가 아파트를 팔아 당시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재즈 클럽을 열겠다고 했을 때 주변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원 · 달러 환율이 달러당 2000원을 육박하던 시절,그 비싼 와인이며 수입 인테리어 소품을 들여오려면 평상시의 두 배는 줘야 하는데 장사가 안 되면 바로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왠지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재즈 클럽은 대학 시절 밴드에서 활동하면서부터 키워온 꿈이었다. 그는 결국 외환위기의 후폭풍으로 온 나라가 공포에 떨던 1998년 4월 원스인어블루문을 열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 타이밍이 저를 도왔죠.당시까지 호텔 직원이 호텔 밖에서 일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호텔들이 인력의 30%씩 구조조정을 하면서 하얏트와 힐튼 등의 일류 주방장과 지배인들을 영입할 수 있었죠.게다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유학파나 외국인들이 크게 늘면서 우리 클럽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 장소가 됐어요. 달러벌이를 한 셈이죠.그 때 인연을 맺었던 외국인들이 모국으로 돌아간 지금도 한국 출장길에 우리 클럽을 방문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
실제 그렇다. 원스인어블루문은 고급화전략을 구사했다. 재즈클럽 하면 떠오르는 칙칙하고 허름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였다. 이는 주효했다. 주한 외국 대사나 투자은행가 등이 단골로 찾는 서울의 '핫플레이스(hot place)'이자 '재즈 아이콘'로 부상했다.
'가문의 영광'같은 영화에 소개되고 나서는 일본인들이 국제전화로 예약을 하고 찾아와 사진촬영을 하고 돌아가는 한류 관광의 명소가 되기도 했다. 가수들의 쇼케이스나 기업체들의 신제품 설명회 장소로도 자주 쓰인다.
외환위기 이후 찾아온 사회의 변화는 임 사장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줬다. 파티와 와인이 대중화되고 재즈 애호가들의 층도 두터워졌다. 과거엔 돈 있는 사람들은 호텔 식당만을 찾았다. 이제는 호텔에서만 식사를 하면 '테이스트(taste)가 없는',즉 취향이 촌스러운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기도 했다.
물론 운만 따른 건 아니었다. 19년의 회사생활 동안 임 사장은 늘 "사업을 하면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상상을 해왔다. 원스인어블루문이라는 이름과 대략의 인테리어 컨셉트도 그 때부터 머리 속에 있었다.
특히 임 사장은 영업 12년,홍보 6년의 경험을 살려 당시 외식업체로선 드물게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3명의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해 외국인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입소문을 퍼뜨렸다. 개장 전에 여러 차례 와인 파티를 열기도 했다.
"대우건설 근무 당시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VIP 마케팅을 펼쳤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당시 여의도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 분양 당첨자들을 모아놓고 미술품이나 와인에 대한 강좌를 열곤 했었죠.그때부터 호텔 지배인 등 외식업계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이 선 지 3개월 만에 클럽을 열 수 있었죠.아마 제가 원래 음악을 하던 사람이었다면 클럽을 성공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경제위기 때문인지 요즘 임 사장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졌다.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는 미래가 불투명해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실수를 줄이려면 자신이 좋아하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사업,평소에 잘 아는 분야에 진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때 안동찜닭이 유행하면서 동네마다 찜닭집이 생겼다가 모두 사라진 것처럼 '요즘에 뭐가 잘된다더라'고 뛰어들면 십중팔구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 생긴 레스토랑의 70%가 1년 안에 문을 닫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나온 사람들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딱 한 장"이라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권했다.
사실 그도 요즘 걱정이 많다. 세계적 경기침체로 법인카드 사용이 감소하면서 손님 1인당 사용액이 크게 줄었다. 또 몇 년 전 와인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최근엔 일본 사케 바람이 불면서 손님들의 숫자도 조금씩 줄고 있다. 위기설이 한창이던 지난 10월에는 '언제 문을 닫아야 하나'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공포감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아직도 여전한 열정을 무기로 위기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1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글=유창재/사진=허문찬 기자 yoocool@hankyung.com
임 사장은 대우건설에서 19년을 근무하며 청춘을 바쳤다. 외환위기 이후 대우그룹이 흔들리면서 명예퇴직을 했다.
그가 아파트를 팔아 당시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재즈 클럽을 열겠다고 했을 때 주변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원 · 달러 환율이 달러당 2000원을 육박하던 시절,그 비싼 와인이며 수입 인테리어 소품을 들여오려면 평상시의 두 배는 줘야 하는데 장사가 안 되면 바로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왠지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재즈 클럽은 대학 시절 밴드에서 활동하면서부터 키워온 꿈이었다. 그는 결국 외환위기의 후폭풍으로 온 나라가 공포에 떨던 1998년 4월 원스인어블루문을 열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 타이밍이 저를 도왔죠.당시까지 호텔 직원이 호텔 밖에서 일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호텔들이 인력의 30%씩 구조조정을 하면서 하얏트와 힐튼 등의 일류 주방장과 지배인들을 영입할 수 있었죠.게다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유학파나 외국인들이 크게 늘면서 우리 클럽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 장소가 됐어요. 달러벌이를 한 셈이죠.그 때 인연을 맺었던 외국인들이 모국으로 돌아간 지금도 한국 출장길에 우리 클럽을 방문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
실제 그렇다. 원스인어블루문은 고급화전략을 구사했다. 재즈클럽 하면 떠오르는 칙칙하고 허름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였다. 이는 주효했다. 주한 외국 대사나 투자은행가 등이 단골로 찾는 서울의 '핫플레이스(hot place)'이자 '재즈 아이콘'로 부상했다.
'가문의 영광'같은 영화에 소개되고 나서는 일본인들이 국제전화로 예약을 하고 찾아와 사진촬영을 하고 돌아가는 한류 관광의 명소가 되기도 했다. 가수들의 쇼케이스나 기업체들의 신제품 설명회 장소로도 자주 쓰인다.
외환위기 이후 찾아온 사회의 변화는 임 사장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줬다. 파티와 와인이 대중화되고 재즈 애호가들의 층도 두터워졌다. 과거엔 돈 있는 사람들은 호텔 식당만을 찾았다. 이제는 호텔에서만 식사를 하면 '테이스트(taste)가 없는',즉 취향이 촌스러운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기도 했다.
물론 운만 따른 건 아니었다. 19년의 회사생활 동안 임 사장은 늘 "사업을 하면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상상을 해왔다. 원스인어블루문이라는 이름과 대략의 인테리어 컨셉트도 그 때부터 머리 속에 있었다.
특히 임 사장은 영업 12년,홍보 6년의 경험을 살려 당시 외식업체로선 드물게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3명의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해 외국인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입소문을 퍼뜨렸다. 개장 전에 여러 차례 와인 파티를 열기도 했다.
"대우건설 근무 당시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VIP 마케팅을 펼쳤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당시 여의도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 분양 당첨자들을 모아놓고 미술품이나 와인에 대한 강좌를 열곤 했었죠.그때부터 호텔 지배인 등 외식업계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이 선 지 3개월 만에 클럽을 열 수 있었죠.아마 제가 원래 음악을 하던 사람이었다면 클럽을 성공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경제위기 때문인지 요즘 임 사장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졌다.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는 미래가 불투명해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실수를 줄이려면 자신이 좋아하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사업,평소에 잘 아는 분야에 진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때 안동찜닭이 유행하면서 동네마다 찜닭집이 생겼다가 모두 사라진 것처럼 '요즘에 뭐가 잘된다더라'고 뛰어들면 십중팔구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 생긴 레스토랑의 70%가 1년 안에 문을 닫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나온 사람들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딱 한 장"이라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권했다.
사실 그도 요즘 걱정이 많다. 세계적 경기침체로 법인카드 사용이 감소하면서 손님 1인당 사용액이 크게 줄었다. 또 몇 년 전 와인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최근엔 일본 사케 바람이 불면서 손님들의 숫자도 조금씩 줄고 있다. 위기설이 한창이던 지난 10월에는 '언제 문을 닫아야 하나'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공포감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아직도 여전한 열정을 무기로 위기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1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글=유창재/사진=허문찬 기자 yoocool@hankyung.com
!['아이유 광고'에도 쓰였다…차세대 촬영 기술로 주목받는 '이것' [원종환의 中企줌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39030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