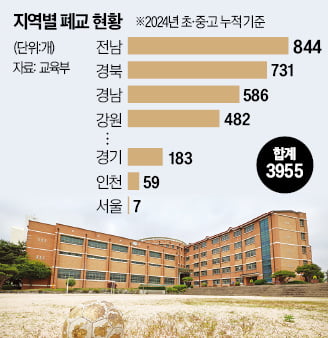[건강한 인생] 계단 내려가다 '뚝'…인공관절수술 후 최대 敵은 비만ㆍ골다공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7년 수술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3만6146명이 3만8220건의 수술을 받아 2776억여원(공단 및 환자부담)을 지출했다. 인공관절 치환술(사진)은 수술 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비만하거나 골다공증을 앓는 사람은 부주의할 경우 미세골절을 입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또 속히 호전되길 바라는 마음에 아쿠아로빅(수중체조)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를 하다가 무리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취하면 관절에 염증과 통증이 나타나기 쉽다.
우선 심한 골다공증 또는 중증 비만 환자는 갑자기 많이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상 행동에서 미세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박춘자씨(69 · 여)는 키 158㎝,몸무게 82㎏의 심한 비만으로 3개월 전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다. 덕분에 몇 년 전부터 나가지 못한 절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찰 계단을 내려오던 중 '뚝'하는 느낌이 들더니 무릎이 시큰거리고 땅을 디디면 아프기 시작했다.
다음 날엔 무릎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더 심해졌다. 병원을 찾으니 X선 사진 촬영 결과 이상이 없으나 염증이 보이고 관절막과 인대가 손상받았으니 주의하고 약을 복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1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돼 재차 병원을 방문했더니 X선 사진상 인공관절 주변 뼈가 미세골절돼 인공관절이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관절 수술 후 급작스런 염증과 통증은 혈액검사나 관절천자로만 알아보는 게 일상적 관례다. X선 사진을 찍어도 금속인 인공관절이 뼈와 겹쳐 보이기 때문에 초기에 뼈의 심한 변화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이상 소견을 판단하기 어렵다.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MRI)를 시행하지만 이마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발생한 미세골절을 간과했다가 심각한 경우 인공관절이 뼈속에 파묻혀 재치환술과 같은 대수술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김민영 신촌연세병원 인공관절센터 소장은 "무릎 인공관절은 피질골이라고 불리는 무릎뼈 외곽의 단단한 뼈를 잘라내고 이보다 약한 속뼈인 해면골 위에 덮어 씌워지게 된다"며 "비만이나 골다공증으로 수술 전에 이미 무릎뼈가 약해져 있던 사람은 수술 후 체중이 무릎의 약한 부위로 집중돼 미세한 골절이 나타나기 쉽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수술 후 6개월 이상 점진적이고 조심스럽게 근력운동이나 관절운동과 같은 재활치료를 한 다음 경사진 곳 오르기 등 무릎에 많은 하중이 미치는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인공관절 수술 후 관절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려면 아쿠아로빅과 실내자전거를 시행하라고 권한다. 그러나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과도하게 반복하면 무릎 전방 관절에 압력이 가해져 염증반응 및 관절통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수술 후 3개월 이내에는 인대나 힘줄,관절막 같은 속살이 아물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리한 동작을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1개월 이내에는 다리펴서 들기와 누르기,발목 운동,가볍게 앉았다 일어나기 등 체중부하가 미치지 않는 운동을 시행한다. 2~3개월 째에는 15분 정도 걷기운동을 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5~10분씩 천천히 늘린다. 한번에 1시간 이상 걷지 말고 중간에 15~30분 정도 쉬는게 좋다. 무릎을 펴고 하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괜찮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우선 심한 골다공증 또는 중증 비만 환자는 갑자기 많이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상 행동에서 미세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박춘자씨(69 · 여)는 키 158㎝,몸무게 82㎏의 심한 비만으로 3개월 전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다. 덕분에 몇 년 전부터 나가지 못한 절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찰 계단을 내려오던 중 '뚝'하는 느낌이 들더니 무릎이 시큰거리고 땅을 디디면 아프기 시작했다.
다음 날엔 무릎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더 심해졌다. 병원을 찾으니 X선 사진 촬영 결과 이상이 없으나 염증이 보이고 관절막과 인대가 손상받았으니 주의하고 약을 복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1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돼 재차 병원을 방문했더니 X선 사진상 인공관절 주변 뼈가 미세골절돼 인공관절이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관절 수술 후 급작스런 염증과 통증은 혈액검사나 관절천자로만 알아보는 게 일상적 관례다. X선 사진을 찍어도 금속인 인공관절이 뼈와 겹쳐 보이기 때문에 초기에 뼈의 심한 변화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이상 소견을 판단하기 어렵다.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MRI)를 시행하지만 이마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발생한 미세골절을 간과했다가 심각한 경우 인공관절이 뼈속에 파묻혀 재치환술과 같은 대수술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김민영 신촌연세병원 인공관절센터 소장은 "무릎 인공관절은 피질골이라고 불리는 무릎뼈 외곽의 단단한 뼈를 잘라내고 이보다 약한 속뼈인 해면골 위에 덮어 씌워지게 된다"며 "비만이나 골다공증으로 수술 전에 이미 무릎뼈가 약해져 있던 사람은 수술 후 체중이 무릎의 약한 부위로 집중돼 미세한 골절이 나타나기 쉽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수술 후 6개월 이상 점진적이고 조심스럽게 근력운동이나 관절운동과 같은 재활치료를 한 다음 경사진 곳 오르기 등 무릎에 많은 하중이 미치는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인공관절 수술 후 관절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려면 아쿠아로빅과 실내자전거를 시행하라고 권한다. 그러나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과도하게 반복하면 무릎 전방 관절에 압력이 가해져 염증반응 및 관절통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수술 후 3개월 이내에는 인대나 힘줄,관절막 같은 속살이 아물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리한 동작을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1개월 이내에는 다리펴서 들기와 누르기,발목 운동,가볍게 앉았다 일어나기 등 체중부하가 미치지 않는 운동을 시행한다. 2~3개월 째에는 15분 정도 걷기운동을 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5~10분씩 천천히 늘린다. 한번에 1시간 이상 걷지 말고 중간에 15~30분 정도 쉬는게 좋다. 무릎을 펴고 하는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괜찮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