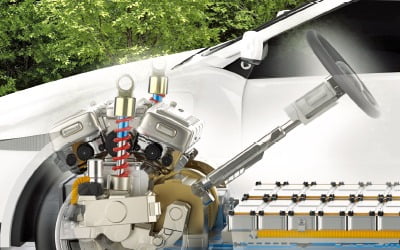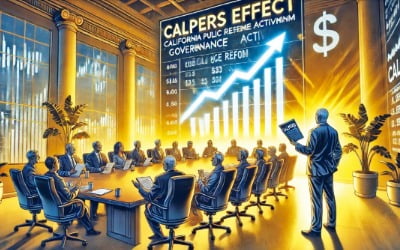[추창근 칼럼] 부패의 글로벌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논설실장 kunny@hankyung.com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갈일뿐
대외부패 불감증 심각한 문제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갈일뿐
대외부패 불감증 심각한 문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미국의 밸브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납품편의를 봐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서 한 간부가 긴급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를 통해 우리 쪽에 알려진 사건이다.
망신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사실 상거래에서 흔히 볼수 있는 부패(腐敗)의 전형이다. 뇌물과 특혜를 맞바꾸는 이런 행위는 특히 후진국에서 일반화된 현상이다. 국경을 넘어 자행되는 부패도 마찬가지로,우리 기업들이 해외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경우 적지 않은 '뒷돈'을 찔러주어야 하는 현실 또한 결코 비밀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린다 김 사건'에서 보듯,수십년 동안 로비스트들의 손에 의해 많은 국가 중대사업이 좌지우지되고,그 과정에서 뇌물과 리베이트,향응의 제공이 이뤄졌던 사실이 드러나 이런 저런 '게이트'로 비화됐던 일들은 새삼스럽지 않다. 2004년 미국 IBM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컴퓨터를 납품했던 일이 적발돼 말썽을 빚자,IBM 관계자가 했다는 "한국은 로비와 뇌물없이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나라"라는 말은 여전히 기억에 생생하다.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럼에도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비대해진 권한을 보유한 독점적 공기업에서 이런 형태의 '부패의 글로벌화'가 이미 만연하고 있을 개연성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공기업 비즈니스도 글로벌화된 시대다.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이고 훨씬 많은 검은 거래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형태의 비리가 아직 부패방지의 사각(死角)지대에 놓여 있고,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이 부패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담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돈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사익(私益)을 구매하는 뇌물수수 행위는,걸리지만 않는다면 돈을 주고 받는 사람 모두가 이득을 보는 최고의 투자게임이다. 아무리 부패척결을 외쳐도 시장경제가 살아있는 한 부패를 없애기는 어려운 이유다. 한수원 관계자가 미국 거래선으로부터 거리낌없이 돈을 챙긴 이번 일도 부패불감증에 다름아니다. 권한에 비해 내부 통제장치가 지나치게 허술했거나,내부자 제보가 없다면 여간해서 드러나지 않고 조사도 쉽지 않은 탓이었을 것이다.
부패가 만연하면 국민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다가는 오히려 손해만 보게 될 뿐,탈법이 이득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자신도 그런 행위를 합리화함으로써 부패가 부패를 낳는 결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나라 전체의 손해와 낭비,비효율성만 커지고 경쟁력은 잠식된다.
국제 상거래의 부패방지가 쟁점화되고,UN 등 국제기구도 부패국가에 대한 규제강화 등 반부패라운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반부패라운드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요주의 대상이 한국이라는 얘기까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줄곧 세계 4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주요 선진국(OECD)가운데 해외뇌물수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해외뇌물을 불법으로 규정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내용조차 우리 기업인들 90%가 모르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강대국의 흥망>을 쓴 폴 케네디는 "부패야말로 나라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했었다. 대외적인 부패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돈을 쥐어주어야 거래할 수 있다면 누가 그 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 나라 망신에 그치지 않고 외국의 자본 기술 시장을 한꺼번에 잃게 된다. 틈만 나면 부패척결을 말하지만 우리의 반부패 인식과 제도,감시 사정(司正)이 이 같은 부패의 글로벌화 속도를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다.
망신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사실 상거래에서 흔히 볼수 있는 부패(腐敗)의 전형이다. 뇌물과 특혜를 맞바꾸는 이런 행위는 특히 후진국에서 일반화된 현상이다. 국경을 넘어 자행되는 부패도 마찬가지로,우리 기업들이 해외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경우 적지 않은 '뒷돈'을 찔러주어야 하는 현실 또한 결코 비밀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린다 김 사건'에서 보듯,수십년 동안 로비스트들의 손에 의해 많은 국가 중대사업이 좌지우지되고,그 과정에서 뇌물과 리베이트,향응의 제공이 이뤄졌던 사실이 드러나 이런 저런 '게이트'로 비화됐던 일들은 새삼스럽지 않다. 2004년 미국 IBM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컴퓨터를 납품했던 일이 적발돼 말썽을 빚자,IBM 관계자가 했다는 "한국은 로비와 뇌물없이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나라"라는 말은 여전히 기억에 생생하다.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럼에도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비대해진 권한을 보유한 독점적 공기업에서 이런 형태의 '부패의 글로벌화'가 이미 만연하고 있을 개연성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공기업 비즈니스도 글로벌화된 시대다.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이고 훨씬 많은 검은 거래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형태의 비리가 아직 부패방지의 사각(死角)지대에 놓여 있고,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이 부패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담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돈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사익(私益)을 구매하는 뇌물수수 행위는,걸리지만 않는다면 돈을 주고 받는 사람 모두가 이득을 보는 최고의 투자게임이다. 아무리 부패척결을 외쳐도 시장경제가 살아있는 한 부패를 없애기는 어려운 이유다. 한수원 관계자가 미국 거래선으로부터 거리낌없이 돈을 챙긴 이번 일도 부패불감증에 다름아니다. 권한에 비해 내부 통제장치가 지나치게 허술했거나,내부자 제보가 없다면 여간해서 드러나지 않고 조사도 쉽지 않은 탓이었을 것이다.
부패가 만연하면 국민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다가는 오히려 손해만 보게 될 뿐,탈법이 이득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자신도 그런 행위를 합리화함으로써 부패가 부패를 낳는 결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나라 전체의 손해와 낭비,비효율성만 커지고 경쟁력은 잠식된다.
국제 상거래의 부패방지가 쟁점화되고,UN 등 국제기구도 부패국가에 대한 규제강화 등 반부패라운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반부패라운드를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요주의 대상이 한국이라는 얘기까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줄곧 세계 4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주요 선진국(OECD)가운데 해외뇌물수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해외뇌물을 불법으로 규정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내용조차 우리 기업인들 90%가 모르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강대국의 흥망>을 쓴 폴 케네디는 "부패야말로 나라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했었다. 대외적인 부패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돈을 쥐어주어야 거래할 수 있다면 누가 그 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 나라 망신에 그치지 않고 외국의 자본 기술 시장을 한꺼번에 잃게 된다. 틈만 나면 부패척결을 말하지만 우리의 반부패 인식과 제도,감시 사정(司正)이 이 같은 부패의 글로벌화 속도를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