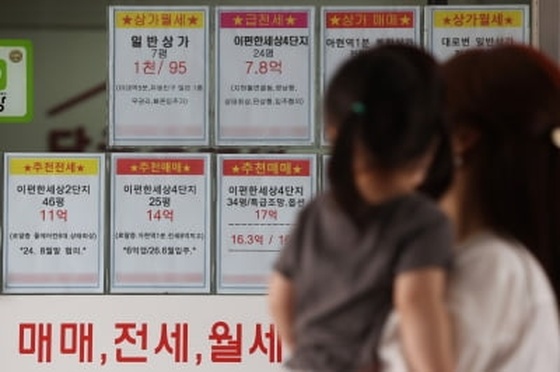`장자연리스트' 폐해심각…정보차단도 문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럼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떠도는 `소문'의 실상과 폐해를 여지없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남겼다.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터넷에는 근거없는 '장자연 리스트'가 난무해, 영문도 모른 채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속절없이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다.
대부분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수준을 넘지 못하는 인터넷상의 '장자연 리스트'는 지난달 14일 드라마 PD와 대기업 임원 광고주 등 유력인사들이 `장자연 문건'에 들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리스트에는 드라마 PD, 기업체 대표, 언론사 대표 등 10여 명의 실명이 사진과 함께 오르기까지 해 이른바 `사이버 루머'는 경쟁하듯 확대 재생산으로 치달았다.
근거 없는 루머였지만 '연예인 성상납'이라는 말초적 요소에다 `유력인사'라는 양념이 가미된 일인지라 리스트의 흡인력은 대단했다.
피크에 오른 지난달 17∼18일에는 포털 검색순위에서 이틀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주간 통합순위에서도 1위에 올랐다.
리스트의 엄청난 전파속도에 놀란 경찰은 급기야 명예훼손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사이버 수사에 착수했고, 보름만에 총 86건의 포털 게시글을 가려내 51건을 삭제했다.
또 실명을 거론한 리스트 7건에 대해서는 작성자를 찾아내 내사했다.
다소 엉뚱하지만 `장자연 리스트' 확산은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담론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올해 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 게시판 기능을 가진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본인확인제'를 의무화했지만 유튜브 등 일부 사이트들의 반발 속에 논란이 가라앉지 않던 상황에서였다.
`장자연 리스트'의 경우에서 드러났듯이 사이버 루머는 분명히 명예훼손 등 다양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제어장치는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정확한 정보의 원천이 철저히 봉쇄된 상황에서 `사실'에 목말라 하는 국민의 욕구를 외면하는 것 또한 온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에 나돌던 `장자연 리스트'가 100% 허황한 얘기는 아니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입증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분명 억울한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에 근접한 경우도 적지 않아, 정확한 정보가 차단된 소통의 공간에서는 `소문'도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음을 보여 줬다.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 대상자들의 신원을 철저히 숨겨, 결과적으로 루머의 확산을 부채질한 경찰도 `장자연 리스트'를 둘러싼 논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차라리 경찰이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 삼아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팩트'를 공개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더라면 `악성 루머'의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분기 말 차익 실현에 하락…나스닥 0.71%↓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78403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