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고즈넉한 자연 품에 살포시 '천상의 쉼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의 누와 정
허균 지음│다른세상│400쪽│2만8000원
허균 지음│다른세상│400쪽│2만8000원
전남 담양 후산마을에 있는 명옥헌은 배롱나무 숲 사이에 살포시 들어앉은 세 칸짜리 팔작지붕 정자다.
여름철에 배롱나무들이 일제히 붉은 꽃을 피우면 이곳은 '숲속의 선계'로 탈바꿈한다. 개화의 절정기가 지나면 자줏빛 꽃잎이 물 위에 떨어져 떠다니는데 이때 연못은 또 하나의 '천상 공간'으로 변한다.
허균 한국민예미술연구소장이 전국의 정자와 누각 500여곳을 답사한 뒤 50여개의 절경을 뽑아 《한국의 누와 정》을 펴냈다.
2002년 《한국의 정원》을 펴낸 그는 이번 책에서 고즈넉한 산수풍경 속에 안겨 있는 누각과 정자를 통해 옛 선비들의 마음결을 되살려낸다.
'누'와 '정'은 어떻게 다른가. 아름다운 풍광 속에 지어진 간소한 구조의 목조 건물을 '정(亭)'이라 하고 이층 구조로 된 것은 '누(樓)',온돌방이나 사랑채 기능이 더해지면 '당(堂)''각(閣)''헌(軒)'이라 한다. 이들 모두 자연경관 감상과 휴식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풍류를 즐기거나 공부를 하는 공간이다.
그는 경북 영덕 태백산 줄기의 옥계계곡에 자리 잡은 침수정(枕漱亭)을 "뜬구름 같은 명예를 버린 은자(隱者)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한다.
추사 김정희와 승려 종진이 정자 이름의 어원이 된 '침류수석(枕流漱石)'이라는 말을 '부와 명예를 거부하고 산수에 묻혀 사는 은자의 낙'으로 사용했다는 설명도 곁들인다.
강원 강릉의 활래정에서는 정갈한 사대부 명가의 분위기를 얘기한다.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채와 정자의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진 활래정은 손님들이 써 놓고 간 시액(詩額:시를 새겨 건 현판)과 정자 앞 못에서 풍겨 오는 연꽃 향기로 유명하다.
특히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체가 없고 띠살문으로 마감돼 있어 모든 문을 열면 사방의 풍광이 실내까지 밀려든다. 여름에 연꽃이 만발할 때는 향기가 온몸을 감싸안는 듯하다.
경북 안동의 체화정은 조선의 문신 이민적 · 이민정 형제가 함께 생활했던 곳.화가 김홍도가 쓴 '담락재(湛樂齋)'라는 편액(扁額) 글씨를 볼 수 있다.
저자의 멋스러운 설명과 함께 한국인의 정과 한을 사진으로 담아 온 사진작가 이갑철씨의 컬러 사진들이 풍성하게 곁들여져 책 읽는 운치를 더해준다.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
여름철에 배롱나무들이 일제히 붉은 꽃을 피우면 이곳은 '숲속의 선계'로 탈바꿈한다. 개화의 절정기가 지나면 자줏빛 꽃잎이 물 위에 떨어져 떠다니는데 이때 연못은 또 하나의 '천상 공간'으로 변한다.
허균 한국민예미술연구소장이 전국의 정자와 누각 500여곳을 답사한 뒤 50여개의 절경을 뽑아 《한국의 누와 정》을 펴냈다.
2002년 《한국의 정원》을 펴낸 그는 이번 책에서 고즈넉한 산수풍경 속에 안겨 있는 누각과 정자를 통해 옛 선비들의 마음결을 되살려낸다.
'누'와 '정'은 어떻게 다른가. 아름다운 풍광 속에 지어진 간소한 구조의 목조 건물을 '정(亭)'이라 하고 이층 구조로 된 것은 '누(樓)',온돌방이나 사랑채 기능이 더해지면 '당(堂)''각(閣)''헌(軒)'이라 한다. 이들 모두 자연경관 감상과 휴식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풍류를 즐기거나 공부를 하는 공간이다.
그는 경북 영덕 태백산 줄기의 옥계계곡에 자리 잡은 침수정(枕漱亭)을 "뜬구름 같은 명예를 버린 은자(隱者)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한다.
추사 김정희와 승려 종진이 정자 이름의 어원이 된 '침류수석(枕流漱石)'이라는 말을 '부와 명예를 거부하고 산수에 묻혀 사는 은자의 낙'으로 사용했다는 설명도 곁들인다.
강원 강릉의 활래정에서는 정갈한 사대부 명가의 분위기를 얘기한다.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채와 정자의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진 활래정은 손님들이 써 놓고 간 시액(詩額:시를 새겨 건 현판)과 정자 앞 못에서 풍겨 오는 연꽃 향기로 유명하다.
특히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체가 없고 띠살문으로 마감돼 있어 모든 문을 열면 사방의 풍광이 실내까지 밀려든다. 여름에 연꽃이 만발할 때는 향기가 온몸을 감싸안는 듯하다.
경북 안동의 체화정은 조선의 문신 이민적 · 이민정 형제가 함께 생활했던 곳.화가 김홍도가 쓴 '담락재(湛樂齋)'라는 편액(扁額) 글씨를 볼 수 있다.
저자의 멋스러운 설명과 함께 한국인의 정과 한을 사진으로 담아 온 사진작가 이갑철씨의 컬러 사진들이 풍성하게 곁들여져 책 읽는 운치를 더해준다.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
![점심 먹고 꼭 해야겠네…'이 운동'의 '놀라운 효과'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24823298.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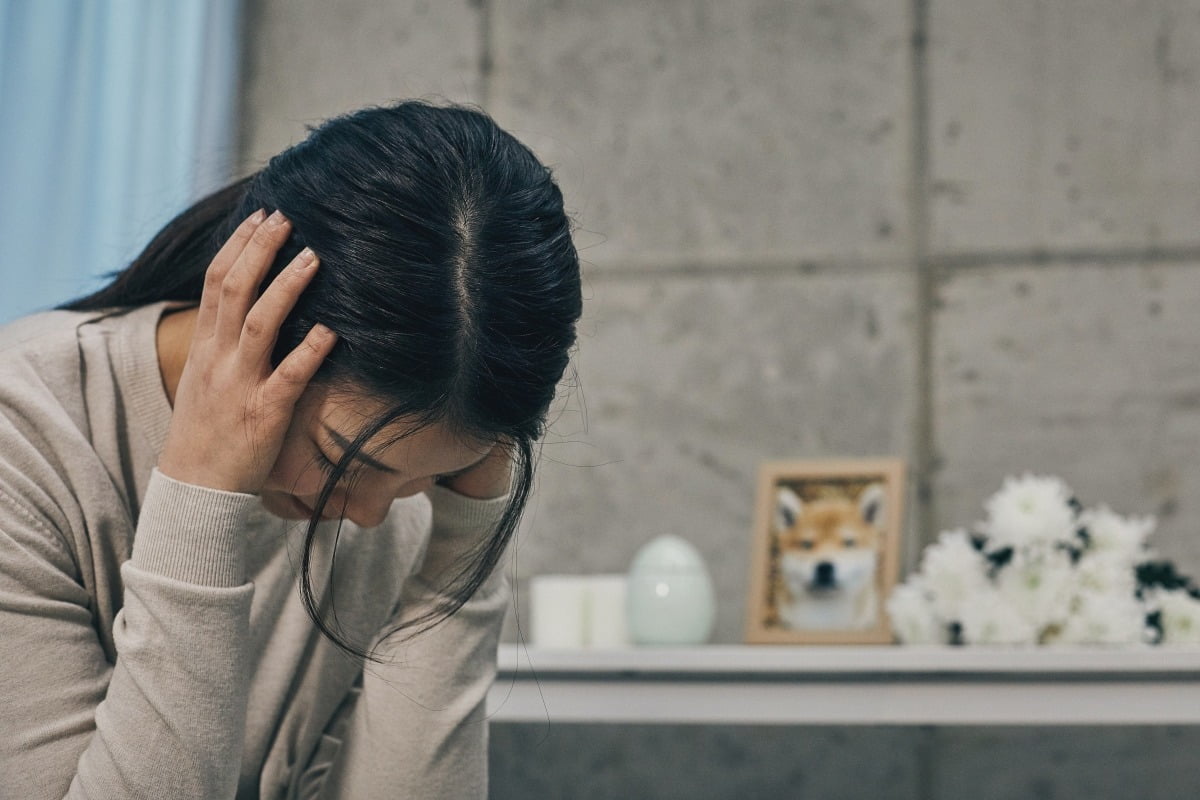
![설탕 든 탄산음료 하루 한 캔 마셨더니…끔찍한 결과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99.1212767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