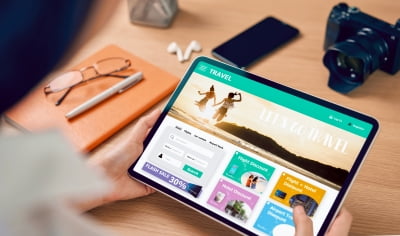베스트셀러에는 '선순환의 마술'이 숨어 있다. 일단 잘 팔리는 책 목록에 이름을 올리면 자동적으로 판매에 탄력이 붙는다.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는데다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라면 나도 빠질 수 없다는 군중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신경숙씨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창비)가 문학작품으론 오랜만에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나온 이후 불과 10개월 만에 세운 기록이다. 1990년 이후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공지영의 '봉순이 언니'(1998),김훈의 '칼의 노래'(2001) 등 3편이 밀리언셀러가 되는 데 4~10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척 빠른 속도다.
출판계에 밀리언셀러는 '하늘이 낸다'는 우스개가 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운이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는 '3T'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말이 통용된다. 제목(Title)에 흡인력이 있어야 하고,시대 흐름(Trend)을 타는 내용이어야 하며,출판 시점(Timing)도 사회 이슈와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엄마를 부탁해'가 단기간에 밀리언셀러가 된 것도 금융위기와 맞물려 출간되면서 '엄마'를 통해 위로받고 싶어하는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저자가 전국을 돌며 낭독회나 강연회,독자리뷰 행사를 꾸준히 열고 여러 서점들이 마케팅에 가세한 것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책값이 1만원이니까 저자는 10억원(인세 10%)의 세전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베스트셀러가 나오면 독자 저변 확대 등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문제도 있다. 출판시장이 스타 저자에 지나치게 의존해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서다. 베스트셀러에 오르지 못한 '좋은 책'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묻혀 버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판매부수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상위권만 집중 조명받는 방식을 개선하면 어떨까. 이를테면 베스트셀러와 함께'좋은책'목록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정환 논설위원 jhlee@hankyung.com


![[내일 날씨] 한파에 찬바람 쌩쌩…전국 아침 '최저 -15도'](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ZA.3943408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