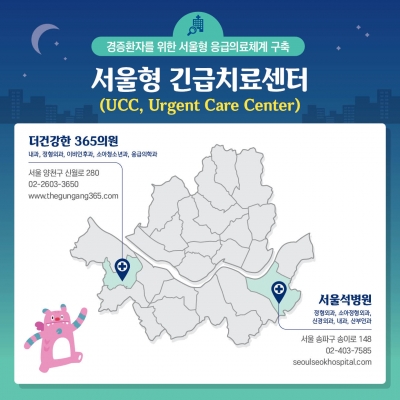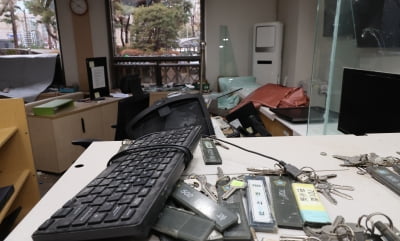6자회의가 성사된 것은 양대 현안의 내년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던 노동부가 집권 여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오늘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는 의제 운영방식 기간 등의 개괄적 사안을 결정하고 앞으로 대표자회의 및 실무자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노 · 사 · 정 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꽉 막힌 노동현안 문제 해결의 돌파구(突破口)를 모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타결책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나은 선택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부터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회의 참가 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닌데다 그동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만 달려온 점을 감안하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질질 시간만 끌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법 시행을 유예하는 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려운 것도 그런 이유다. 자칫 6자회담이 핑곗거리만 제공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997년 이미 법제화된 사안을 두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13년간이나 시행을 미뤄온 것은 누가 봐도 우스꽝스런 일이다. 특히 노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관행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 노동계가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모양새가 사납다. 이런 관행은 전임자 숫자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고 노동운동을 과격하게 만드는 부작용만 낳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더이상 억지를 부려선 안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새로 가동되는 노 · 사 · 정 6자회의는 노동 현안의 내년 시행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배려 등 보완책은 법을 시행하면서 마련해도 늦지 않은 만큼 큰 원칙에 대한 합의부터 서두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