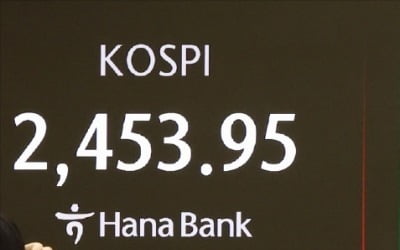[알프레드박의 마켓인사이트]세계 최고의 투자전문가가 말하는 '중용의 미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수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계 최고를 꼽는다는 것은 힘든 일일뿐더러 어찌 보면 의미 없는 일이겠지만 굳이 한 명을 꼽아야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세계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수장인 레이 달리오(Ray Dalio)를 꼽는다. 물론 세계 최고의 부자는 워렌 버핏(Warren Buffet)이고 현 금융위기 국면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이는 존 폴슨(John Paulson)이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탁월한 실적을 시종 일관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리오야말로 진정 최고의 ‘투자관리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포브스 매거진 세계최고부자 순위에서 버핏은 1위, 폴슨은 76위, 달리오는 261위에 올라있다.)
내가 달리오를 롤모델로 삼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성공해서가 아니다. 타인에 대비한 달리오의 차별성은 그의 가장 기초적인 ‘시각’과 ‘마음가짐’에서 온다.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통섭적 사고, 돈이나 실적을 좆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장인정신, 나날이 증가하는 시장의 복잡성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 결과 “지지 않기 위해” 공부한다는 겸손함, 이미 2007년 초부터 조만간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면서 자발적으로 고객 자금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 고객에겐 수수료가 훨씬 낮은 안정적 운용전략을 제안했던 데서 볼 수 있는 ‘청지기적 정신’ 등은 분명 누구에게서나 흔히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성질의 요소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언급한 요소들은 달리오(그리고 그의 회사,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특별하게 만드는 ‘특질’, 즉 ‘DNA’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나 회사가 주장하는 것에는 분명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달리오의 사고관, 그리고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예측이 절대적일 수는 없으나 우리는 이에 귀 기울어야 한다. 주식을 사든 팔든,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금을 사든 은을 사든, 달러를 사든 팔든, 집을 사든 전세를 구하든 간에, 제한된 시간과 자원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논리 전개에 따라 상반된 내용의 소수의 대표적인 의견을 추려내고, 그들 각각의 본질(핵심)을 서로 대조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오는 현 상황을 D-process(과정)라고 명명하여 설명한다. Process라는 단어가 암시하듯이 상처가 나면 (설사 치료를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스스로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치유 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D는 deflation*(디플레이션)이 아닌 debt(빚)와 depression*(불황)의 D에 기원한다. (*한글로 번역하면 모두 ‘침체’ 또는 ‘불황’ 정도로 정의되고 있는 recession, deflation, 그리고 depression의 정확한 정의와 차이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현상, 그리고 그 이후의 사후 현상(예컨대 대부분의 선진국 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진 것)등은 예전에는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이다. 결국 현 경제 상황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신종(?) 경제 흐름의 한 조각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신용거래 확대와 부채 급증에서부터 발생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물론 신용거래 확대와 부채 급증의 뿌리는 사회전체적인 잉여수요이다). 현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건으로 달리오는 30년대 경제대공황, 80년대 남미경제 붕괴, 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예로 든다.
D-process가 장기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 과정이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쉽사리 끝나지 않는 자기강화적(self-reinforcing)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집 문서를 날려야 비로서 도박을 끊을 수 있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신용 규모가 늘어날수록 소득에 대비한 채무상환 비용(debt-service cost)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이는 자연스레 더 많은 신용 창출로 연결된다. 조건적이긴 하나, 대체로 신용 확대는 유동성 증가라는 매개를 통해 실물과 금융자산 가격과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채무상환 비용 증가에 대한 헷지 수요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연결된다. 이 과정은 장기강화적인 모습을 보이며 더 이상 갈 수 없는 과잉 상태(또는 시점)까지 진행된다.
채무상환에 필요한 현금흐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더 이상의 신용이 제공되지 않을 때 중간 시점의 역 과정은 시작된다. 그 시작은 (채무상환 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강제적 자산 매도와 그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에 의해 촉발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며 진행된다. 이에 비추어보면 2008년의 금융위기는 한계점에 도달한 결과의 최종 현상이 아니라 역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된 중간 시점의 현상일 뿐이다. 진정한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유일하게 구조조정(restructuring)외에는 다른 해결 방안이 없게 된다.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한다. 일상적으로 표현하자면 구조조정은 고통을 감내하며 유지 가능한 체중까지 살을 빼는 것과 같다.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해결 방안으로 선택한 신규 유동성 창출/공급은 달리오가 언급한 D-과정의 ‘현재진행형’ 단면으로서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결국에는 다가올 궁극의 구조조정 요인을 더 크게 키우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더 나아가 항상 금융권에만 국한되어 온 구조조정이 진정한 구조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체와 가계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달리오의 주장이다. 아직 이러한 범 세계적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금융사태 이후,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만 약 1.5조 달러 정도의 돈이 풀렸다. 당시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0%를 넘는 금액이다. 그런데 시중에 풀린 현금(M1, 은행적립현금+민간보유현금+요구불예금+보증수표)은 700~8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11월 중순 기준으로 미국의 금융기관에 쌓여있는 잉여지불준비금이 1조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은 향후 시중에 풀릴 수 있는 잠재 유동성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년 3월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의 정점이 언제 올지 단언할 수 없는 단적인 이유이다.
역설적으로 이 엄청난 돈이 풀리기 시작할 때 비로서 금융시장(주식과 채권 등의 paper asset)은 정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동성과 금융시장 규모가 더 커진 만큼 변동 폭과 충격도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일시적 조정이 장기 하락 추세의 시작인 것처럼 착각될 정도로 깊을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내년 1분기를 전후하여 한번의 조정이 올 수 있으며 큰 그림에서의 금융시장의 대(大)정점은 2013년~2014년을 전후하여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향후 수년간의 시장을 묘사하라면 ‘변동(volatility)’, ‘일탈(noise, outlier)’, ‘가짜 징후(false signal)’등의 단어가 대표적인 수식어가 될 것이다. 이기고 있다고 안심하는 순간 한번에 다 잃을 수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자마자 희망의 빛이 비칠 수도 있는 식의 변덕스러운 상황이 예상될 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중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유동성 증가에 따라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버블이 형성될 것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측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마찬가지의 이유(시장 규모 확대)에서 그 정도와 시기를 전망하는 것은 한층 더 어려워졌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설사 정점에서 팔지 않더라도) 최소 (요구)이익과 (최대)손실 범위를 미리 정하고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자산은 (가장 기초적으로는) 경제성장과 물가의 함수로 표기될 수 있음으로 큰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햇볕이 쨍쨍 쬐든 비가 오든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시장에서의 중용을 유지한다 해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자신들의 전략을 all-weather(사시사철 전략)라 일컫는다.
개인투자가뿐 아니라 기관투자가들을 보아도 국내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쏠림현상이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채권전문가는 채권만 보고, 국내주식전문가는 국내주식만 보고, 해외주식전문가는 해외주식만 보고, 부동산전문가는 부동산만 보는 시장분리(market segmentation) 현상에 기인한다. 이는 국내시장이 선진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점이다. 사실상 진정한 전문가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그리고 각 자산클래스간의 인과관계를 궤뚫어보고 있는 사람이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물론이고,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 등은 별개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한 개인의 포트폴리오에는 그의 시장관이 담겨져 있다.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견, 또는 전망을 명확하게 반영하는것(‘explicit’)과 시장 분위기나 단기모멘텀에 휩쓸려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시장방향성이 함축되어 있는 것(‘implicit’)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성장과 물가, 그리고 기업간의 경쟁구도를 분해하여 분석하고 전망함으로써 우리는 주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으로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부동산을 통한 최적화를 제시하는 이유는 (전망의 맞고 그름을 떠나) 우리가 절대로 전망할 수 없는 부분, 즉 외생변수((예를 들면 2년 후의 정부정책)가 많기 때문이다.
큰 그림에 맞추어 투자를 설계했다면 작은 그림에 대해서는 중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치와 일치한다. 우로든 좌로든 치우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즉 중용을 유지하라는 말은 모든 현인들의 공통된 가르침이었으며 성공한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향후 5년을 바라볼 때 투자전략에서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수 많은 현인들과 달리오의 지혜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
<알프레드 박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리서치센터장>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본 정보는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 정보에 의해 행해진 거래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가 달리오를 롤모델로 삼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성공해서가 아니다. 타인에 대비한 달리오의 차별성은 그의 가장 기초적인 ‘시각’과 ‘마음가짐’에서 온다.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통섭적 사고, 돈이나 실적을 좆는 것이 아니라 ‘탁월함’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장인정신, 나날이 증가하는 시장의 복잡성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 결과 “지지 않기 위해” 공부한다는 겸손함, 이미 2007년 초부터 조만간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면서 자발적으로 고객 자금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 고객에겐 수수료가 훨씬 낮은 안정적 운용전략을 제안했던 데서 볼 수 있는 ‘청지기적 정신’ 등은 분명 누구에게서나 흔히 찾을 수 있는, 일반적인 성질의 요소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언급한 요소들은 달리오(그리고 그의 회사,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특별하게 만드는 ‘특질’, 즉 ‘DNA’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나 회사가 주장하는 것에는 분명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달리오의 사고관, 그리고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예측이 절대적일 수는 없으나 우리는 이에 귀 기울어야 한다. 주식을 사든 팔든,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금을 사든 은을 사든, 달러를 사든 팔든, 집을 사든 전세를 구하든 간에, 제한된 시간과 자원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논리 전개에 따라 상반된 내용의 소수의 대표적인 의견을 추려내고, 그들 각각의 본질(핵심)을 서로 대조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오는 현 상황을 D-process(과정)라고 명명하여 설명한다. Process라는 단어가 암시하듯이 상처가 나면 (설사 치료를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스스로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치유 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D는 deflation*(디플레이션)이 아닌 debt(빚)와 depression*(불황)의 D에 기원한다. (*한글로 번역하면 모두 ‘침체’ 또는 ‘불황’ 정도로 정의되고 있는 recession, deflation, 그리고 depression의 정확한 정의와 차이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현상, 그리고 그 이후의 사후 현상(예컨대 대부분의 선진국 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으로 떨어진 것)등은 예전에는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이다. 결국 현 경제 상황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신종(?) 경제 흐름의 한 조각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신용거래 확대와 부채 급증에서부터 발생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물론 신용거래 확대와 부채 급증의 뿌리는 사회전체적인 잉여수요이다). 현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건으로 달리오는 30년대 경제대공황, 80년대 남미경제 붕괴, 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예로 든다.
D-process가 장기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 과정이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쉽사리 끝나지 않는 자기강화적(self-reinforcing)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집 문서를 날려야 비로서 도박을 끊을 수 있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신용 규모가 늘어날수록 소득에 대비한 채무상환 비용(debt-service cost)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이는 자연스레 더 많은 신용 창출로 연결된다. 조건적이긴 하나, 대체로 신용 확대는 유동성 증가라는 매개를 통해 실물과 금융자산 가격과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채무상환 비용 증가에 대한 헷지 수요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연결된다. 이 과정은 장기강화적인 모습을 보이며 더 이상 갈 수 없는 과잉 상태(또는 시점)까지 진행된다.
채무상환에 필요한 현금흐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더 이상의 신용이 제공되지 않을 때 중간 시점의 역 과정은 시작된다. 그 시작은 (채무상환 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강제적 자산 매도와 그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에 의해 촉발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며 진행된다. 이에 비추어보면 2008년의 금융위기는 한계점에 도달한 결과의 최종 현상이 아니라 역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된 중간 시점의 현상일 뿐이다. 진정한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유일하게 구조조정(restructuring)외에는 다른 해결 방안이 없게 된다.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한다. 일상적으로 표현하자면 구조조정은 고통을 감내하며 유지 가능한 체중까지 살을 빼는 것과 같다.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해결 방안으로 선택한 신규 유동성 창출/공급은 달리오가 언급한 D-과정의 ‘현재진행형’ 단면으로서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결국에는 다가올 궁극의 구조조정 요인을 더 크게 키우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더 나아가 항상 금융권에만 국한되어 온 구조조정이 진정한 구조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체와 가계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달리오의 주장이다. 아직 이러한 범 세계적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금융사태 이후,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만 약 1.5조 달러 정도의 돈이 풀렸다. 당시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0%를 넘는 금액이다. 그런데 시중에 풀린 현금(M1, 은행적립현금+민간보유현금+요구불예금+보증수표)은 700~8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11월 중순 기준으로 미국의 금융기관에 쌓여있는 잉여지불준비금이 1조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은 향후 시중에 풀릴 수 있는 잠재 유동성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년 3월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의 정점이 언제 올지 단언할 수 없는 단적인 이유이다.
역설적으로 이 엄청난 돈이 풀리기 시작할 때 비로서 금융시장(주식과 채권 등의 paper asset)은 정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동성과 금융시장 규모가 더 커진 만큼 변동 폭과 충격도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일시적 조정이 장기 하락 추세의 시작인 것처럼 착각될 정도로 깊을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내년 1분기를 전후하여 한번의 조정이 올 수 있으며 큰 그림에서의 금융시장의 대(大)정점은 2013년~2014년을 전후하여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향후 수년간의 시장을 묘사하라면 ‘변동(volatility)’, ‘일탈(noise, outlier)’, ‘가짜 징후(false signal)’등의 단어가 대표적인 수식어가 될 것이다. 이기고 있다고 안심하는 순간 한번에 다 잃을 수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자마자 희망의 빛이 비칠 수도 있는 식의 변덕스러운 상황이 예상될 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중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유동성 증가에 따라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버블이 형성될 것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측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마찬가지의 이유(시장 규모 확대)에서 그 정도와 시기를 전망하는 것은 한층 더 어려워졌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설사 정점에서 팔지 않더라도) 최소 (요구)이익과 (최대)손실 범위를 미리 정하고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자산은 (가장 기초적으로는) 경제성장과 물가의 함수로 표기될 수 있음으로 큰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햇볕이 쨍쨍 쬐든 비가 오든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시장에서의 중용을 유지한다 해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자신들의 전략을 all-weather(사시사철 전략)라 일컫는다.
개인투자가뿐 아니라 기관투자가들을 보아도 국내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쏠림현상이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채권전문가는 채권만 보고, 국내주식전문가는 국내주식만 보고, 해외주식전문가는 해외주식만 보고, 부동산전문가는 부동산만 보는 시장분리(market segmentation) 현상에 기인한다. 이는 국내시장이 선진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점이다. 사실상 진정한 전문가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그리고 각 자산클래스간의 인과관계를 궤뚫어보고 있는 사람이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물론이고,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 등은 별개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한 개인의 포트폴리오에는 그의 시장관이 담겨져 있다.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견, 또는 전망을 명확하게 반영하는것(‘explicit’)과 시장 분위기나 단기모멘텀에 휩쓸려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시장방향성이 함축되어 있는 것(‘implicit’)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성장과 물가, 그리고 기업간의 경쟁구도를 분해하여 분석하고 전망함으로써 우리는 주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으로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부동산을 통한 최적화를 제시하는 이유는 (전망의 맞고 그름을 떠나) 우리가 절대로 전망할 수 없는 부분, 즉 외생변수((예를 들면 2년 후의 정부정책)가 많기 때문이다.
큰 그림에 맞추어 투자를 설계했다면 작은 그림에 대해서는 중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치와 일치한다. 우로든 좌로든 치우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즉 중용을 유지하라는 말은 모든 현인들의 공통된 가르침이었으며 성공한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향후 5년을 바라볼 때 투자전략에서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수 많은 현인들과 달리오의 지혜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
<알프레드 박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리서치센터장>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본 정보는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된 정보에 의해 행해진 거래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