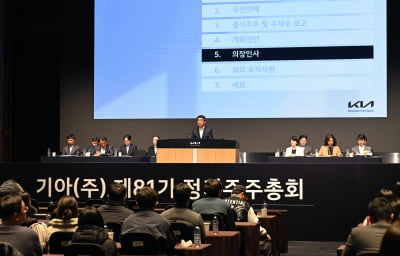['新유럽' 탄생] (3) 중동·아프리카까지 '유로 영토' 확장…달러와 기축통화 다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유로화 시대 열리나
체코·요르단·세네갈도 영향권…5억명이 사용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 보유액 크게 늘려
체코·요르단·세네갈도 영향권…5억명이 사용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 보유액 크게 늘려
◆유로화 사용국가 급속히 늘어날 듯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엔 몰타처럼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EU 국가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통합에 이어 유럽의 정치통합을 완성시킬 리스본조약 발효로 EU가 단순한 지역공동체를 넘어 미합중국에 필적하는 '유럽합중국'으로 격상된다는 점에서 EU 가입국의 유로화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로화 사용 국가는 EU 27개 회원국 중 16개국이지만 1999년 유로화 탄생 당시 11개국에 비해선 크게 늘었다. 2001년 그리스를 시작으로 슬로베니아(2007년), 사이프러스 · 몰타(2008년), 슬로바키아(2009년) 등이 차례로 유로존에 합류하면서 총 3억3000여명이 사용하는 통화로 세력을 불렸다.
리스본조약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이 EU 기관의 하나로 포함돼 권한이 강화된다는 점에서도 유로존은 팽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ECB는 지금까지 유로존만 관할해 왔지만 앞으로는 유로화 미가입국을 포함한 EU 전 지역을 아우르게 된다. 모든 EU 회원국이 유로화를 사용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 EU집행위와 유로존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유로그룹도 과도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국가에 직접 경고를 보낼 수 있게 되는 등 입김이 세진다.
EU 회원국 가운데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이 현재 유로화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기 이후 유로화의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유로화 사용에 회의적이던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도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헝가리 라트비아 루마니아 등 유로화를 쓰지 않는 동유럽 EU 가입국의 통화가치가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평균 27% 이상 폭락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엔 부유한 북유럽 국가 덴마크에서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유로존 가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54%(11월 설문조사)로 반대(41%)를 앞질렀다. 또 EU 신규가입국은 유로화를 필수로 도입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되면서 '유로존 영토'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몸값 치솟는 유로화…달러 위상은 추락
리스본조약 발효로 유로존이 덩치를 키우고 유로화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유로화가 기축통화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미 유로화는 세계 화폐전쟁의 최전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외환시장 거래통화 비중(전체 200% 기준)을 살펴보면 유로화는 2007년 엔화(17%)를 제치고 37% 점유율로 달러화(86%)에 이어 '2인자'로 입지를 굳혔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별 보유자산을 살펴봐도 1999년 출범 당시 17.9%에 그쳤던 유로화 비중은 올 1분기 27.5%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같은 기간 달러화는 71.0%에서 62.8%로 위상이 쪼그라들었다.
유로화의 몸값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1999년 유로당 1.2달러로 시작,하락을 거듭하던 유로화 가치는 2002년 0.8달러로 바닥을 찍은 뒤 고공행진을 거듭해 현재 1.5달러 선으로 약 80%(저점 대비) 급등했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기가 터진 뒤 경제난과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 정부가 국채를 대거 발행하면서 달러화 약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위상이 약해지고, 리스본조약 발효로 유럽합중국이 출범하면서 달러와 유로를 양대 축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금융 질서가 탄생할 것이란 시나리오에 점점 더 고개를 돌리고 있다. 유로화 출범 초기만 해도 이 같은 주장은 일부 학자의 소수 의견이었을 뿐 달러 위상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중국 위안화도 세계 주요 통화로 부상하기 까지는 20~30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유로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는 또 있다.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14개국은 프랑스가 유로화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자연스럽게 유로존에 편입됐다. 이들 국가는 프랑스 통화였던 프랑과 연동된 고정환율제를 사용해왔다.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등 유럽의 소규모 국가들도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쓰고 있으며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튀니지 등은 유로화를 기준으로 자국 통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밖에 러시아 모로코 요르단 등 유로화에 연동돼 통화바스켓을 운영 중인 나라까지 포함하면 유로화는 5억여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통화로 군림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유로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입지를 굳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회의론자들은 50여년간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해온 글로벌시장의 관성과 EU지역에서조차 무역거래의 33%가 달러화로 결제된다는 범용성 등을 이유로 든다. 리처드 쿠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달러가 이미 세계적으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급부상하더라도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적어도 20년 내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
한경·삼성경제연구소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