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새뮤얼슨 타계] 현대경제학 흐름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970년대 이후 '작은 정부' 新고전파 득세…금융위기 계기로 케인스학파 다시 관심
근대경제학은 고전학파인 애덤 스미스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의 1776년 저서 '국부론'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은 자유방임 시장경제의 상징이 됐다.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중상주의를 반박했던 스미스는 시장을 내세워 지지를 받았다. 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자들은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 자연스러운 가격체계를 형성하고 완전 고용을 창출한다는 고전학파를 이뤘다.
그러나 1929년 10월 말 뉴욕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불어닥친 대공황은 이 같은 시장중심의 고전학파 체제에 의구심을 낳게 했다. 현대경제학도 이무렵에 탄생했다. 영국의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저서 '일반이론' 등을 통해 고전학파의 한계점을 지적하고,정부 간섭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완전한 고용 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더라도 투 · 융자 정책을 감행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었다.
반대편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반대한 오스트리아 학파 등이 있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케인스에 밀려 역사에서 퇴장하는 듯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설명하기 힘든 경제 현상이 나타났다. 경기 침체인데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규제하면 불경기가 심화되고,부양책을 쓰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그룹은 자유주의 경제학의 철학을 계승한 통화주의 학파였다.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카를 브루너 ,앨런 멜처,애나 슈워츠 등은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을 내세웠다. 그들은 재정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나 조세 정책에 비중을 두고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케인스주의자들과 의견을 달리 한다. 대신 화폐의 유통속도가 안정적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통화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 기대이론'도 1970년대 이후 득세하기 시작한다. 이 이론은 경제주체들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해 행동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모델이나 공식들은 이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맞지 않다는 것.즉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효과가 약하다는 것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제자인 로버트 루커스 시카고대 교수에 의해 집대성돼 시카고학파를 이루게 된다. 시카고학파 이론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미국 경제정책의 근간이 됐다. 이 이론을 기반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였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의 개막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불거진 금융위기는 시카고학파의 기를 한풀 꺾이게 만들었다.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을 무한정 만들어냈던 월가는 비판의 대상이 됐고,이제 세계 각국은 저마다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 신케인스주의자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현대경제학은 정부와 시장 기능의 효율성을 놓고 계속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현대경제학자들을 고전학파나 케인스학파 한쪽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다. 두 학파의 이론 중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타계한 폴 새무얼슨 교수도 두 이론을 접목시켰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그러나 1929년 10월 말 뉴욕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불어닥친 대공황은 이 같은 시장중심의 고전학파 체제에 의구심을 낳게 했다. 현대경제학도 이무렵에 탄생했다. 영국의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저서 '일반이론' 등을 통해 고전학파의 한계점을 지적하고,정부 간섭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완전한 고용 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더라도 투 · 융자 정책을 감행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었다.
반대편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반대한 오스트리아 학파 등이 있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케인스에 밀려 역사에서 퇴장하는 듯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설명하기 힘든 경제 현상이 나타났다. 경기 침체인데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규제하면 불경기가 심화되고,부양책을 쓰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그룹은 자유주의 경제학의 철학을 계승한 통화주의 학파였다.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카를 브루너 ,앨런 멜처,애나 슈워츠 등은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을 내세웠다. 그들은 재정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나 조세 정책에 비중을 두고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케인스주의자들과 의견을 달리 한다. 대신 화폐의 유통속도가 안정적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통화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 기대이론'도 1970년대 이후 득세하기 시작한다. 이 이론은 경제주체들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해 행동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모델이나 공식들은 이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맞지 않다는 것.즉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효과가 약하다는 것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제자인 로버트 루커스 시카고대 교수에 의해 집대성돼 시카고학파를 이루게 된다. 시카고학파 이론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미국 경제정책의 근간이 됐다. 이 이론을 기반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였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의 개막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불거진 금융위기는 시카고학파의 기를 한풀 꺾이게 만들었다.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을 무한정 만들어냈던 월가는 비판의 대상이 됐고,이제 세계 각국은 저마다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 신케인스주의자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처럼 현대경제학은 정부와 시장 기능의 효율성을 놓고 계속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현대경제학자들을 고전학파나 케인스학파 한쪽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다. 두 학파의 이론 중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타계한 폴 새무얼슨 교수도 두 이론을 접목시켰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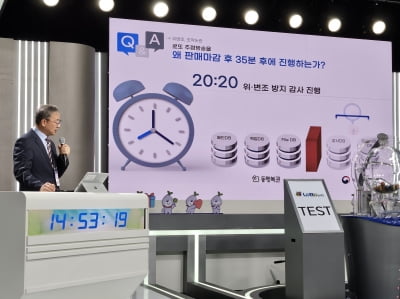
!["로또 조작 못하겠네"…추첨기 어떻게 관리하나 봤더니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3291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