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B 해외로 간다] (4) 美·英·베트남 교포기업 국내 줄상장 예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 해외기업 국내상장 유치
외국기업 44곳 입성 준비중…해외증시 IPO 업무도 공략
외국기업 44곳 입성 준비중…해외증시 IPO 업무도 공략
증권사들의 해외IB(투자은행)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해외기업의 국내 상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8월 중국 기업인 3노드디지탈을 시작으로 해외업체 10개사를 국내 증시에 입성시키며 쌓았던 노하우와 자신감을 발판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홍콩 아시아 지역으로 기업공개(IPO) 비즈니스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타깃은 미국 영국 베트남 등에 산재해 있는 교포기업들이다. 연고가 없는 외국기업보다 규모는 작지만 유망한 교포기업들을 접촉하는 것이 쉬운데다 해당 지역의 현지업체들을 추가 유치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교포기업 등 44개 외국업체 상장 추진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권사와 대표 주관사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외국기업은 모두 44곳 정도로 파악된다. 이 중 교포기업 10곳 안팎을 포함해 20여개사 정도가 올해 증시 입성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우증권이 주관사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을 준비 중인 해외기업은 10곳에 이른다. 영국계 소프트웨어 기업인 '엠비즈글로벌', 미국계 바이오 업체인 '이미지솔루션' 등 교포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미국계 기업 2곳과 베트남의 교포 기업 '미래JSC' 등의 기업공개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 유명환 IPO팀 차장은 "미래JSC는 기업 규모가 크지 않지만 베트남 기업들의 한국 증시 진출의 물꼬를 트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상당수의 베트남 대형 기업들이 미래JSC 상장 결과를 지켜 보고 한국 증시 상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재모 대우증권 IB사업추진부장은 "2007년 이후 국내 증시에 들어온 해외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회사지만 올해부터는 국가가 다양해지고 기업 규모도 한층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사가 올해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중국 기업 시노폴리머의 경우 공모 규모가 약 4000억원으로 이미 상장한 9개 중국 기업보다 훨씬 큰데다 업종도 중화학 부문이어서 차별화된다는 설명이다.
◆해외증시 IPO도 도전한다
증권사들은 국내 증시뿐 아니라 홍콩 등 해외 증시에서도 IPO 업무에 도전하고 있다.
삼성증권 홍콩법인은 지난해 12월 홍콩증시에 상장한 독일기업 슈람홀딩스의 IPO 대표주관사 역할을 맡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국내 증권사가 단독 주관사를 맡아 해외 기업을 해외증시에 상장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증권사 홍콩법인장인 박현국 상무는 "당초 슈람홀딩스 측은 상장 대표주관사를 맡겨달라는 요청에 실력부족을 우려한 듯 성공 여부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지만 국내 증권사의 IPO 역량에 대한 해외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삼성증권에 이어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도 아시아 IPO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병호 우리투자증권 싱가포르 IB센터장은 "지난해 인수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증권사를 통해 현지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은 이후 이들 나라의 기업들을 한국 등 아시아 주요 시장에 상장시키는 업무를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 네트워크 강화해야
국내 증권사들이 이처럼 해외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IPO업무의 외연 확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금융의 해외 진출길을 넓힘으로써 국내 주요 기업들의 금융조달에도 기여하는 후광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가 해외 IPO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및 현지 증권사와 경쟁하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박현국 상무는 "해외 시장에 국내외 기업을 상장하려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리서치 실력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마케팅과 현지 법률에 대한 이해 등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며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업체와 경쟁하려면 무엇보다 해외 네트워크를 크게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호 센터장도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내려면 현지에서 인지도를 쌓는 것이 1차 과제"라며 "이를 위해 우선 아시아 주요 거점 국가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진출해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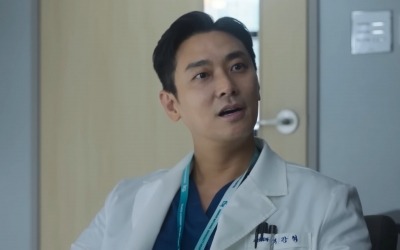

!['이게 말이 돼?'…상승세 탄 테슬라에 혼란한 월가 [한경 글로벌마켓]](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ZA.3930987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