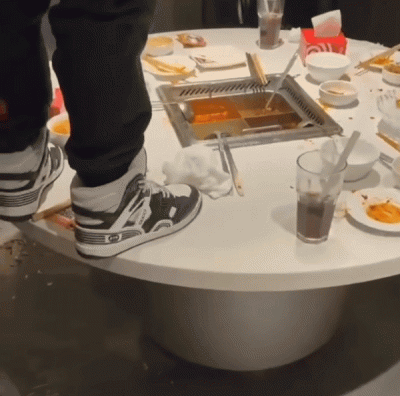게세코 폰 뤼프케 지음 | 박승억 박병화 옮김 | 프로네시스 | 644쪽 | 2만8000원
21세기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아직도 19세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
"현금을 경제시스템의 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혈(瀉血:병을 치료하기 위해 피를 뽑아냄) 요법을 사용하는 전통의학과 달리 질환을 치료하는 '경제의사'들은 끊임없이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비유를 한다면 이런 치료 후엔 반드시 혈종이나 출혈이 발생합니다. 즉 금융 부문의 유동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경제신체 안으로 혈액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지만,이 경우 여러 신체기관이나 해당 부분에 혈전이 생겨 '유동성'은 정체되고 혈액이 덩어리로 응집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을 것입니다. "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헤이즐 핸더슨이 《두려움 없는 미래》에서 한 말이다. 그는 "심근경색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비대한 월스트리트의 기업이나 은행,보험회사들은 심혈관 이식수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위기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생태학자이자 철학자인 안드레아스 베버는 "우리의 문제는 19세기 세계관으로 21세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 아니라 여전히 19세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인류가 자원부족만 고민하는 근대적 인식에서 자연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21세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이들은 시민운동가이자 작가인 게세코 폰 뤼프케와의 대담에서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피고 위기의 타개책을 모색한다. 대담에 참여한 인물은 양자물리학자 한스 페터 뒤르,매사추세츠공대 리더십연구소장 클라우스 오토 샤머,문화연구가 마르코 비숍 등 저명 인사 21명.
이들은 현재의 지구를 '위기의 시작'으로 해석하면서 개인과 공동체,국가,전 지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제 막 시작된 지구적 위기란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생태계 파괴,최빈국의 가난과 굶주림,전 세계적 금융시장의 동요,경기침체와 실업,계층 간 불균형과 사회적 갈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다. 인간이 지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맹신과 최고를 향한 경쟁이 최고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착각을 버리는 데에서 시작하라는 것이다. 이들의 입장은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되 미래에서 희망을 찾는 '어두운 낙관주의'로 이어진다.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곧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각국 정부가 아니라 시민 공동체가 있다.
진화 이론가 엘리자베스 사투리스는 유기체뿐 아니라 시스템도 진화해야 한다면서 "중앙 권력이 시스템 구성원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모델의 수명은 끝났다"고 말한다.
시스템 이론가 어빈 라즐로는 "글로벌 시민사회는 곳곳에서 변화를 위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시험하고 있으며,그들은 각성하고,새로운 가치를 세우고,의식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들이 들려주는 변화의 실제 사례도 눈길을 끈다. 사막을 초원으로 바꾸는 '사막의 기적'을 일궈낸 이집트의 세켐 운동,재생에너지 혁명을 이룬 아일랜드의 '전환 마을' 킨세일,금융과 실업 위기 극복의 희망을 보여준 독일의 지역 화폐 킴가우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식량 주권 운동가인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부족 패러다임'과 '무기력한 우울증'이 위기를 불러왔다고 설명한다. 식량도,에너지도,시내 주차공간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물질주의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무기력증이 만나 잘못된 '마음의 지도'를 그렸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모두가 함께 잘 살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제는 우리의 무기력증이고,그 무기력증을 일으키는 잘못된 관념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인식의 전환을 통한 실천이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


![김수현 측 "故김새론 성인 된 후 사귀었다"…미성년 교제 부인 [전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13282.3.jpg)
!["우리 어머니도 관절염 있는데"…박규리, 깜짝 놀란 이유는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1301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