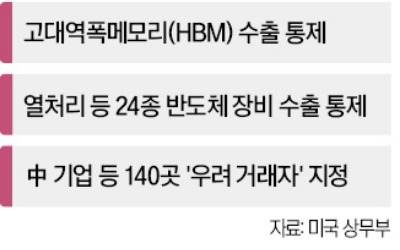[뉴스카페] '던킨' 이 지하철로 들어가는 까닭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내 도넛전문점이 이미 300개에 육박해 포화 상태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목 좋은 상권은 임대료가 비싸 매장을 새로 내기가 만만치 않다. 이에 국내 도넛전문점 1위인 던킨도너츠는 지하철역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던킨도너츠는 2008년 6월 구로역에 지하철 첫 매장을 연 이래 36개 지하철역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8곳을 추가로 공사 중이다. 관계자는 "던킨도너츠가 어디서나 커피와 도넛을 즐긴다는 컨셉트여서 기존 가두점은 물론 상가,대형마트에도 진출한다"며 "지하철역 역시 이 같은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내 상권이 포화 상태여서 던킨도너츠가 지하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희 한국창업컨설팅그룹 대표는 "서울의 주요 상권마다 2~3개의 도넛 매장이 있어 추가로 열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지하 상권을 파고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던킨도너츠는 전국 730개 매장 중 서울에만 260개가 있다. 미스터도넛,도넛플랜트뉴욕시티 등 다른 브랜드 매장까지 합치면 300개에 이른다. 던킨도너츠는 지난해 출점한 30개 매장 중 지상은 5개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지상보다는 권리금,보증금 등 점포 개설비가 적게 드는 것도 지하철역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다. 던킨도너츠는 49.5㎡(15평) 기준으로 가맹비,인테리어비,보증금 등 총 1억6000만원의 점포 개설비가 든다. 여기에 임대료,권리금까지 합치면 2억원이 훌쩍 넘는다. 반면 지하철역은 권리금이 없고 매장 면적도 가두점의 절반이면 충분해 점포 개설비가 20~30%가량 적게 든다.
또 테이크아웃 비율이 90% 이상으로 가두점(60~70%)보다 월등히 높아 면적이 작아도 영업에 지장이 없다.
한편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미스터도넛도 9호선 개통과 함께 3개 점포를 낸 이후 지난달 말 염창역에 네 번째 지하철역 점포를 열었다. 회사 관계자는 "지하철역점 매출이 당초 목표보다 10% 이상 많아 백화점 내에 입점한 매장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던킨도너츠는 2008년 6월 구로역에 지하철 첫 매장을 연 이래 36개 지하철역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8곳을 추가로 공사 중이다. 관계자는 "던킨도너츠가 어디서나 커피와 도넛을 즐긴다는 컨셉트여서 기존 가두점은 물론 상가,대형마트에도 진출한다"며 "지하철역 역시 이 같은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내 상권이 포화 상태여서 던킨도너츠가 지하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희 한국창업컨설팅그룹 대표는 "서울의 주요 상권마다 2~3개의 도넛 매장이 있어 추가로 열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 지하 상권을 파고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던킨도너츠는 전국 730개 매장 중 서울에만 260개가 있다. 미스터도넛,도넛플랜트뉴욕시티 등 다른 브랜드 매장까지 합치면 300개에 이른다. 던킨도너츠는 지난해 출점한 30개 매장 중 지상은 5개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지상보다는 권리금,보증금 등 점포 개설비가 적게 드는 것도 지하철역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다. 던킨도너츠는 49.5㎡(15평) 기준으로 가맹비,인테리어비,보증금 등 총 1억6000만원의 점포 개설비가 든다. 여기에 임대료,권리금까지 합치면 2억원이 훌쩍 넘는다. 반면 지하철역은 권리금이 없고 매장 면적도 가두점의 절반이면 충분해 점포 개설비가 20~30%가량 적게 든다.
또 테이크아웃 비율이 90% 이상으로 가두점(60~70%)보다 월등히 높아 면적이 작아도 영업에 지장이 없다.
한편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미스터도넛도 9호선 개통과 함께 3개 점포를 낸 이후 지난달 말 염창역에 네 번째 지하철역 점포를 열었다. 회사 관계자는 "지하철역점 매출이 당초 목표보다 10% 이상 많아 백화점 내에 입점한 매장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