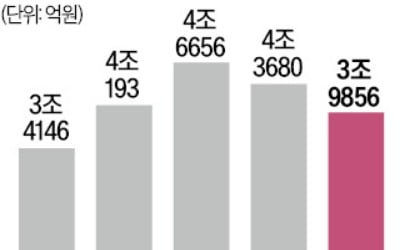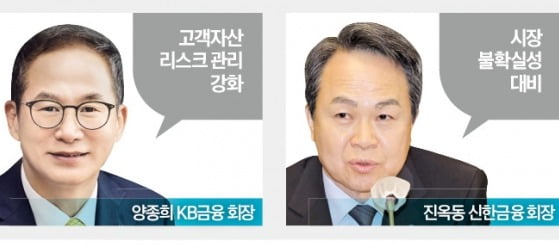['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조선·LCD·자동차 업계도 '비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협력사 통한 기술유출 파장
전문가들은 장비업체나 부품업체를 통해 핵심 기술이 경쟁업체로 유출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비와 부품을 해외 업체에 맡기는 글로벌 소싱이 확대되면서 기술이 새어 나가는 통로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변찬우 서울 동부지검 차장 검사는 "매출을 높이기 위해 고객에게 경쟁사의 R&D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장비 수주를 약속받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나 조선,휴대폰 등의 분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원가 절감과 현지화 전략 확대를 위해 해외 부품 · 소재업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당장 개발 · 생산하고 있는 제품 정보뿐만 아니라 5~10년 단위의 중장기 제품개발 계획 자료들도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원청기업 단위에서 '극비'로 취급되는 기밀들이 해외 하청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밀 코드'가 해제된다는 얘기다.
소싱 대상업체들의 보안 의식이 원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허만율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보안 담당 연구원은 "과거에는 스파이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외부 기술 유출이 잦았지만 최근에는 정반대"라며 "국정원 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70~80%가량의 기술 유출이 내부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이 심할수록,제품 생산에 관여하는 협력업체의 수가 많을수록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여러 나라의 협력업체들과 일하는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임영모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협력업체와 계약 관계를 맺을 때 산업보안을 염두에 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력업체에 기술 정보의 일부만 제공하고 비밀 보안과 관련된 별도의 계약을 맺는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연구원은 "이 같은 사건이 잦아질 것을 대비해 국가 차원의 조정기구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이번 사건을 수사한 변찬우 서울 동부지검 차장 검사는 "매출을 높이기 위해 고객에게 경쟁사의 R&D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장비 수주를 약속받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나 조선,휴대폰 등의 분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원가 절감과 현지화 전략 확대를 위해 해외 부품 · 소재업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당장 개발 · 생산하고 있는 제품 정보뿐만 아니라 5~10년 단위의 중장기 제품개발 계획 자료들도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원청기업 단위에서 '극비'로 취급되는 기밀들이 해외 하청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밀 코드'가 해제된다는 얘기다.
소싱 대상업체들의 보안 의식이 원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허만율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보안 담당 연구원은 "과거에는 스파이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외부 기술 유출이 잦았지만 최근에는 정반대"라며 "국정원 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70~80%가량의 기술 유출이 내부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이 심할수록,제품 생산에 관여하는 협력업체의 수가 많을수록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여러 나라의 협력업체들과 일하는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임영모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협력업체와 계약 관계를 맺을 때 산업보안을 염두에 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력업체에 기술 정보의 일부만 제공하고 비밀 보안과 관련된 별도의 계약을 맺는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연구원은 "이 같은 사건이 잦아질 것을 대비해 국가 차원의 조정기구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