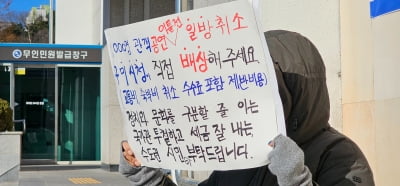희망 근로의 그늘…농어업 취업자 되레 줄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공근로로 쏠림 현상
도소매ㆍ음식업종까지 고용의 '구축효과' 발생
도소매ㆍ음식업종까지 고용의 '구축효과' 발생
전남 해남에서 농사를 짓는 윤모씨는 지난해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예년엔 일당 4만원(남자는 7만원)을 주면 인근 소도시에서 일하러 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작년엔 뚝 끊겼다. 작년 6월부터 정부의 공공일자리 지원 프로젝트인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다. 희망근로 하루 일당은 3만3000원.윤씨가 주는 일당보다 적지만 희망근로의 경우 거리청소,공공시설 보수 등 비교적 쉬운 일거리여서 '쏠림현상'이 심각했다. 윤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일당을 5만원(남자는 10만원)으로 올린 뒤에야 일손을 구할 수 있었다.
정부가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거 늘리면서 농 · 어업 등 다른 부문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를 없애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15일 통계청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간 농어업 부문 신규 취업자는 전년 대비 3만8000명 줄었다. 월별(전년동월비)로 보면 지난해 3월까지 신규 취업자 수가 늘었으나 4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11월엔 15만1000명이나 줄었다. 12월과 올 1월엔 각각 16만9000명,16만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재배면적 감소와 한파를 꼽고 있지만 이보다는 재정투입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더 큰 이유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일평균 25만명에게 월 82만5000원(하루 3만3000원,주5일 근무 기준)을 주는 희망근로의 영향이 컸다는 지적이다.
통계상으로도 2008년 4만3000명에 불과했던 공공행정 분야 신규 취업자는 지난해엔 19만2000명 늘었다. 월별 신규취업자는 지난해 1월 2000명에서 공공부문 청년인턴제가 본격 시행된 2월부터 꾸준히 늘어나다가 희망근로가 시작된 6월부터는 26만~33만명으로 급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예년 같으면 농어업 일용직으로 몰렸던 비경제활동인구(주부,구직단념자 등) 가운데 상당수가 희망근로로 옮겨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제주도에서 귤농장을 운영하는 현모씨는 "희망근로 탓에 귤 수확기인 작년 10월 중순부터 일손 구하기가 어려웠다"며 "일손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4만원 정도였던 일당을 4만5000~5만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농어업 분야와 더불어 도소매 · 음식숙박업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업종 신규취업자는 지난해 1~4월에는 12만명 정도 줄었으나 희망근로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 5월 이후에는 15만~16만명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대표적 자영업종인 도소매 · 음식숙박업의 경우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만 희망근로 사업으로 일부 구직자가 빠져나갔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문제는 올해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희망근로 사업참가자는 작년 25만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지자체를 통해 총 3만개의 임시일자리(지역자원조사 등)를 만드는 사업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일자리가 농어업 등 다른 일자리를 없앤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는 농번기에 희망근로 사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사업대상에 농어촌일손 지원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